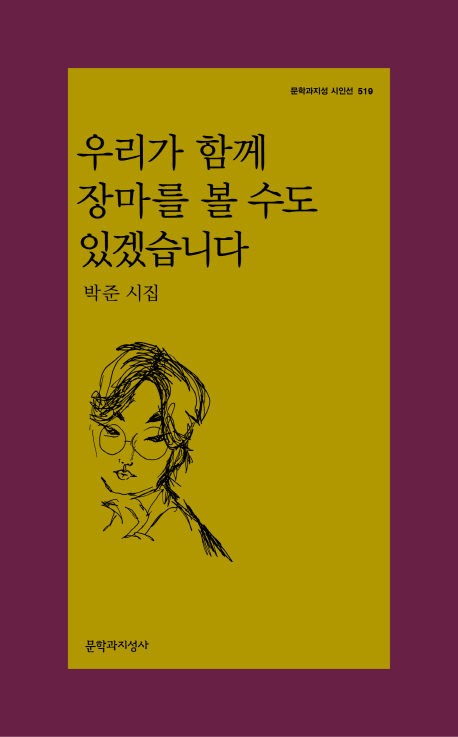웃는남자
@utneunnamja
+ 팔로우


춥고 배고픈 이에게 따듯한 밥 한 끼 지어먹이는 감성.
-
선잠
그해 우리는
서로의 섣부름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마주하던 졸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고 사는 일들은
우리도 다하고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발을 툭툭 건디르던 밭이었다가
화음도 없는 노래를 부르는 입이었다가
고개를 돌려 마르지 않는
새 녘을 바라보는 기대였다가
잠에 든 것도 잊고
다시 눈을 감는 선잠이었습니다
-
손과 밤의 끝에서는
까닭 없이 손끝이
상하는 날이 이어졌다
책장을 넘기다
손을 베인 미인은
아픈데 가렵다고 말했고
나는 가렵고 아프겠다고 말했다
여름빛에 소홀했으므로
우리들의 얼굴이 검어지고 있었다
어렵게 새벽이 오면
내어주지 않던 서로의 곁을 비집고 들어가
쪽잠에 들기도 했다
-
능곡 빌라
몇 해 전 엄마를 잃은 일층 문방구집 사내아이들이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잠을 잔다 벌써 굵어진 종아리를 서로 포개놓고 깊은 잠을 잔다 한낮이면 뜨거운 빛이 내리다가도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들면 덜컥 겁부터 먼저 나는, 떠나는 일보다 머무는 일이 어렵던 가을이었다
-
가을의 말
그렇게 들면 허리 다 나가 짐은 하체로 드는 거야 등갓 잘보고 모서리 먼저 바닥에 놓아 아니 왼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말들 지나
외롭지? 그런데 그건 외롭운 게 아니야 가만 보면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도 외로운 거야 혼자가 둘이지 그러면 외로운게 아니다,
하는 말들 지나
왜 자면서 주먹을 쥐고 자 피 안 통해 손 펴고 자 신기하네 자면서도 다 알아,
듣는 말 지나
큰비 지나, 물길과 흙길 지나, 자라난 풀과 떨어진 돌 우산과 오토바이 지나, 오늘은 노인 셋에 아이 둘 어젯밤에는 웬 젊은 사람 하나 지나, 여름보다 이르게 가는 것들 지나, 저녁보다 늦게 오는 마음 지나, 노래 몇 자락 지나, 과원 지나, 넘어짐과 일어섬 그마저도 지나서 한 이틀 후에 오는 반가운 것들
-
호수 민박
민박에서는 며칠째
탕과 조림과 찜으로
민물고기를 내어놓았습니다
주인에게는 미안했지만
어제 점심부터는 밥상을 물렸고요
밥을 먹는 대신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물에서든 뭍에서든
마음을 웅크리고 있어야 좋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동네의 개들이 어제처럼 긴 울음을 내고
안개 걷힌 하늘에
별들이 비늘 같은 빛을 남기고
역으로 가는 첫차를 잡아타면
돼지볶음 같은 것을
맵게 내오는 식당도 있을 것입니다
이승이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곳은
공간보다는 시간 같은 것이었고
무엇을 기다리는 일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
종암동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집 앞에 와 계셨다
현관에 들어선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눈물부터 흘렸다
왜 우시냐고 물으니
사십 년 전 종암동 개천가에 홀로 살던
할아버지 냄새가 풍겨와 반가워서 그런다고 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울었다
-
입춘 일기
비가 더 쏟기 전에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큰길에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내는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처연凄然이 가까워졌다면 기억은 멀어졌다”라는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비를 맞듯, 달갑거나 반가울 것 하나 없이 새달을 맞고 있었습니다
-
선잠
그해 우리는
서로의 섣부름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마주하던 졸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고 사는 일들은
우리도 다하고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발을 툭툭 건디르던 밭이었다가
화음도 없는 노래를 부르는 입이었다가
고개를 돌려 마르지 않는
새 녘을 바라보는 기대였다가
잠에 든 것도 잊고
다시 눈을 감는 선잠이었습니다
-
손과 밤의 끝에서는
까닭 없이 손끝이
상하는 날이 이어졌다
책장을 넘기다
손을 베인 미인은
아픈데 가렵다고 말했고
나는 가렵고 아프겠다고 말했다
여름빛에 소홀했으므로
우리들의 얼굴이 검어지고 있었다
어렵게 새벽이 오면
내어주지 않던 서로의 곁을 비집고 들어가
쪽잠에 들기도 했다
-
능곡 빌라
몇 해 전 엄마를 잃은 일층 문방구집 사내아이들이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잠을 잔다 벌써 굵어진 종아리를 서로 포개놓고 깊은 잠을 잔다 한낮이면 뜨거운 빛이 내리다가도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들면 덜컥 겁부터 먼저 나는, 떠나는 일보다 머무는 일이 어렵던 가을이었다
-
가을의 말
그렇게 들면 허리 다 나가 짐은 하체로 드는 거야 등갓 잘보고 모서리 먼저 바닥에 놓아 아니 왼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말들 지나
외롭지? 그런데 그건 외롭운 게 아니야 가만 보면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도 외로운 거야 혼자가 둘이지 그러면 외로운게 아니다,
하는 말들 지나
왜 자면서 주먹을 쥐고 자 피 안 통해 손 펴고 자 신기하네 자면서도 다 알아,
듣는 말 지나
큰비 지나, 물길과 흙길 지나, 자라난 풀과 떨어진 돌 우산과 오토바이 지나, 오늘은 노인 셋에 아이 둘 어젯밤에는 웬 젊은 사람 하나 지나, 여름보다 이르게 가는 것들 지나, 저녁보다 늦게 오는 마음 지나, 노래 몇 자락 지나, 과원 지나, 넘어짐과 일어섬 그마저도 지나서 한 이틀 후에 오는 반가운 것들
-
호수 민박
민박에서는 며칠째
탕과 조림과 찜으로
민물고기를 내어놓았습니다
주인에게는 미안했지만
어제 점심부터는 밥상을 물렸고요
밥을 먹는 대신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물에서든 뭍에서든
마음을 웅크리고 있어야 좋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동네의 개들이 어제처럼 긴 울음을 내고
안개 걷힌 하늘에
별들이 비늘 같은 빛을 남기고
역으로 가는 첫차를 잡아타면
돼지볶음 같은 것을
맵게 내오는 식당도 있을 것입니다
이승이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곳은
공간보다는 시간 같은 것이었고
무엇을 기다리는 일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
종암동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집 앞에 와 계셨다
현관에 들어선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눈물부터 흘렸다
왜 우시냐고 물으니
사십 년 전 종암동 개천가에 홀로 살던
할아버지 냄새가 풍겨와 반가워서 그런다고 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울었다
-
입춘 일기
비가 더 쏟기 전에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큰길에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내는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처연凄然이 가까워졌다면 기억은 멀어졌다”라는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비를 맞듯, 달갑거나 반가울 것 하나 없이 새달을 맞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019년 10월 14일
 0
0
 0
0
웃는남자님의 다른 게시물

웃는남자
@utneunnamja
작가 특유의 상상력이 돋보임. 우주 밖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이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려놓아 흥미로웠음. 건설한 유토피아의 흥망성쇠를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그려냄. 결말 부분에서 기독교적 창조론을 연결한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라 아쉬웠음.
-
맥 나마라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다. 지갑에는 부적을 넣고 다니고 주술 문장을 원통에 넣어 목에 걸고 다녔다. 점쟁이, 무당, 점성가도 기꺼이 찾아다녔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운이라는 요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열두 별자리를 관찰했다.
-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 가지 적과 맞서게 되지. 첫 번째는 그 시도와 정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두 번째는 똑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지. 이들은 자네가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자네를 때려눕힐 때를 엿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자네 아이디어를 베껴 버린다네.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는 않으면서 일체의 변화와 독창적인 시도에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다수의 사람들이지. 세 번째 부류가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고, 또 가장 악착같이 달려들어 자네의 프로젝트를 방해할 걸세.
-
<인간이 자기 내부의 공간도 정복하지 못하면서 외부의 공간을 정복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별에 다가가지도 못하면서 멀리 있는 별을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
권력과 폭력, 신앙 이 세 가지야말로 대표적인 의존 형태지요.
-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
불만에 찬 물고기들 말이오. 물속에서 사는 게 편치 않았던 물고기들. 편안함을 느낀다면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겠지. 고통만이 우리를 일깨우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게 만들지요.
-
사회적인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진화 경향을 보여 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예죠. 개미들의 연대와 쥐들의 이기주의. 인간들은 딱 중간이에요. 협력의 법칙이냐, 약육강식의 법칙이냐. 개미들의 법칙이냐 쥐들의 법칙이냐.
-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저놈들 모두가 다 일을 하는 건 아니더군요. 3분의 1이 쉬고 있는 동안 다른 3분의 1은 쓸모없는 일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효과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 마지막 3분의 1이 개미가 실수를 바로잡고 개미 공동체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요.
-
평화 다음에는 전쟁.
중앙 집권화 다음에는 분권화.
대도시들 다음에는 작은 마을들.
의회 체제 다음에는 독재 체제.
안정 다음에는 광란.
무정부 상태 다음에는 전체주의.
학살 다음에는 출생.
화려한 패션 다음에는 경직된 패션.
-
맥 나마라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다. 지갑에는 부적을 넣고 다니고 주술 문장을 원통에 넣어 목에 걸고 다녔다. 점쟁이, 무당, 점성가도 기꺼이 찾아다녔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운이라는 요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열두 별자리를 관찰했다.
-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 가지 적과 맞서게 되지. 첫 번째는 그 시도와 정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두 번째는 똑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지. 이들은 자네가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자네를 때려눕힐 때를 엿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자네 아이디어를 베껴 버린다네.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는 않으면서 일체의 변화와 독창적인 시도에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다수의 사람들이지. 세 번째 부류가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고, 또 가장 악착같이 달려들어 자네의 프로젝트를 방해할 걸세.
-
<인간이 자기 내부의 공간도 정복하지 못하면서 외부의 공간을 정복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별에 다가가지도 못하면서 멀리 있는 별을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
권력과 폭력, 신앙 이 세 가지야말로 대표적인 의존 형태지요.
-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
불만에 찬 물고기들 말이오. 물속에서 사는 게 편치 않았던 물고기들. 편안함을 느낀다면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겠지. 고통만이 우리를 일깨우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게 만들지요.
-
사회적인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진화 경향을 보여 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예죠. 개미들의 연대와 쥐들의 이기주의. 인간들은 딱 중간이에요. 협력의 법칙이냐, 약육강식의 법칙이냐. 개미들의 법칙이냐 쥐들의 법칙이냐.
-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저놈들 모두가 다 일을 하는 건 아니더군요. 3분의 1이 쉬고 있는 동안 다른 3분의 1은 쓸모없는 일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효과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 마지막 3분의 1이 개미가 실수를 바로잡고 개미 공동체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요.
-
평화 다음에는 전쟁.
중앙 집권화 다음에는 분권화.
대도시들 다음에는 작은 마을들.
의회 체제 다음에는 독재 체제.
안정 다음에는 광란.
무정부 상태 다음에는 전체주의.
학살 다음에는 출생.
화려한 패션 다음에는 경직된 패션.

파피용
 읽었어요
읽었어요


2명이 좋아해요
2019년 10월 14일
 2
2
 0
0

웃는남자
@utneunnamja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서양 철학자들에 대한 삶과 사상을 담아놓은 책. 각 철학자 개인의 생애와 함께 어떤 사상과 철학을 주장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철학 용어나 개념들이 등장하지 않아서 읽기가 쉽고 서양 철학사 전반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을 다뤄 놓은 점이 장점. 반대로 쉬운 언어로 철학자들의 사상과 개념을 다루고 있어서 실제 철학자들의 저서를 읽을 때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는 어렵다. 좋아하는 철학자의 삶에 대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책.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읽었어요
읽었어요

1명이 좋아해요
2019년 2월 25일
 1
1
 0
0

웃는남자
@utneunnamja
인류 멸망 요인에 대하여 예측한 하이즈먼 리포트. 이 보고서에는 5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미래 인류 출현 가능성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관측된다. 미래 인류가 현생 인류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지성의 소유라는 예측 때문에 미국정보에서는 안보위기를 느끼고 이를 저지하는 작전을 펼치게 된다.
약리학적 및 제약 관련 전문 지식, 정치적 암투, 소규모 집단 전투, 신생 인류에 대한 묘사 등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넘쳐나는 책. 인종, 이념의 대립으로 특정 집단을 말살한다는 제노사이드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잔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었다. 특히나 작중에서 등장하는 신생 인류인 ‘누스’의 먼치킨스러운 활약은 무협지에서 볼 수 있는 절정고수를 새로운 형태로 그리는 느낌이라서 묘한 쾌감도 느껴졌던 책.
약리학적 및 제약 관련 전문 지식, 정치적 암투, 소규모 집단 전투, 신생 인류에 대한 묘사 등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넘쳐나는 책. 인종, 이념의 대립으로 특정 집단을 말살한다는 제노사이드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잔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었다. 특히나 작중에서 등장하는 신생 인류인 ‘누스’의 먼치킨스러운 활약은 무협지에서 볼 수 있는 절정고수를 새로운 형태로 그리는 느낌이라서 묘한 쾌감도 느껴졌던 책.

제노사이드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019년 1월 9일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