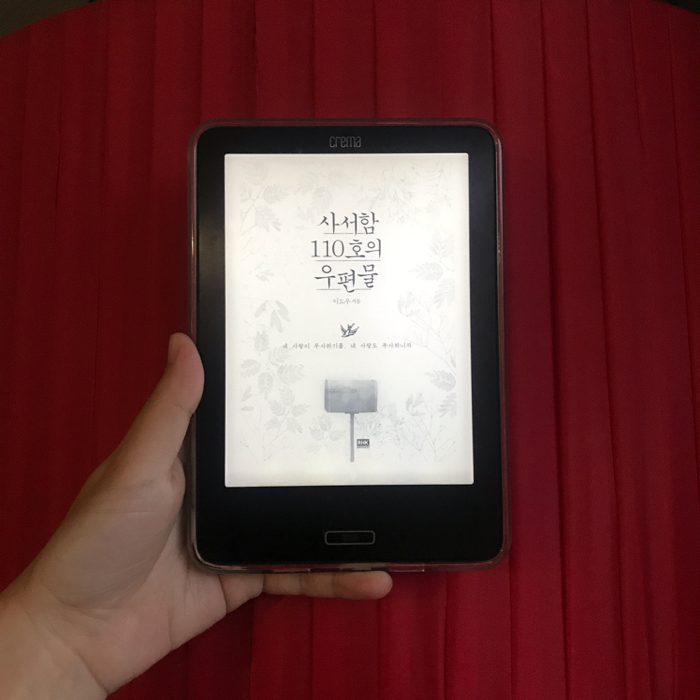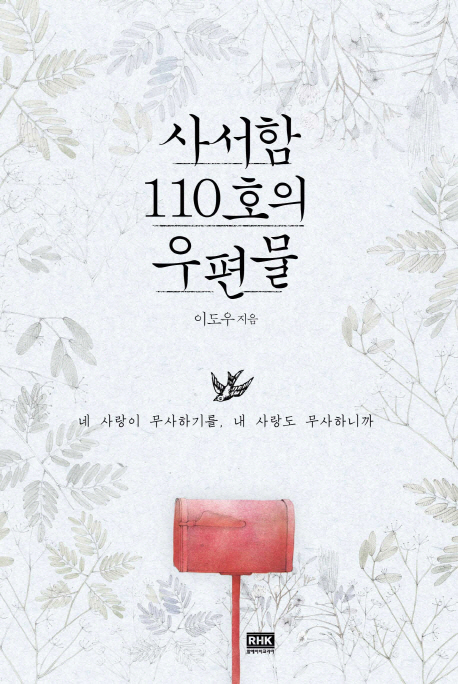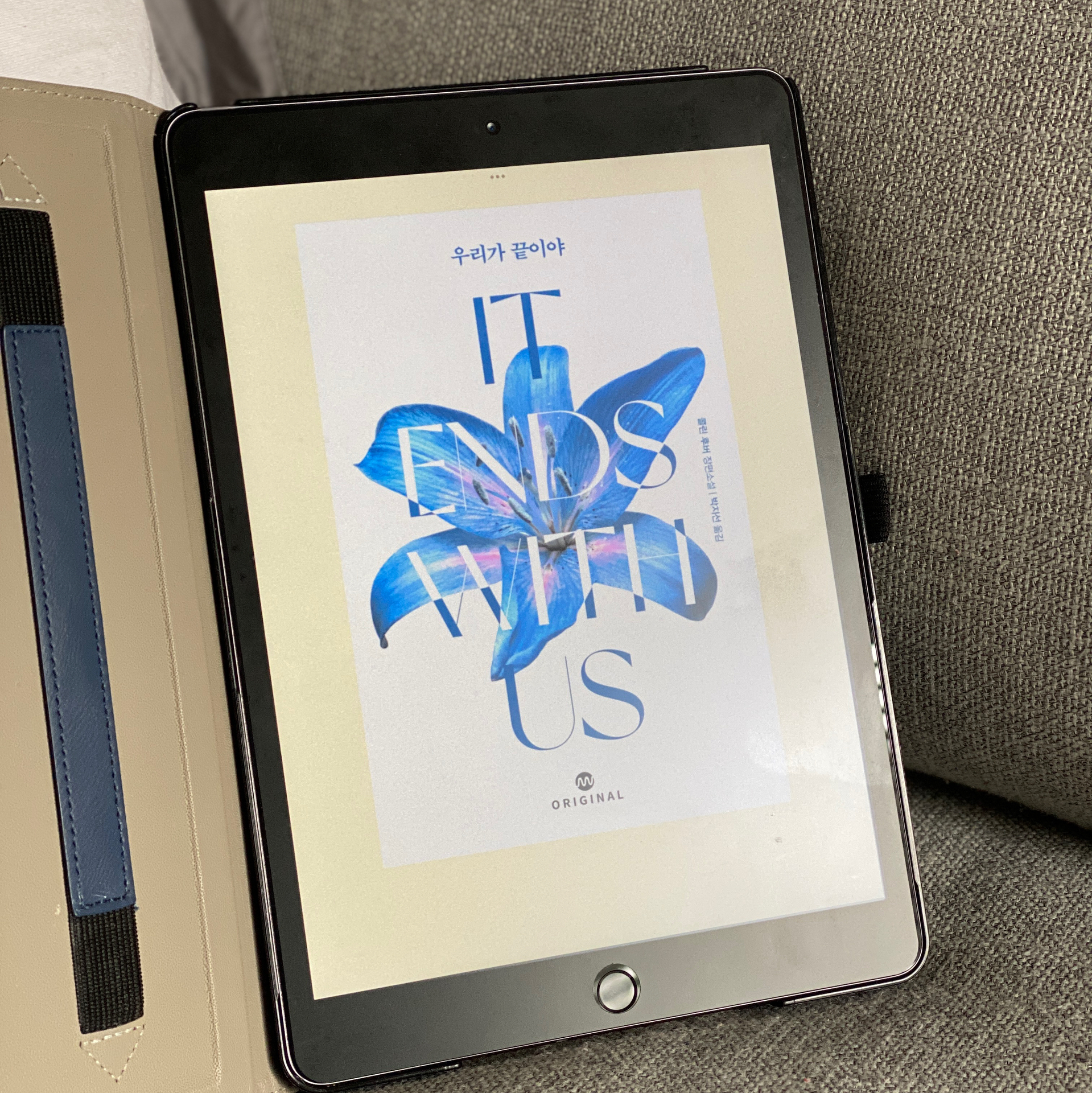안나
@anna5nme
+ 팔로우


정확히 2016년 1월 29일에 이 책을 사들였다. 2004년 처음 출간된 책인데, 한국 로맨스 소설계에 한 획을 그은 것인지, 한국 소설 추천 글에는 꼭 한 자리씩 꿰차고 있다. (‘엄마를 부탁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셋이 거의 세쌍둥이만치 붙어 다닌다) 스테디셀러네 뭐네 어쩌네 하는데도 왜인지 나는 술술 읽히지가 않았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북리더기에서 눈에 밟혀 몇 번이나 시도했겠는가! 하지만 매번 포기했다. 이유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할 때처럼 뭔가 되게 현실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질감이 감지됐다. 그러다 최근에 갑자기 로맨스 소설이 읽고 싶어졌다. 어릴 땐 되려 추리소설보다 로맨스 소설을 훨씬 많이 읽었는데 (만화책도 ㅎ)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항마력이 달려서 로맨스와 멀어지게 되었단 말이지. 이런 상태로는 뭘 봐도 소설을 소설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럼 제아무리 인기 있다는 책을 구입해서 봐도 돈이 아까울 것 같았다. 그럴 바엔 가지고 있는 책을 읽자. 그래, 몇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실패는 없을 책에 재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을 열었다.
초반에 반 정도 읽었을 때 (반이나 읽다니!) 나의 심정은 이러했다. 거의 상사와의 사랑 이야기 수준인데? 말이 안 된다. 사내연애라는 게 애초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같은 팀 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연애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 내 지난 사회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렇다. 젊은 시절의 디카프리오가 라디오 PD고 내가 작가여도 절대 불가능하다. 회의하자면서 불러서 호구조사 하거나 내 다이어리를 훔쳐본다면? 얼굴이고 재력이고 목소리고 나발이고 그저 이미 그 사람은 내 데스노트 1순위를 박차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또 항마력이 무너졌다. 눈이 마주치니까 심장이 뛴다고 “심장병인가?”라고 말하다니 이게 뭔.. 2004년이면 중학생 때인데, 차라리 출간되자마자 읽었으면 아주 푹 빠져서 읽었을 법도 하다. 서른 먹은 지금의 내겐 영 아니다 (라고 초반에 생각했다) 분명 처음엔 이건PD가 개인주의적이고 회사 행사에도 참여 하지 않는댔는데 겁나 인싸에다 후임한테 자꾸 술 마시자 제안하고, 공진솔도 소심하다더니 완전 인싸다. 초반 캐릭터 설정은 아주 많이 잘못됐다.
그러나 반쯤 지나 선우가 애리에게 청혼할 때쯤부터 나는 이미 공진솔이었다. 빨리 할 일 다 처리하고 남은 내용을 읽고 싶었다. 실제로 오늘도 일하고 오자마자 식탁에 앉아서 책부터 읽기 시작했으니까. 이건이 딱 저맘때 한국의 그른 로맨스상을 펼칠 때 (진솔의 손목을 낚아채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멋있는 것처럼 표현될 때) 많이 깨긴 했다만 말이다. 그러다 이필관 할아버지가 “우리 건이가 마음에 안 차네?” 하실 때 진솔에 99% 빙의되어 울컥하고 올라왔다. 진짜 바로 다음 문구가 ‘진솔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다.’ 여서 놀랐다.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온 이건이 진솔을 찾아가서 구구절절 찌질하게 굴 때 이미 난 울고 있었다. 좀 부끄러워서 애써 눈물을 감췄지만 이미 코가 막혀서 숨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이 소설이 왜 이리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겠다. 딱 한국 드라마 같다. 이거 고대로 드라마화해도 인기 많았을 텐데 왜 여태 안됐을까? 남주가 여주 손목 잡고 끌고 가고 강제로 차 태워서 납치하는 부분만 각색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라디오도 ‘보이는 라디오’가 대부분인 데다 핸드폰도 ‘폴더를 닫았다’가 실현될 수 없어서일까? 그렇담 아쉽지만 인정한다. 마지막에 추가된 단편소설 ‘비 오는 날은 입구가 열린다’도 참 좋았다. 대화체인 듯 대화체가 아닌 듯. 일인극인 듯 아닌듯한 느낌으로 극장에 올려도 참 먹먹하겠다 싶다. 약간 으스스하기도 한데, 먹먹함이 더 크다. 참고로 파꽃의 생김새가 궁금해서 구글링해봤다. 그러고 나니 더 궁금해졌다. 인기가 많아질 정도의 파꽃 그림은 어떤 느낌일까?
초반에 반 정도 읽었을 때 (반이나 읽다니!) 나의 심정은 이러했다. 거의 상사와의 사랑 이야기 수준인데? 말이 안 된다. 사내연애라는 게 애초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같은 팀 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연애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 내 지난 사회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렇다. 젊은 시절의 디카프리오가 라디오 PD고 내가 작가여도 절대 불가능하다. 회의하자면서 불러서 호구조사 하거나 내 다이어리를 훔쳐본다면? 얼굴이고 재력이고 목소리고 나발이고 그저 이미 그 사람은 내 데스노트 1순위를 박차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또 항마력이 무너졌다. 눈이 마주치니까 심장이 뛴다고 “심장병인가?”라고 말하다니 이게 뭔.. 2004년이면 중학생 때인데, 차라리 출간되자마자 읽었으면 아주 푹 빠져서 읽었을 법도 하다. 서른 먹은 지금의 내겐 영 아니다 (라고 초반에 생각했다) 분명 처음엔 이건PD가 개인주의적이고 회사 행사에도 참여 하지 않는댔는데 겁나 인싸에다 후임한테 자꾸 술 마시자 제안하고, 공진솔도 소심하다더니 완전 인싸다. 초반 캐릭터 설정은 아주 많이 잘못됐다.
그러나 반쯤 지나 선우가 애리에게 청혼할 때쯤부터 나는 이미 공진솔이었다. 빨리 할 일 다 처리하고 남은 내용을 읽고 싶었다. 실제로 오늘도 일하고 오자마자 식탁에 앉아서 책부터 읽기 시작했으니까. 이건이 딱 저맘때 한국의 그른 로맨스상을 펼칠 때 (진솔의 손목을 낚아채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멋있는 것처럼 표현될 때) 많이 깨긴 했다만 말이다. 그러다 이필관 할아버지가 “우리 건이가 마음에 안 차네?” 하실 때 진솔에 99% 빙의되어 울컥하고 올라왔다. 진짜 바로 다음 문구가 ‘진솔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다.’ 여서 놀랐다.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온 이건이 진솔을 찾아가서 구구절절 찌질하게 굴 때 이미 난 울고 있었다. 좀 부끄러워서 애써 눈물을 감췄지만 이미 코가 막혀서 숨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이 소설이 왜 이리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겠다. 딱 한국 드라마 같다. 이거 고대로 드라마화해도 인기 많았을 텐데 왜 여태 안됐을까? 남주가 여주 손목 잡고 끌고 가고 강제로 차 태워서 납치하는 부분만 각색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라디오도 ‘보이는 라디오’가 대부분인 데다 핸드폰도 ‘폴더를 닫았다’가 실현될 수 없어서일까? 그렇담 아쉽지만 인정한다. 마지막에 추가된 단편소설 ‘비 오는 날은 입구가 열린다’도 참 좋았다. 대화체인 듯 대화체가 아닌 듯. 일인극인 듯 아닌듯한 느낌으로 극장에 올려도 참 먹먹하겠다 싶다. 약간 으스스하기도 한데, 먹먹함이 더 크다. 참고로 파꽃의 생김새가 궁금해서 구글링해봤다. 그러고 나니 더 궁금해졌다. 인기가 많아질 정도의 파꽃 그림은 어떤 느낌일까?


2명이 좋아해요
2019년 7월 16일
 2
2
 0
0
안나님의 다른 게시물

안나
@anna5nme
최은영 작가님의 단편소설집을 읽으면 신비로운 감정에 휘말린다. 어딘가엔 있을 법한, 주변에 있을 법한, 혹은 나일 수도 있을 법한 한 사람의 마음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데비 챙, 숲의 끝, 저녁 산책, 호시절이 특히나 좋았다. 의도치 않은 오해, 사랑과 우정의 그 비슷하고도 애매한 감정, 자연스러움 속 의문을 품게 만드는 불편함 등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
데비 챙, 숲의 끝, 저녁 산책, 호시절이 특히나 좋았다. 의도치 않은 오해, 사랑과 우정의 그 비슷하고도 애매한 감정, 자연스러움 속 의문을 품게 만드는 불편함 등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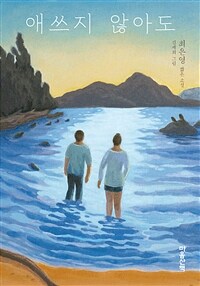
애쓰지 않아도



외 3명이 좋아해요
2022년 5월 24일
 6
6
 0
0

안나
@anna5nme
표지 속 파란 백합꽃 그림에 이끌렸다. 매일 한 권씩 공개한 시리즈물이라 짧게 짧게 27권까지나 있다고 하니, 가볍게 하루에 한두 권씩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그렇게 네 시간 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고 심지어 우느라 막힌 코훌쩍이는 소리에 아기가 깨진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로맨스인 줄 알았다. 인터넷 로맨스 소설인 줄로만 알았다. 이미 처음부터 상당히 재밌었고, 5권쯤 읽어갈 땐 너무 로맨틱 자극적이라 이 소설에 심취해 읽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읽는 내내 제목이 신경 쓰였다. It Ends With Us의 Us는 화자 릴리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아무래도 아틀라스일까? 이 사랑 이야기의 끝은 누구와 함께하는 걸로 끝날까? 그런데 왜 한국어 제목은 ‘우리가 끝이야’일까? 우리가? 우리로? 한 권 한 권 넘어갈 때마다 궁금했는데, 26권 마지막이나 되어서야 알았다. 로맨스의 끝을 뜻하는 게 아니었구나.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상대방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다. 나도 주인공 릴리처럼, 피해자들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줄 몰라서 안 떠나는 거라고 생각해왔나보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완전히 납득시켰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릴리가 또 자신의 가정 속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나는 이 소설이 끝나기 직전까지 로맨스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27권 중 26권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주인공이 딸에게 하는 말 ‘이 가정폭력의 대물림은 우리에서 끝내는 거야’에서 나온 It Ends With Us라는 걸 알았다.
제법이다. 나도 라일에게 꿈뻑 속아 넘어갔다. 아버지 장례식날 속이 답답해 올라간 고층 건물 옥상이라는 인소에나 나올법한 첫 만남, 갑자기 뚝딱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열었더니 대뜸 성격 좋고 예쁘고 착한 밀리어네어가 심심해서 일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남주의 여동생이고, 남주는 큰 병원 의사에, 진지한 만남 싫어파인데 여주를 만나고서 사랑을 알게 되고, 어쩌다 여주에게 해를 가하지만 알고 보니 또 엄청난 일을 겪어서 트라우마로 인해 발현되는 행동이었다니 나 같아도 두 번 세 번 용서하게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무엇도 약자 폭행에 있어 이유가 되어줄 순 없다. 라일이 아무리 화나도 마동석 앞에서 퓨즈가 나가진 않을 것 아닌가? 감히 릴리를 힘으로 밀치고 이마를 꼬매야 할 만큼 세게 박치기를 하다니 빌어먹을 자식.
작가는 본인이 자라온 가정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적었다고 한다. 자신의 어머니처럼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해자들을 위한 글을 적고 싶었다고. 다른 건 몰라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확실히 되었다.
찾아보니 올해 곧 아틀라스를 중점으로 한 소설 It Starts With Us도 곧 출간된다고 한다. 이건 확실히 로맨스 소설이겠다고 생각하는 건 또 나의 착각이려나. 아틀라스 너무 완벽한 캐릭터라 세상 제일로 오글거릴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왕이면 원서로.
“이 세상에 나쁜 사람 같은 건 없어요. 우리 모두 가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냥 헤엄치는 거야. 그냥 계속 헤엄쳐, 계속, 계속.”
나는 딸의 이마에 입 맞추고 약속했다. “여기에서 멈춰야 해. 나랑 네가 끝내는 거야. 우리가 끝내야 해.” - <우리가 끝이야> 중에서
로맨스인 줄 알았다. 인터넷 로맨스 소설인 줄로만 알았다. 이미 처음부터 상당히 재밌었고, 5권쯤 읽어갈 땐 너무 로맨틱 자극적이라 이 소설에 심취해 읽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읽는 내내 제목이 신경 쓰였다. It Ends With Us의 Us는 화자 릴리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아무래도 아틀라스일까? 이 사랑 이야기의 끝은 누구와 함께하는 걸로 끝날까? 그런데 왜 한국어 제목은 ‘우리가 끝이야’일까? 우리가? 우리로? 한 권 한 권 넘어갈 때마다 궁금했는데, 26권 마지막이나 되어서야 알았다. 로맨스의 끝을 뜻하는 게 아니었구나.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상대방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다. 나도 주인공 릴리처럼, 피해자들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줄 몰라서 안 떠나는 거라고 생각해왔나보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완전히 납득시켰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릴리가 또 자신의 가정 속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나는 이 소설이 끝나기 직전까지 로맨스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27권 중 26권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주인공이 딸에게 하는 말 ‘이 가정폭력의 대물림은 우리에서 끝내는 거야’에서 나온 It Ends With Us라는 걸 알았다.
제법이다. 나도 라일에게 꿈뻑 속아 넘어갔다. 아버지 장례식날 속이 답답해 올라간 고층 건물 옥상이라는 인소에나 나올법한 첫 만남, 갑자기 뚝딱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열었더니 대뜸 성격 좋고 예쁘고 착한 밀리어네어가 심심해서 일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남주의 여동생이고, 남주는 큰 병원 의사에, 진지한 만남 싫어파인데 여주를 만나고서 사랑을 알게 되고, 어쩌다 여주에게 해를 가하지만 알고 보니 또 엄청난 일을 겪어서 트라우마로 인해 발현되는 행동이었다니 나 같아도 두 번 세 번 용서하게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무엇도 약자 폭행에 있어 이유가 되어줄 순 없다. 라일이 아무리 화나도 마동석 앞에서 퓨즈가 나가진 않을 것 아닌가? 감히 릴리를 힘으로 밀치고 이마를 꼬매야 할 만큼 세게 박치기를 하다니 빌어먹을 자식.
작가는 본인이 자라온 가정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적었다고 한다. 자신의 어머니처럼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해자들을 위한 글을 적고 싶었다고. 다른 건 몰라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확실히 되었다.
찾아보니 올해 곧 아틀라스를 중점으로 한 소설 It Starts With Us도 곧 출간된다고 한다. 이건 확실히 로맨스 소설이겠다고 생각하는 건 또 나의 착각이려나. 아틀라스 너무 완벽한 캐릭터라 세상 제일로 오글거릴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왕이면 원서로.
“이 세상에 나쁜 사람 같은 건 없어요. 우리 모두 가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냥 헤엄치는 거야. 그냥 계속 헤엄쳐, 계속, 계속.”
나는 딸의 이마에 입 맞추고 약속했다. “여기에서 멈춰야 해. 나랑 네가 끝내는 거야. 우리가 끝내야 해.” - <우리가 끝이야> 중에서

It Ends with Us
👍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추천!



외 1명이 좋아해요
2022년 5월 20일
 4
4
 0
0

안나
@anna5nme
김영하가 9년만에 내는 장편소설이 풀린다고 하여 며칠 전부터 기대했다. 공개되는 날 바로 읽고 싶어서 읽던 책을 서둘러 후다닥 읽어버렸을 정도. 일부러 책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찾아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첫 장을 읽고나서도 이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게 될지 짐작도 못 했다.
얼마전 읽었던 김동식의 ‘아웃팅’이 떠오르는 작품이다. 대신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잔잔하고 길게 풀어진 느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인간을 잡아먹고, 인간이 사라지자 끝내 인공지능도 사라지게 되는 내용이다.
나는 sci-fi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를 떠올렸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가 바로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아일랜드’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 바깥 세상이 오염되어 환상의 섬으로 가기 전의 격리시설에 발탁되어 온 선택된 사람들이라 믿고 지냈지만 알고보니 복제인간을 보관하는 시설이었다는 것. 이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건, 복제인간의 주인이 장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래서인지 소설 ‘작별인사’ 속 선이가 스칼렛요한슨의 모습과 겹쳐보였다. 평양 스칼렛 요한슨.
스토리 전개보다는 이 책에 몇 번이고 언급되는 오즈의 마법사와 빨간머리 앤을 다시 읽고 싶어졌다.
신선하지 않은 내용에 신선한 결말이어서일까, 흥미롭게 읽었다. 신기할 정도로 혼자 잘 놀아준 아기를 앞에 두고 읽어서 더 재밌었을수도.
“끝이 오면 너도 나도 그게 끝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얼마전 읽었던 김동식의 ‘아웃팅’이 떠오르는 작품이다. 대신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잔잔하고 길게 풀어진 느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인간을 잡아먹고, 인간이 사라지자 끝내 인공지능도 사라지게 되는 내용이다.
나는 sci-fi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를 떠올렸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가 바로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아일랜드’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 바깥 세상이 오염되어 환상의 섬으로 가기 전의 격리시설에 발탁되어 온 선택된 사람들이라 믿고 지냈지만 알고보니 복제인간을 보관하는 시설이었다는 것. 이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건, 복제인간의 주인이 장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래서인지 소설 ‘작별인사’ 속 선이가 스칼렛요한슨의 모습과 겹쳐보였다. 평양 스칼렛 요한슨.
스토리 전개보다는 이 책에 몇 번이고 언급되는 오즈의 마법사와 빨간머리 앤을 다시 읽고 싶어졌다.
신선하지 않은 내용에 신선한 결말이어서일까, 흥미롭게 읽었다. 신기할 정도로 혼자 잘 놀아준 아기를 앞에 두고 읽어서 더 재밌었을수도.
“끝이 오면 너도 나도 그게 끝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작별인사
👍
일상의 재미를 원할 때
추천!



외 5명이 좋아해요
2022년 5월 19일
 8
8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