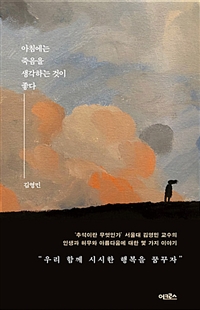뷔리당의나귀
@bwiridangeuinagui
+ 팔로우


이 책을 읽기로 선택한 경위는 불투명하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것이 기억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많다. 아마도 포탈에서 책소개를 하면서 몇문장 제시한 것이 내 정서나 스타일에 부합했던 것이고, 구매리스트에 올랐던 것 같다. (제목을 메모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선택, 구매한다)
저자는 대학의 정치사상사 교수지만 흥미로운 이력도 있다. 독립영화 만드는 일에도 참여했었고, 영화평론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한다.
책의 제목으로 내용 전반을 짐작한다면 다소 당황 또는 실망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주제의 다양한 짧은 글들을 부담없이 만날 수 있다.
제목은 memento mori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무난할 것 같다.
해학적, 조소적이며 풍부한 유머감각으로 아주 재치있고, 한마디로 재미있다. 비교적 가볍고 소소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내고 있지만 기저에는 냉철하고 무거운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도 하다.
한가지 시덥잖은 의문이라면, 저자가 제시하는 사례나 인용하는 문구의 상당수가 특이하게도 일본의 작가, 학자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한국, 중국의 예는 거의 없음)
일본에 호의적이라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보편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다소 과다하다고 느껴져서 이유가 잠시 궁금해졌을 뿐이다.
(인상 깊은 문구)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무시한다. (루크레티우스)
-내리는 눈을 올려다보고 있자면, 모래시계 바닥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만화 '허니와 클로버' 中)
-이렇듯 성장은, 익숙하지만 이제는 지나치게 작아져버린 세계를 떠나는 여행일 수밖에 없다.
-당겨진 활시위만이 이완될 수 있다.
-삶이 진행되는 동안은 삶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기에 죽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소멸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 어떤 존재를 지탱했던 조건이 사라지면 그 존재도 사라진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멸의 여부가 아니라 소멸의 방식이다.
-그때도 나는 다소곳이 앉아 있기보다는 앞에 놓인 탁자를 당수로 쪼개며 "선생님들, 논문을 읽지도 않고 심사한다고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목젖을 뽑아 줄넘기를 한 다음에, 창문을 온몸으로 받아 깨면서 밖으로 뛰쳐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위력이 왕성하게 작동할 때, 위력은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위력은 그저 작동한다. 가장 잘 작동할 때는 명령할 필요도 없다. 니코틴이 부족해 보이면 누군가 알아서 담배를 사러 나간다.
-스스로 대성당을 짓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완성된 대성당에서 편하게 자리를 얻으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텍쥐페리)
-악이 너무도 뻔뻔할 경우, 그 악의 비판자들은 쉽게 타락하곤 한다. 자신들은 저 정도로 뻔뻔한 악은 아니라는 사실에 쉽게 안도하고, 스스로를 쉽사리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염세와 자살은 관념의 유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다."
-사람은 밥 없어도 못살고, 사회가 없어도 못산다지만 의미가 없어도 못산다.........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못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도한다.
-아는 자는 행동하지 않고, 모르는 자는 돌진한다. 이것이 인생 아니던가?
-김교수는 찰나의 행복보다는 차라리 '소소한 근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했다. '왜 만화 연재가 늦어지는 거지?', '왜 디저트가 맛이 없는 거지?' 같은 소소한 근심을 누리는 건, 그것을 압도할 큰 근심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저자는 대학의 정치사상사 교수지만 흥미로운 이력도 있다. 독립영화 만드는 일에도 참여했었고, 영화평론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한다.
책의 제목으로 내용 전반을 짐작한다면 다소 당황 또는 실망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주제의 다양한 짧은 글들을 부담없이 만날 수 있다.
제목은 memento mori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무난할 것 같다.
해학적, 조소적이며 풍부한 유머감각으로 아주 재치있고, 한마디로 재미있다. 비교적 가볍고 소소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내고 있지만 기저에는 냉철하고 무거운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도 하다.
한가지 시덥잖은 의문이라면, 저자가 제시하는 사례나 인용하는 문구의 상당수가 특이하게도 일본의 작가, 학자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한국, 중국의 예는 거의 없음)
일본에 호의적이라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보편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다소 과다하다고 느껴져서 이유가 잠시 궁금해졌을 뿐이다.
(인상 깊은 문구)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무시한다. (루크레티우스)
-내리는 눈을 올려다보고 있자면, 모래시계 바닥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만화 '허니와 클로버' 中)
-이렇듯 성장은, 익숙하지만 이제는 지나치게 작아져버린 세계를 떠나는 여행일 수밖에 없다.
-당겨진 활시위만이 이완될 수 있다.
-삶이 진행되는 동안은 삶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기에 죽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소멸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 어떤 존재를 지탱했던 조건이 사라지면 그 존재도 사라진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멸의 여부가 아니라 소멸의 방식이다.
-그때도 나는 다소곳이 앉아 있기보다는 앞에 놓인 탁자를 당수로 쪼개며 "선생님들, 논문을 읽지도 않고 심사한다고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목젖을 뽑아 줄넘기를 한 다음에, 창문을 온몸으로 받아 깨면서 밖으로 뛰쳐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위력이 왕성하게 작동할 때, 위력은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위력은 그저 작동한다. 가장 잘 작동할 때는 명령할 필요도 없다. 니코틴이 부족해 보이면 누군가 알아서 담배를 사러 나간다.
-스스로 대성당을 짓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완성된 대성당에서 편하게 자리를 얻으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텍쥐페리)
-악이 너무도 뻔뻔할 경우, 그 악의 비판자들은 쉽게 타락하곤 한다. 자신들은 저 정도로 뻔뻔한 악은 아니라는 사실에 쉽게 안도하고, 스스로를 쉽사리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염세와 자살은 관념의 유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다."
-사람은 밥 없어도 못살고, 사회가 없어도 못산다지만 의미가 없어도 못산다.........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못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도한다.
-아는 자는 행동하지 않고, 모르는 자는 돌진한다. 이것이 인생 아니던가?
-김교수는 찰나의 행복보다는 차라리 '소소한 근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했다. '왜 만화 연재가 늦어지는 거지?', '왜 디저트가 맛이 없는 거지?' 같은 소소한 근심을 누리는 건, 그것을 압도할 큰 근심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2명이 좋아해요
2019년 1월 2일
 2
2
 0
0
뷔리당의나귀님의 다른 게시물

뷔리당의나귀
@bwiridangeuinagui
이 책은 상, 하권으로 분책되어 있고 각자 연결되어 있는 세개의 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소설: 1888ㆍ파제노 혹은 낭만주의, 두번째 소설: 1903ㆍ에슈 혹은 무정부주의, 세번째 소설: 1918ㆍ후게나우 혹은 즉물주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부작 소설의 각 제목들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문명이 몰락하는 과정의 각 단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상권에 두개, 하권에 세번째 소설이 실려 있다.
구입한 상, 하권의 발행일이 달라 연결되는 페이지 숫자도 맞지 않았고 인쇄 글자의 폰트 크기나 글자간 밀도가 같지 않았다. 아마도 하권의 남아있던 재고가 나에게 온 것 같다.
어쨋든 내가 구입한 책의 기준으로도 1,000페이지에 가까운 상당한 분량이며, 내가 갖고있지 않은 최근 발행한 하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0페이지를 훌쩍 넘길 것이다. 완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쓰여졌지만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첫 대면하는 작가의 지적이고 치밀한 문체, 문장에 내면이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밀란 쿤데라의 호평으로 선택한 책이었고, 특이한 구성과 세밀한 심리/상황 묘사 등이 인상적이었으며 문체 등 부분적으로는 사견이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단면이 연상되기도 했다.(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다소 아쉬운 것은 일부 인물들의 생각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적지 않았는데 그것이 시대의 한계인지, 지역적인 특성이나 젠더에 대한 몰이해인지, 어쨋거나 아직도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인상 깊은 문구)
-그들은 그것을 승리처럼 느꼈지만, 그 승리에 패배가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포옹 속에서 인식에의 눈을 감아 버렸다.
-엘리자베트는 그의 손이 꼬옥 쥐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건 마치 그녀를 충분히 확고하게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암시 같았다. 어쩌면 그것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에게 요아힘과 루제나는 그들 본질의 작은 조각만을 지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의 나이에 도달한 존재로 여겨졌다. 커다란 조각이 있는 곳은 어딘가 다른 곳, 어떤 다른 별이나 다른 시대, 혹은 단순히 어린 시절일지도 몰랐다.
-신은 미래를 가림으로써 인간을 축복하고, 과거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저주한다.
-어린 시절을 넘어 어른으로 성장한 그가 고독하고 버림받은 채 언젠가 죽음에 맞서야 함을 예감할 때, 모든 인간이 받는 저 이상한 압박감,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상한 압박감이 찾아들면 인간은 손에 손을 잡고 어두운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갈 동료를 찾는다.
-오직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위험을 두려워한다. 그가 목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유롭고, 자유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감수했던 사람이다....(중략) 그렇다. 죽음 앞에 선 인간에겐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
-자유와 살인은 얼마나 가까운가, 마치 탄생과 죽음처럼! 자유 속에 던져진 사람은 사형대로 다가가며 어머니를 부르는 살인자처럼 고독하다.
-낯선 이방인은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 그는 해방된 사람이니까. 얽매여 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받지.
-어둠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밤은 자유의 시간이며 웃음은 자유롭지 못한 자의 복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 불멸성과 절대성을 현세에서 찾으려는, 그 쫓기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그들이 찾는 것에 대한 상징이나 대용물에 불과함을. 그들은 자기들이 찾는 것을 이름 부를 수 없을 것이었다.
-코른이 그녀를 배반한다면 그녀는 그를 죽이는 대신 황산을 부을 것이다. 그렇다. 그런 식의 분배가 질투에 적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소유했던 자는 대상을 없애려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이용했던 자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레츠키 소위의 팔은 절단되었다. 팔꿈치 윗부분이었다. 쿨렌베크는 일을 하면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야레츠키의 나머지 부분은 병원의 정원에 앉아 있었다.
-왼쪽 팔을 잃은 후부터 오른쪽 팔이 늘어져 있는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것도 잘라 버렸으면 싶습니다
-모든 사유는 공간적인 것에서 발생한다는, 사유 과정은 말할 수 없이 뒤엉클어지고 다차원적인 논리적 공간의 혼지(混知)를 묘사한다는 이러한 이론은 대단히 커다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첫번째 소설: 1888ㆍ파제노 혹은 낭만주의, 두번째 소설: 1903ㆍ에슈 혹은 무정부주의, 세번째 소설: 1918ㆍ후게나우 혹은 즉물주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부작 소설의 각 제목들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문명이 몰락하는 과정의 각 단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상권에 두개, 하권에 세번째 소설이 실려 있다.
구입한 상, 하권의 발행일이 달라 연결되는 페이지 숫자도 맞지 않았고 인쇄 글자의 폰트 크기나 글자간 밀도가 같지 않았다. 아마도 하권의 남아있던 재고가 나에게 온 것 같다.
어쨋든 내가 구입한 책의 기준으로도 1,000페이지에 가까운 상당한 분량이며, 내가 갖고있지 않은 최근 발행한 하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0페이지를 훌쩍 넘길 것이다. 완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쓰여졌지만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첫 대면하는 작가의 지적이고 치밀한 문체, 문장에 내면이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밀란 쿤데라의 호평으로 선택한 책이었고, 특이한 구성과 세밀한 심리/상황 묘사 등이 인상적이었으며 문체 등 부분적으로는 사견이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단면이 연상되기도 했다.(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다소 아쉬운 것은 일부 인물들의 생각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적지 않았는데 그것이 시대의 한계인지, 지역적인 특성이나 젠더에 대한 몰이해인지, 어쨋거나 아직도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인상 깊은 문구)
-그들은 그것을 승리처럼 느꼈지만, 그 승리에 패배가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포옹 속에서 인식에의 눈을 감아 버렸다.
-엘리자베트는 그의 손이 꼬옥 쥐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건 마치 그녀를 충분히 확고하게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암시 같았다. 어쩌면 그것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에게 요아힘과 루제나는 그들 본질의 작은 조각만을 지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의 나이에 도달한 존재로 여겨졌다. 커다란 조각이 있는 곳은 어딘가 다른 곳, 어떤 다른 별이나 다른 시대, 혹은 단순히 어린 시절일지도 몰랐다.
-신은 미래를 가림으로써 인간을 축복하고, 과거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저주한다.
-어린 시절을 넘어 어른으로 성장한 그가 고독하고 버림받은 채 언젠가 죽음에 맞서야 함을 예감할 때, 모든 인간이 받는 저 이상한 압박감,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상한 압박감이 찾아들면 인간은 손에 손을 잡고 어두운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갈 동료를 찾는다.
-오직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위험을 두려워한다. 그가 목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유롭고, 자유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감수했던 사람이다....(중략) 그렇다. 죽음 앞에 선 인간에겐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
-자유와 살인은 얼마나 가까운가, 마치 탄생과 죽음처럼! 자유 속에 던져진 사람은 사형대로 다가가며 어머니를 부르는 살인자처럼 고독하다.
-낯선 이방인은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 그는 해방된 사람이니까. 얽매여 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받지.
-어둠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밤은 자유의 시간이며 웃음은 자유롭지 못한 자의 복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 불멸성과 절대성을 현세에서 찾으려는, 그 쫓기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그들이 찾는 것에 대한 상징이나 대용물에 불과함을. 그들은 자기들이 찾는 것을 이름 부를 수 없을 것이었다.
-코른이 그녀를 배반한다면 그녀는 그를 죽이는 대신 황산을 부을 것이다. 그렇다. 그런 식의 분배가 질투에 적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소유했던 자는 대상을 없애려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이용했던 자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레츠키 소위의 팔은 절단되었다. 팔꿈치 윗부분이었다. 쿨렌베크는 일을 하면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야레츠키의 나머지 부분은 병원의 정원에 앉아 있었다.
-왼쪽 팔을 잃은 후부터 오른쪽 팔이 늘어져 있는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것도 잘라 버렸으면 싶습니다
-모든 사유는 공간적인 것에서 발생한다는, 사유 과정은 말할 수 없이 뒤엉클어지고 다차원적인 논리적 공간의 혼지(混知)를 묘사한다는 이러한 이론은 대단히 커다란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몽유병자들 상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019년 1월 18일
 0
0
 0
0

뷔리당의나귀
@bwiridangeuinagui
'영원의 철학'이란 개념은 여러 종교 전통 속에 보편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핵심 사상을 말한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도교 등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보편적 종교 사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다.
얼마전 켄 윌버의 '모든 것의 역사'를 초반 흥미롭게 읽어 나가다 중간 쯤에서 진도가 정체되서 남은 부분은 나중에 재시도하자 하고 접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섹터의 책을 끝까지 완독하는데는 실패했다.
전개해 나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느꼈다.
저자 올더스 헉슬리는 저 유명한 디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를 쓴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다윈의 불독'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다윈의 호위무사이자 빅마우스로 한세대를 주름잡은 토머스 헉슬리의 손자라는 것이다. 콩 심은데 콩이 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토머스 헉슬리 관련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자면 다윈의 진화론을 주제로 윌버포스 주교와의 논쟁 중 한 장면이다.
-주교: 당신 주장에 따르면 당신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건데, 할아버지 쪽이냐? 할머니 쪽이냐?
-불독: 나는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혈연관계라는 점이 더욱 부끄럽다.
(인상 깊은 문구)
-신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대 영혼의 가장 깊고 가장 중심적인 곳에만 존재하신다. (윌리엄 로)
-시간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의 정책은 언제나 평화롭다. 반면, 박해를 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못마땅한 기억과 유토피아의 꿈을 갖고 있는 과거 및 미래의 숭배자들이다.
-선은 영혼 속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미 거기에 있지만, 감지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슬퍼할 일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느끼는 데서 오는 슬픔을 가장 특별하게 느낀다.
-성인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위기의 순간임을 아는 분이다.
-영혼은 그 영적인 힘으로 마땅히 순수한 영인 신과의 합일로 직접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신의 화신을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사실상 일어날 필요도 없으며 일어나서도 안되는 타락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에티엔 질송)
-깨닫지 못하면 붓다가 곧 중생이요. 한순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붓다이다. (혜능)
-인간은 스스로 우주의 창조자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우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필론)
-이제 내가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된다면, 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토머스 트러헌)
-신이 사랑할 때 그분께서는 사랑 받기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 베르나르)
-자아가 많은 곳에는 신이 그만큼 적어진다. 갈망과 자기이익, 자아중심적인 생각ㆍ느낌ㆍ소망ㆍ행위로 구성된 부분적이면서도 분리된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만이 삶의 신성하면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최고가 타락할 때 최악이 된다.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만일 교황이 예수회 신학대학을 탄압한다면 어떤 기분이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25분 정도 기도하고는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겁니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이것이나 저것인 한, 혹은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나는 모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것이나 저것이 되지 않고, 이것이나 저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까지 순수해지라. 그러면 그대는 어디에나 있으며 이것이나 저것이 아닌 모든 것이다. (에크하르트)
얼마전 켄 윌버의 '모든 것의 역사'를 초반 흥미롭게 읽어 나가다 중간 쯤에서 진도가 정체되서 남은 부분은 나중에 재시도하자 하고 접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섹터의 책을 끝까지 완독하는데는 실패했다.
전개해 나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느꼈다.
저자 올더스 헉슬리는 저 유명한 디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를 쓴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다윈의 불독'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다윈의 호위무사이자 빅마우스로 한세대를 주름잡은 토머스 헉슬리의 손자라는 것이다. 콩 심은데 콩이 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토머스 헉슬리 관련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자면 다윈의 진화론을 주제로 윌버포스 주교와의 논쟁 중 한 장면이다.
-주교: 당신 주장에 따르면 당신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건데, 할아버지 쪽이냐? 할머니 쪽이냐?
-불독: 나는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혈연관계라는 점이 더욱 부끄럽다.
(인상 깊은 문구)
-신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대 영혼의 가장 깊고 가장 중심적인 곳에만 존재하신다. (윌리엄 로)
-시간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의 정책은 언제나 평화롭다. 반면, 박해를 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못마땅한 기억과 유토피아의 꿈을 갖고 있는 과거 및 미래의 숭배자들이다.
-선은 영혼 속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미 거기에 있지만, 감지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슬퍼할 일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느끼는 데서 오는 슬픔을 가장 특별하게 느낀다.
-성인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위기의 순간임을 아는 분이다.
-영혼은 그 영적인 힘으로 마땅히 순수한 영인 신과의 합일로 직접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신의 화신을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사실상 일어날 필요도 없으며 일어나서도 안되는 타락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에티엔 질송)
-깨닫지 못하면 붓다가 곧 중생이요. 한순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붓다이다. (혜능)
-인간은 스스로 우주의 창조자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우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필론)
-이제 내가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된다면, 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토머스 트러헌)
-신이 사랑할 때 그분께서는 사랑 받기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 베르나르)
-자아가 많은 곳에는 신이 그만큼 적어진다. 갈망과 자기이익, 자아중심적인 생각ㆍ느낌ㆍ소망ㆍ행위로 구성된 부분적이면서도 분리된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만이 삶의 신성하면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최고가 타락할 때 최악이 된다.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만일 교황이 예수회 신학대학을 탄압한다면 어떤 기분이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25분 정도 기도하고는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겁니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이것이나 저것인 한, 혹은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나는 모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것이나 저것이 되지 않고, 이것이나 저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까지 순수해지라. 그러면 그대는 어디에나 있으며 이것이나 저것이 아닌 모든 것이다. (에크하르트)

영원의 철학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019년 1월 6일
 0
0
 0
0

뷔리당의나귀
@bwiridangeuinagui
이 책의 원제는 'The identity of man'으로 직역하자면 '인간의 정체성'이다.
평소 사견으로 '인간의 정체성이란,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들 60%(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즉 경험)와 읽은 책 30%(잡지 또는 고전이건 인터넷 글이건)와 타고난 유전자 10%의 영향력으로 구성된다'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나한테 영향을 주어 나를 나답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동력이 그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외부에 있는 자연을 미래로 향해서 상상할 때에는 거기서 과학이라는 지식 양태를 창조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나 자신을 미래를 향해 상상할 때에는 또 다른 지식의 양태인 자아에 관한 지식을 창조한다. 이 두 양태의 지식이야말로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불가분의 두 부분이다.'
경험을 통해 얻는 두가지 지식, 즉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학에 관한 지식 양태와 자아에 관한 지식 양태(특히 문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예리하게 기술하고 있다
(인상 깊은 문구)
-간단히 말해 인간은 어떤 고정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경험에 의해서 끊임없이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경험이란 바로 우리 자신이며 또한 우리를 위한 세계 자체이다. 경험은 우리를 세계의 일부로 만들어준다.
-모든 인간의 언어에서 약간의 모호성을 피할 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학의 언어 또한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최대한 집약적으로 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언어이다.
-자아는 하나의 '것' 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그 과정은 나의 생이 끝을 맺을 때까지 내가 쌓아온,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행동으로 구성될 것이다.
-진실은 어떠한 신념일지라도 그것이 진실과 모순될 때에는 존속할 수 없다는 가정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여러 사회적 가치의 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선악의 선택이 진위의 선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기계이며, 경험을 통해 자아가 된다. 인간 자아의 특성은 자연에 관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관한 경험에 있다.
-자연에 관한 지식은 인간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며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게 한다. 자아에 관한 지식은 그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지를 가르쳐준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자연을 기술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자연이 지나치게 완고하고 별나서가 아니라, 우리 언어의 제한성 때문이다.
-이제 모든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어떠한 표현도 불완전하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과학적인 주장은 하나의 근사치이다.
-문학이라는 예술이 가진 힘과 그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들 안에서 발견하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타인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데 있다.
평소 사견으로 '인간의 정체성이란,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들 60%(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즉 경험)와 읽은 책 30%(잡지 또는 고전이건 인터넷 글이건)와 타고난 유전자 10%의 영향력으로 구성된다'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나한테 영향을 주어 나를 나답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동력이 그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외부에 있는 자연을 미래로 향해서 상상할 때에는 거기서 과학이라는 지식 양태를 창조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나 자신을 미래를 향해 상상할 때에는 또 다른 지식의 양태인 자아에 관한 지식을 창조한다. 이 두 양태의 지식이야말로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불가분의 두 부분이다.'
경험을 통해 얻는 두가지 지식, 즉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학에 관한 지식 양태와 자아에 관한 지식 양태(특히 문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예리하게 기술하고 있다
(인상 깊은 문구)
-간단히 말해 인간은 어떤 고정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경험에 의해서 끊임없이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경험이란 바로 우리 자신이며 또한 우리를 위한 세계 자체이다. 경험은 우리를 세계의 일부로 만들어준다.
-모든 인간의 언어에서 약간의 모호성을 피할 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학의 언어 또한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최대한 집약적으로 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언어이다.
-자아는 하나의 '것' 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그 과정은 나의 생이 끝을 맺을 때까지 내가 쌓아온,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행동으로 구성될 것이다.
-진실은 어떠한 신념일지라도 그것이 진실과 모순될 때에는 존속할 수 없다는 가정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여러 사회적 가치의 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선악의 선택이 진위의 선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기계이며, 경험을 통해 자아가 된다. 인간 자아의 특성은 자연에 관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관한 경험에 있다.
-자연에 관한 지식은 인간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며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게 한다. 자아에 관한 지식은 그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지를 가르쳐준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자연을 기술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자연이 지나치게 완고하고 별나서가 아니라, 우리 언어의 제한성 때문이다.
-이제 모든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어떠한 표현도 불완전하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과학적인 주장은 하나의 근사치이다.
-문학이라는 예술이 가진 힘과 그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들 안에서 발견하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타인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데 있다.

인간을 묻는다


2명이 좋아해요
2018년 12월 29일
 2
2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