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EGOOL
@gaegool
+ 팔로우


괜시리 내 손을 한 번 쳐다보게 되는 책.
숨길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손이라는 신체를 중점으로 각 인물들의 삶이 나타난다.
읽을 수록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등장인물 모두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서 침울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다.
석고로 본뜨는 행위를 통해 나의 딱딱한 껍데기를 뜯어내고 그것을 내버려둔채 나아가는 것이 치유의 과정이었나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뜯어낼 수 있는 딱딱한 껍데기와 달리 여전히 내 속과 맞닿아 엉겨있는 껍질은 분리할 수 없기에, 결국은 그것과 함께 나아가야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치유되는 것이라고 느꼈다.
숨길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손이라는 신체를 중점으로 각 인물들의 삶이 나타난다.
읽을 수록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등장인물 모두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서 침울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다.
석고로 본뜨는 행위를 통해 나의 딱딱한 껍데기를 뜯어내고 그것을 내버려둔채 나아가는 것이 치유의 과정이었나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뜯어낼 수 있는 딱딱한 껍데기와 달리 여전히 내 속과 맞닿아 엉겨있는 껍질은 분리할 수 없기에, 결국은 그것과 함께 나아가야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치유되는 것이라고 느꼈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주 전
 0
0
 0
0
GAEGOOL님의 다른 게시물

GAEGOOL
@gaegool
바벨의 모임이라는 묘한 공통점 아래서 벌어지는 단편들.
<북관의 죄인>, <다마노 이스즈의 명예>처럼 번뜩이고 감탄이 나오는 작품들은 좋았지만, 정작 챡의 제목을 상징하는 단편은 기대치를 끌어올리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느낌이라 조금 아쉽다.
짧게 미스터리를 체험하고 싶다면 나쁘지 않을지도...
<북관의 죄인>, <다마노 이스즈의 명예>처럼 번뜩이고 감탄이 나오는 작품들은 좋았지만, 정작 챡의 제목을 상징하는 단편은 기대치를 끌어올리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느낌이라 조금 아쉽다.
짧게 미스터리를 체험하고 싶다면 나쁘지 않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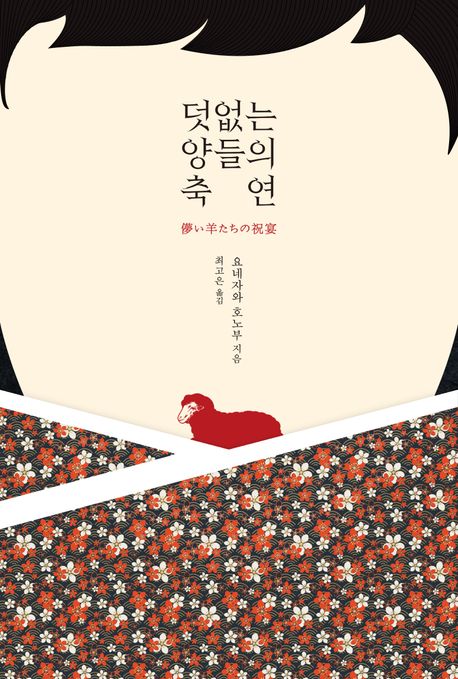
덧없는 양들의 축연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7시간 전
 0
0
 0
0

GAEGOOL
@gaeg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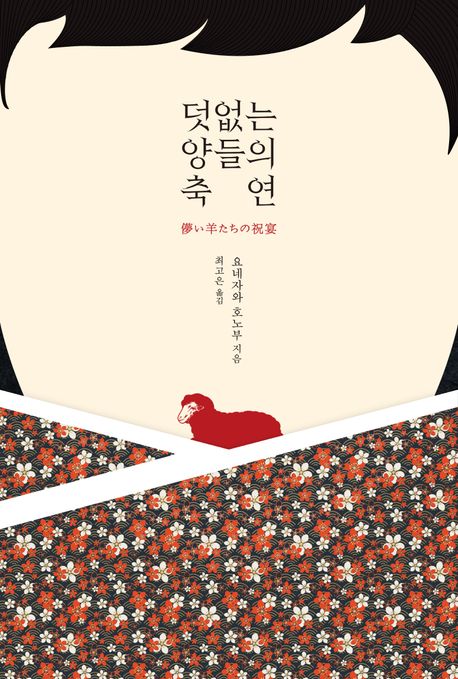
덧없는 양들의 축연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7시간 전
 0
0
 0
0

GAEGOOL
@gaegool
가가형사 시리즈의 단편집.
독자에게 결말을 완성하게 한 전 작품들과는 달리 모든 단편이 깔끔하게 끝난다. 다만, 미스터리에서 단편은 으레 끝맛이 씁쓸한 경우가 많아 읽고 나면 왠지 마음이 가라앉는다.
가볍게 읽고 싶다면 나쁘지 않은 듯 하다.
독자에게 결말을 완성하게 한 전 작품들과는 달리 모든 단편이 깔끔하게 끝난다. 다만, 미스터리에서 단편은 으레 끝맛이 씁쓸한 경우가 많아 읽고 나면 왠지 마음이 가라앉는다.
가볍게 읽고 싶다면 나쁘지 않은 듯 하다.

거짓말 딱 한개만 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6일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