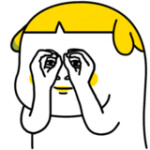
혀누
@banduck2
+ 팔로우


‘일단은 죄송하다’라는 작가의 말에 책을 다 읽고나서 올라오는 거친감정을 나도 일단은 눌렀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친년(?) 같은 책이랄까. 작가가 사이코패스적인 상상을 상상으로 그치지않고 써버리고야 말았다.
처음엔 주인공인 영아가 답답했다. 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않고 남의 의견만 따르는지, 본인을 이리저리 휘두르려는 절친과 남자친구을 왜 주인공만 이해하려고 하는지, 내 생각은 왜 항상 무시당하는지 등 착해서 이용당하는 전형적인 줏대없고 답답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가상의 치료를 받은 영아가 더이상 참지 않고 통제선을 과도하게 넘는 발언과 행동을 내지를때 자유의 희열보다는 오히려 광기가 느껴졌고 무서웠다. 자유롭게 언행을 뱉고 싶은대로 배설해버리는 것은 통제당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인듯 싶다. 사람들이 상호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것은 통제가 작용된다는 조건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통제 안에서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것임을 느꼈다.
착하다는 건 무엇일까. 누구에게 착한 것일까.
또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착한 사람일까, 아니면 악한 사람일까. 통제와 자유 중 어떤걸 추구해야 하는가
이면의 내 본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고민할 수 있는 책이다.
상호간의 존중만이 느슨한 통제에도 더 큰 자유를 이루게 한다.
✏️
P.55
세상을 스펙트럼화한다면 간단히 세 영역으로 나뉠 것이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의 흐릿한 어떤 것.
P.120
평등 안에 불평등이 숨어 있다
P.124
그래서 나는 쉬운 선택지를 택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보다 일상에 모순을 더하는 일이 쉬웠다.
같은 정당이라면 아무리 멍청한 소리를 해도 지지하는 정치인을 머저리다 욕할 필요가 없다. 친구가 장사하면, 아무리 바보 같은 물건이라도 좋다고 홍보해 주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다 욕할 필요도 없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사람다움의 본질은 때때로 얄팍하다.
하지만 사과 씨를 심은 곳에서 오렌지 나무가 자라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듯이, 기대로 쌓은 관계가 틀어질 때, 그때는 괘씸함에 배신감까지 추가되어 되돌릴 수 없는 적이 태어난다. 멍청한 소리까지 지지해줬던 동료 정치인들이 돌아설 때 가장 큰 적이 되고, 바보 같은 물건을 홍보해 줬던 친구가 돌아서면 가장 곤란한 민원인이 되는 것처럼. 나 또한 은주에게 그런 적이 되어 주기로 했다.
P.125
나는 너를 존중할 수 있다.
단 네가 나를 존중 할 때만.
P.133
나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은주’와 친구가 되어도 내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P.159
통제와 해방은 짝꿍이라 함께 있을 때 더 빛나거든요. 뭐든지 균형이 존재해야만 극단으로도 치달아 볼 수도 있지요.
처음엔 주인공인 영아가 답답했다. 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않고 남의 의견만 따르는지, 본인을 이리저리 휘두르려는 절친과 남자친구을 왜 주인공만 이해하려고 하는지, 내 생각은 왜 항상 무시당하는지 등 착해서 이용당하는 전형적인 줏대없고 답답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가상의 치료를 받은 영아가 더이상 참지 않고 통제선을 과도하게 넘는 발언과 행동을 내지를때 자유의 희열보다는 오히려 광기가 느껴졌고 무서웠다. 자유롭게 언행을 뱉고 싶은대로 배설해버리는 것은 통제당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인듯 싶다. 사람들이 상호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것은 통제가 작용된다는 조건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통제 안에서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것임을 느꼈다.
착하다는 건 무엇일까. 누구에게 착한 것일까.
또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착한 사람일까, 아니면 악한 사람일까. 통제와 자유 중 어떤걸 추구해야 하는가
이면의 내 본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고민할 수 있는 책이다.
상호간의 존중만이 느슨한 통제에도 더 큰 자유를 이루게 한다.
✏️
P.55
세상을 스펙트럼화한다면 간단히 세 영역으로 나뉠 것이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의 흐릿한 어떤 것.
P.120
평등 안에 불평등이 숨어 있다
P.124
그래서 나는 쉬운 선택지를 택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보다 일상에 모순을 더하는 일이 쉬웠다.
같은 정당이라면 아무리 멍청한 소리를 해도 지지하는 정치인을 머저리다 욕할 필요가 없다. 친구가 장사하면, 아무리 바보 같은 물건이라도 좋다고 홍보해 주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다 욕할 필요도 없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사람다움의 본질은 때때로 얄팍하다.
하지만 사과 씨를 심은 곳에서 오렌지 나무가 자라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듯이, 기대로 쌓은 관계가 틀어질 때, 그때는 괘씸함에 배신감까지 추가되어 되돌릴 수 없는 적이 태어난다. 멍청한 소리까지 지지해줬던 동료 정치인들이 돌아설 때 가장 큰 적이 되고, 바보 같은 물건을 홍보해 줬던 친구가 돌아서면 가장 곤란한 민원인이 되는 것처럼. 나 또한 은주에게 그런 적이 되어 주기로 했다.
P.125
나는 너를 존중할 수 있다.
단 네가 나를 존중 할 때만.
P.133
나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은주’와 친구가 되어도 내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P.159
통제와 해방은 짝꿍이라 함께 있을 때 더 빛나거든요. 뭐든지 균형이 존재해야만 극단으로도 치달아 볼 수도 있지요.


2명이 좋아해요
3개월 전
 2
2
 0
0
혀누님의 다른 게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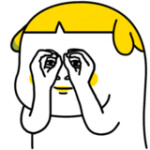
혀누
@banduck2
책 전반부는 육아에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어 미혼인 나는 조카들을 생각하며 이모 마음으로 읽었다. 그리고 나의 유년시절은 어땠나 생각해봤다. 많이 혼나긴 했어도 자식을 믿고 자유롭게 키워주신 부모님 덕에 할 말 하는 사람으로, 하고 싶은게 뭔지 아는 사람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큰 것 같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나도 어렸을 땐 ’왜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방치할까?‘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서툴긴 했어도 부모님은 항상 우리 세 자매를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을.
・
후반부로 갈수록 ‘내’ 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용이라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나는 평상시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려고 꽤나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 같다. 나도 어렸을 땐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배신감과 그 후에 따르는 상실감도 많이 느꼈지만, 남의 마음은 내것이 아닌걸 생각하니 맘이 편해졌던 경험 때문일거다. 스스로 이런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는게 내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또, 관계에서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밸런스에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한다. 여기서 착하다는 건 다 남의 뜻대로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꽤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
P.51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요구가 아닌 조건 없는 수용과 수긍이에요. 조건 없이 자식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잘나도 못나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먼저 수긍해야 하는 건 언제나 부모 쪽이어야 합니다. 요구는 자식의 몫이에요.
P.62
한발 떨어져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 보세요. 부모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못난 사람이라고 나도 못난 사람은 아니에요.
P.99
우리가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 학력,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P.246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선물을 자주 하게 되는데 선물에는 편지나 카드를 꼭 넣어 주세요. 상자를 하나 정해서 부모에게 받는 편지나 카드를 모아 두게 하세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편지에는 사랑이 듬뿍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카드는, 특히나 살면서 큰 힘이 됩니다. 아이에게 ‘내가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를 느끼게 하거든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학력이 아니에요. 결국 따뜻한 기억, 행복했던 추억뿐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도 결국 그것입니다.
P.251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와 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내 아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P.269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자긍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긍심은 ‘내’ 안에서 끝나야 해요. ‘나‘의 경계를 넘어가면 오만입니다. 자긍심은 ’내’가 ‘나’를 위해 좀 느끼고, ‘내’가 정서적으로 기쁘고 안정되는 정도의 선이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남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런 면에서는 남을 좀 의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좋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나 표현, 표현된 내용이 ‘나’에게서 끝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될 때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P.275💕
인간은 나름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그냥 저의 삶이에요.
P.291💕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거에요. 옳고 그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은 딱 업무까지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은 그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만큼만 하세요. 그렇지 않은 관계는 정리하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애를 썻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P.307
늘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의미는 인간이 부여하는 거에요. 동이 터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나름대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게 살았다면 그게 오늘의 최선입니다.
・
후반부로 갈수록 ‘내’ 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용이라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나는 평상시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려고 꽤나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 같다. 나도 어렸을 땐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배신감과 그 후에 따르는 상실감도 많이 느꼈지만, 남의 마음은 내것이 아닌걸 생각하니 맘이 편해졌던 경험 때문일거다. 스스로 이런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는게 내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또, 관계에서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밸런스에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한다. 여기서 착하다는 건 다 남의 뜻대로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꽤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
P.51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요구가 아닌 조건 없는 수용과 수긍이에요. 조건 없이 자식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잘나도 못나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먼저 수긍해야 하는 건 언제나 부모 쪽이어야 합니다. 요구는 자식의 몫이에요.
P.62
한발 떨어져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 보세요. 부모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못난 사람이라고 나도 못난 사람은 아니에요.
P.99
우리가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 학력,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P.246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선물을 자주 하게 되는데 선물에는 편지나 카드를 꼭 넣어 주세요. 상자를 하나 정해서 부모에게 받는 편지나 카드를 모아 두게 하세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편지에는 사랑이 듬뿍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카드는, 특히나 살면서 큰 힘이 됩니다. 아이에게 ‘내가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를 느끼게 하거든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학력이 아니에요. 결국 따뜻한 기억, 행복했던 추억뿐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도 결국 그것입니다.
P.251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와 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내 아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P.269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자긍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긍심은 ‘내’ 안에서 끝나야 해요. ‘나‘의 경계를 넘어가면 오만입니다. 자긍심은 ’내’가 ‘나’를 위해 좀 느끼고, ‘내’가 정서적으로 기쁘고 안정되는 정도의 선이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남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런 면에서는 남을 좀 의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좋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나 표현, 표현된 내용이 ‘나’에게서 끝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될 때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P.275💕
인간은 나름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그냥 저의 삶이에요.
P.291💕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거에요. 옳고 그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은 딱 업무까지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은 그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만큼만 하세요. 그렇지 않은 관계는 정리하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애를 썻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P.307
늘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의미는 인간이 부여하는 거에요. 동이 터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나름대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게 살았다면 그게 오늘의 최선입니다.

오은영의 화해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개월 전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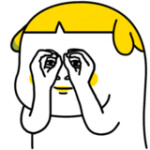
혀누
@banduck2
정말 오랜만에 재밌게 읽은 소설책!
구매하고 보니 요새 MZ에게 인기있는 책이라더라.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흡입력 좋게 완독까지 이어져서 뿌듯했다.
왜 재밌었나 생각해보니, 아마 초반부터 도파민 터지는 스토리로 시작하여 현실감있게 위기도 그려내고, 그렇지만 꽉 닫힌 해피엔딩이라 그렇지 않았을까…?
사랑의 힘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가장 가여운 사람은 또 누구인가. 해피엔딩이 정답인가.
✏️
P.100
도담에게 사랑은 급류와 같은 위험한 이름이었다. 휩쓸려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발가벗은 시체로 떠오르는 것, 다슬기가 온몸을 뒤덮는 것이다. 더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 물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절망에 빠지다. 빠진다는 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신 도담은 냉소에 빠졌다. 결국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소통보다 침묵을 더 신뢰했다. 심각하지 않고 한없이 가벼워지고 싶었다.
P.256
“도담아, 슬픔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슬픔에도 중독될 수 있어. 슬픔이 행복보다 익숙해지고 행복이 낯설어질 수 있어. 우리 그러지 말자.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겪자.“
구매하고 보니 요새 MZ에게 인기있는 책이라더라.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흡입력 좋게 완독까지 이어져서 뿌듯했다.
왜 재밌었나 생각해보니, 아마 초반부터 도파민 터지는 스토리로 시작하여 현실감있게 위기도 그려내고, 그렇지만 꽉 닫힌 해피엔딩이라 그렇지 않았을까…?
사랑의 힘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가장 가여운 사람은 또 누구인가. 해피엔딩이 정답인가.
✏️
P.100
도담에게 사랑은 급류와 같은 위험한 이름이었다. 휩쓸려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발가벗은 시체로 떠오르는 것, 다슬기가 온몸을 뒤덮는 것이다. 더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 물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절망에 빠지다. 빠진다는 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신 도담은 냉소에 빠졌다. 결국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소통보다 침묵을 더 신뢰했다. 심각하지 않고 한없이 가벼워지고 싶었다.
P.256
“도담아, 슬픔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슬픔에도 중독될 수 있어. 슬픔이 행복보다 익숙해지고 행복이 낯설어질 수 있어. 우리 그러지 말자.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겪자.“

급류


2명이 좋아해요
2개월 전
 2
2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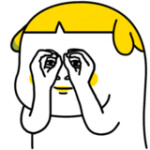
혀누
@banduck2
청소년권장도서 느낌 물씬🍀
중학생 아이들의 이야기라 푸릇함이 느껴지고, 술술 쉽게 읽힌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순수하고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지던 그런 때. 아이패드를 갖기 위해 2만원씩 모으는 연수가 기특하고, 너무 커버려 고민없이 살 수 있는 내가 뿌듯하면서도 조금 서글펐다. 결론. 청소년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P.185
어른들이 적당한 거라고 하면, 애들은 싼 거 사라는 말로 들어요. 아시잖아요, 전자 제품은 좋은 걸로 사야 오래 쓰는 거. 이 전화기 같은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 무슨 휴대전화냐고 안 그랬어요? 지금 봐, 다 들고 다니지. 그거 벌써 요즘 애들 다 하나씩은 있더만. 우리 연수도 좋은 걸로 하나 사 줍시다. 애가 가지고 싶은 걸 왜 어른 심정으로 사 주려고 해요, 애 심정으로 사줘야지.
P.193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지 아주 잘 이해되는 날이었다. 부자는 그것을 살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따지는 사람들이었다.
중학생 아이들의 이야기라 푸릇함이 느껴지고, 술술 쉽게 읽힌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순수하고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지던 그런 때. 아이패드를 갖기 위해 2만원씩 모으는 연수가 기특하고, 너무 커버려 고민없이 살 수 있는 내가 뿌듯하면서도 조금 서글펐다. 결론. 청소년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P.185
어른들이 적당한 거라고 하면, 애들은 싼 거 사라는 말로 들어요. 아시잖아요, 전자 제품은 좋은 걸로 사야 오래 쓰는 거. 이 전화기 같은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 무슨 휴대전화냐고 안 그랬어요? 지금 봐, 다 들고 다니지. 그거 벌써 요즘 애들 다 하나씩은 있더만. 우리 연수도 좋은 걸로 하나 사 줍시다. 애가 가지고 싶은 걸 왜 어른 심정으로 사 주려고 해요, 애 심정으로 사줘야지.
P.193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지 아주 잘 이해되는 날이었다. 부자는 그것을 살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따지는 사람들이었다.

모두의 연수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개월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