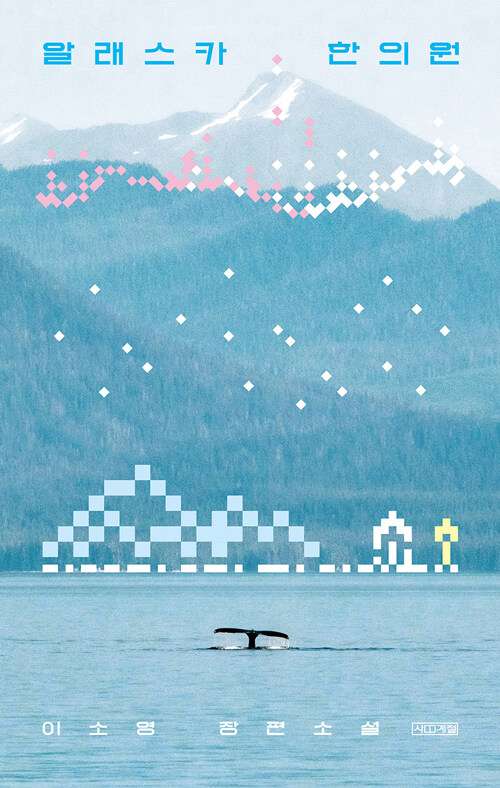뇸나리
@onjoy
+ 팔로우


기록을 함으로써 휘발될 나의 감상들이 되새김질되어 조금이라도 오래갔으면 하는 바람에 후기를 써본다.
[존엄성]
95p
흥미로운 사실은,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과 상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도덕시간에 곧잘 언급되는 주제였다. 인간은 인간으로써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 그치만 어느 날 모두가 폭력이 옳다고 말했을 때, 나는 순응하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에 가해질 폭력을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군중심리”로 알려진 이러한 인간의 특성이 결국 우리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54p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수십개의 다리가 달린 괴물의 사체처럼 한 덩어리가 된 우리들의 몸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있다면.
134p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우리는 평화에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근데 현재의 평화는 무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 외면하고 있을 뿐 세계 어딘가는 여전히 밤의 눈이 지켜보며, 어딘가는 군인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고 있다. 인간은 결국은 잔인해지는 존재가 아닐까.
인류의 존엄성 따위는 그냥 약속 같은 게 아닐까. 소수의 평화를 해치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 인간의 악한 본성을 뒤로 숨긴 채 약속하는 척 하는 그런 정치질.
결국 수백 년, 수천 년간 되풀이된 폭력의 산물인 현재의 우리가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게 코미디인 게 아닐까. 인간은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까. 언제나 굴욕당하고, 훼손 당해왔던 그런 게 그냥 인간인 게 아닐까.
119p
우,우리는 … 주,죽을 가,각오를 했었잖아요.
김진수의 공허한 눈이 내 눈과 마주친 것은 그때였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굶기고 고문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른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겠다.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몸, 상처가 문드러지는 몸, 굶주린 짐승 같은 몸뚱어리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주겠다.
그러고 나니 흔히 말하는 사명, 애국심, 존엄성 그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도 붙들어야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참한 과거를 생각하니 그냥 허무해졌다.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책 한권으로 유리같이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겐 영원한 기억]
207p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해요, 라고 고문 생존자가 말하는 인터뷰를 읽었다. 뼈와 근육에 침착된 방사선 물질이 수십년간 몸속에 머무르며 염색체를 변형시킨다… 피폭된 자가 죽는다 해도, 몸을 태워 뼈만 남긴다해도 그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100p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해 교과서로만 접했던 나는 그저 외우기 싫은 연도와 지명과 인명의 연속으로 지겨워하는 과목으로 여겨졌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이고 과거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의 눈으로 동호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들의 슬픔과 분노, 아픔이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영원히. 하루하루 더 각인되며 그들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현실이고, 재앙이었다. 방사능 피폭과도 비슷하다는 그 말처럼,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겨지고 새겨져서 강해진다는 말처럼. 교과서 속의 몇 단어로 끝나는, 외워야 하는 시험 범위에 끝날 그 몇 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지옥이었던 것이다.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써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삶의 의미를 약탈당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 양심과 존엄, 혼, 꿈. 이런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작가는 명확한 결론을 쉽게 쥐어주지 않는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이 투명하고 깨지기 쉬운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것이 과연 숭고한 건 맞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는 그저 살덩어리일 뿐인지.
[존엄성]
95p
흥미로운 사실은,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과 상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도덕시간에 곧잘 언급되는 주제였다. 인간은 인간으로써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 그치만 어느 날 모두가 폭력이 옳다고 말했을 때, 나는 순응하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에 가해질 폭력을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군중심리”로 알려진 이러한 인간의 특성이 결국 우리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54p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수십개의 다리가 달린 괴물의 사체처럼 한 덩어리가 된 우리들의 몸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있다면.
134p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우리는 평화에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근데 현재의 평화는 무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 외면하고 있을 뿐 세계 어딘가는 여전히 밤의 눈이 지켜보며, 어딘가는 군인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고 있다. 인간은 결국은 잔인해지는 존재가 아닐까.
인류의 존엄성 따위는 그냥 약속 같은 게 아닐까. 소수의 평화를 해치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 인간의 악한 본성을 뒤로 숨긴 채 약속하는 척 하는 그런 정치질.
결국 수백 년, 수천 년간 되풀이된 폭력의 산물인 현재의 우리가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게 코미디인 게 아닐까. 인간은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까. 언제나 굴욕당하고, 훼손 당해왔던 그런 게 그냥 인간인 게 아닐까.
119p
우,우리는 … 주,죽을 가,각오를 했었잖아요.
김진수의 공허한 눈이 내 눈과 마주친 것은 그때였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굶기고 고문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른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겠다.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몸, 상처가 문드러지는 몸, 굶주린 짐승 같은 몸뚱어리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주겠다.
그러고 나니 흔히 말하는 사명, 애국심, 존엄성 그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도 붙들어야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참한 과거를 생각하니 그냥 허무해졌다.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책 한권으로 유리같이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겐 영원한 기억]
207p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해요, 라고 고문 생존자가 말하는 인터뷰를 읽었다. 뼈와 근육에 침착된 방사선 물질이 수십년간 몸속에 머무르며 염색체를 변형시킨다… 피폭된 자가 죽는다 해도, 몸을 태워 뼈만 남긴다해도 그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100p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해 교과서로만 접했던 나는 그저 외우기 싫은 연도와 지명과 인명의 연속으로 지겨워하는 과목으로 여겨졌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이고 과거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의 눈으로 동호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들의 슬픔과 분노, 아픔이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영원히. 하루하루 더 각인되며 그들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현실이고, 재앙이었다. 방사능 피폭과도 비슷하다는 그 말처럼,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겨지고 새겨져서 강해진다는 말처럼. 교과서 속의 몇 단어로 끝나는, 외워야 하는 시험 범위에 끝날 그 몇 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지옥이었던 것이다.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써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삶의 의미를 약탈당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 양심과 존엄, 혼, 꿈. 이런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작가는 명확한 결론을 쉽게 쥐어주지 않는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이 투명하고 깨지기 쉬운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것이 과연 숭고한 건 맞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는 그저 살덩어리일 뿐인지.


2명이 좋아해요
1개월 전
 2
2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