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onjin
@kwonsoonjin
+ 팔로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미래도 아니요 과거도 아니요, 현재 자체다. 한낱 입자 한 개의 상태조차 완벽히 파악할 수 없으니 말이다. 기본 입자를 아무리 꼼꼼히 조사하더라도, 모호하고 미확정적이고 불확실한 것은 언제나 남기 마련이다. 마치 실재가 우리로 하여금 한 번에 한쪽 눈으로 세상을 수정처럼 투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허락하되 양쪽 눈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
입자는 여러 방식으로 공간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다. 어떻게? 순전히 우연으로. 하이젠베르크가 보기에 어떤 아원자 현상이든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전에는 모든 결과에 대해 원인이 있었지만 이젠 확률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뿐이었다.
만물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물리학이 발견한 것은 슈뢰딩거 와 아인슈타인이 꿈꾸었듯 세계의 끈을 당기는 합리적 신이 지배하는 단단하고 확고한 실재가 아니라 우연을 가지고 노
는 천수여신의 놀랍고도 희한한 세상이었다.
p218
〰️
입자는 여러 방식으로 공간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다. 어떻게? 순전히 우연으로. 하이젠베르크가 보기에 어떤 아원자 현상이든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전에는 모든 결과에 대해 원인이 있었지만 이젠 확률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뿐이었다.
만물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물리학이 발견한 것은 슈뢰딩거 와 아인슈타인이 꿈꾸었듯 세계의 끈을 당기는 합리적 신이 지배하는 단단하고 확고한 실재가 아니라 우연을 가지고 노
는 천수여신의 놀랍고도 희한한 세상이었다.
p218



외 1명이 좋아해요
2개월 전
 4
4
 1
1
Soonjin님의 다른 게시물

Soonjin
@kwonsoonjin
인간보다 먼저 우주로 간 동물들~
라이카만 알고 있었는데 이 그림책을 보고 새롭게 알게됐다.
책의 주인공은 고양이 펠리세트〰️
그리고 원숭이, 침팬치, 토끼, 곰쥐,기니피그도 있다.
가장 먼저 우주로 간 건 노랑초파리였다.
➰
라이카만 알고 있었는데 이 그림책을 보고 새롭게 알게됐다.
책의 주인공은 고양이 펠리세트〰️
그리고 원숭이, 침팬치, 토끼, 곰쥐,기니피그도 있다.
가장 먼저 우주로 간 건 노랑초파리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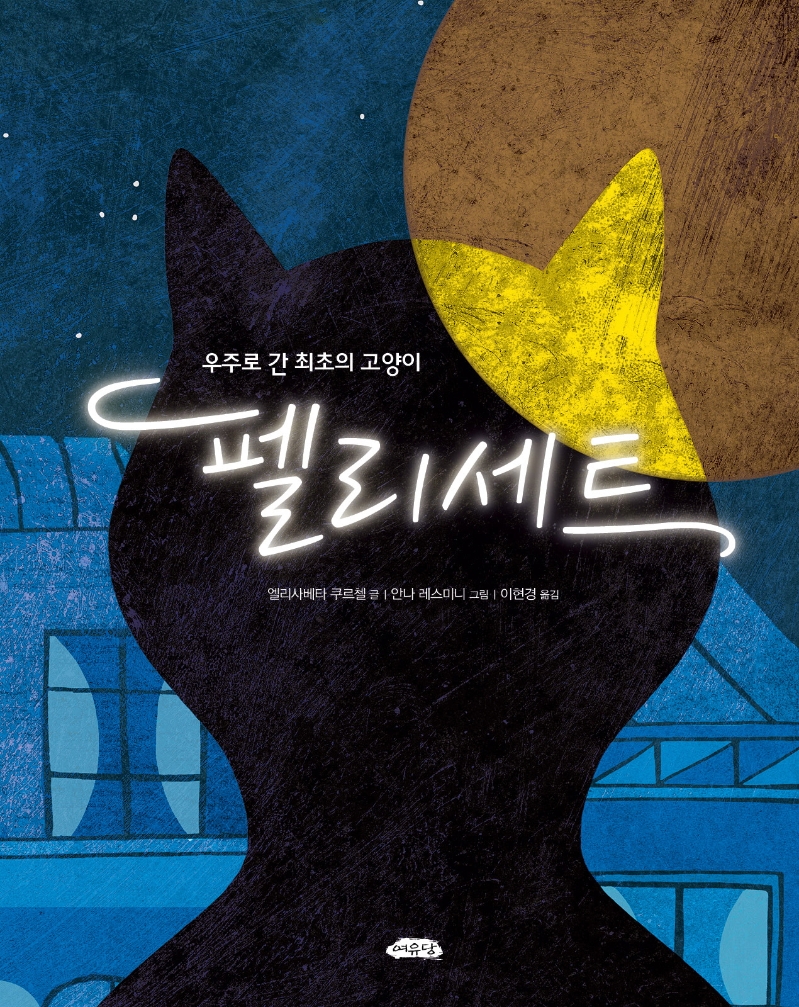
우주로 간 최초의 고양이 펠리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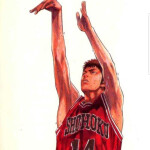
2명이 좋아해요
4일 전
 2
2
 0
0

Soonjin
@kwonsoonjin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꼬맹이랑 두번째 보면서 더욱 감동받은 책
➰
꼬맹이랑 두번째 보면서 더욱 감동받은 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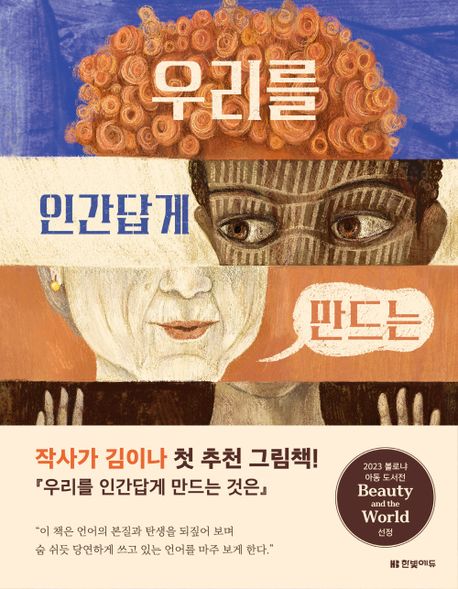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4일 전
 0
0
 0
0

Soonjin
@kwonsoonjin
나무 숲 자연으로 부터 받는 위로와 에너지
그리고 이름마저 예쁜 가문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
숲을 끊을 수 없는 이유
인간은 언제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니까.
그리고 이름마저 예쁜 가문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
숲을 끊을 수 없는 이유
인간은 언제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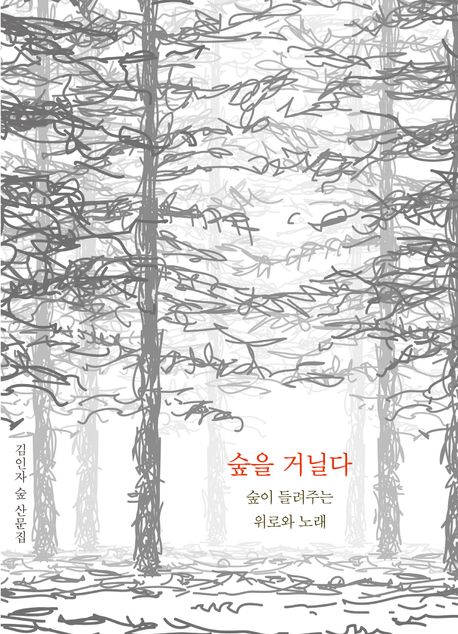
숲을 거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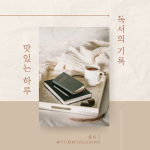
1명이 좋아해요
1주 전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연스기
현재를 직시하며 하루 지금 이순간을 살아가기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