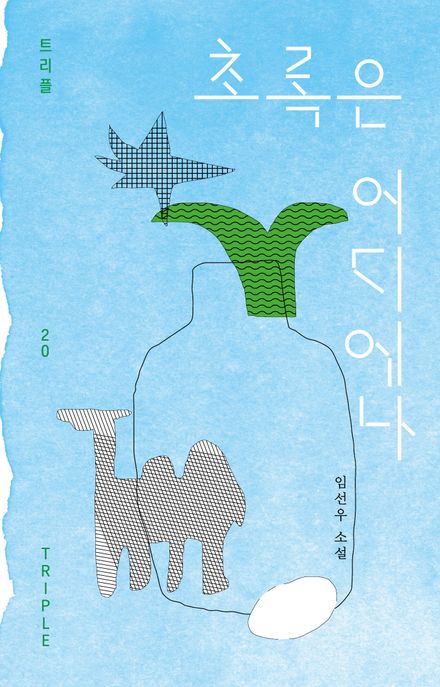김보경
@wandukongu
+ 팔로우


천천히 읽어도 된다고 했지만, 잘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읽히길 기다리는 그 초조한 마음을.
<초록 고래>와는 다른 장르의,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나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고, <초록 고래>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 힘 풀어, 도연 씨. 힘 풀어.
한 모금만 할까, 딱 한 모금만? 끈질긴 통증과 그보다 더 끈질기게 이어지는 갈등.
그러나 유미 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 탓에 부엌으로 갈 수가 없었다. 정작 유미 씨는 자신이 나를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런 유미 씨의 얼굴을 마주하자 온갖 감정이 뒤섞였다. 수치심과 분노, 좌절감과 그에 동반되는 이상하게기대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이해가 안 되죠? 단 몇 시간도 참지 못하는 게. 내가 물었다. 그러자 유미 씨는 특유의 커다랗고 맑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그럴리 가요. 저는 지금 낙타인데요.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의 마음이 그토록 무수히 찢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낱낱이 다른 천 개의 슬픔과 만 개의 슬픔이 생겨났다는 뜻이라고.
//
영하 없이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니. 돌을 토하는 것이 병이라면, 나는 영원히 낫고 싶지 않았다.
그때 양하는 아주 작고 약해져 있었다. 영하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나와 함께일 수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매번 자신이 없었다.
그럼 장국영 돌봐주는 대신에 돌을 조금만 더 줄 수 있어? 희조는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재우는 용도로만 쓰겠다고 덧붙였다. 나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대답했다. 다음번에 내 머리도 잘라주라. 그래. 이번 달 월세도 좀 내주라. 적당히 해.
나는 오랜만에 보는 영하의 얼굴, 그물무늬비단밤에게 수십 번 잡아먹히고 나서도 멀쩡한 그 얼굴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봉투를 열어보자 현금 백이십만 원이 들어 있었다. 작년 겨울에 영하가 들고 갔던 생활비 통장에 남아 있던 금액이었다. 그 돈을 보자 웃음이 났다. 웃음이 나다가, 온 몸이 추워졌다.
처치 곤란한 동물을 산호에게 넘겨준 것만 같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머리가 완성되었을 때 산호는 말했다. 친구가 비단뱀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내가 말했다. 원래 나쁜 일은 좋게 끝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쁘게 끝나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영하 언니의 얼굴에는 졸음이 가득했다. 많이 피곤해요? 시차 적응이 안 됐나 봐. 언니는 무슨 일본에서 시차를 얘기해요... ... .
그 점은 내가 영하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이자 영하 언니를 미워하는 이유였다.
<초록 고래>와는 다른 장르의,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나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고, <초록 고래>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 힘 풀어, 도연 씨. 힘 풀어.
한 모금만 할까, 딱 한 모금만? 끈질긴 통증과 그보다 더 끈질기게 이어지는 갈등.
그러나 유미 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 탓에 부엌으로 갈 수가 없었다. 정작 유미 씨는 자신이 나를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런 유미 씨의 얼굴을 마주하자 온갖 감정이 뒤섞였다. 수치심과 분노, 좌절감과 그에 동반되는 이상하게기대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이해가 안 되죠? 단 몇 시간도 참지 못하는 게. 내가 물었다. 그러자 유미 씨는 특유의 커다랗고 맑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그럴리 가요. 저는 지금 낙타인데요.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의 마음이 그토록 무수히 찢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낱낱이 다른 천 개의 슬픔과 만 개의 슬픔이 생겨났다는 뜻이라고.
//
영하 없이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니. 돌을 토하는 것이 병이라면, 나는 영원히 낫고 싶지 않았다.
그때 양하는 아주 작고 약해져 있었다. 영하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나와 함께일 수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매번 자신이 없었다.
그럼 장국영 돌봐주는 대신에 돌을 조금만 더 줄 수 있어? 희조는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재우는 용도로만 쓰겠다고 덧붙였다. 나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대답했다. 다음번에 내 머리도 잘라주라. 그래. 이번 달 월세도 좀 내주라. 적당히 해.
나는 오랜만에 보는 영하의 얼굴, 그물무늬비단밤에게 수십 번 잡아먹히고 나서도 멀쩡한 그 얼굴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봉투를 열어보자 현금 백이십만 원이 들어 있었다. 작년 겨울에 영하가 들고 갔던 생활비 통장에 남아 있던 금액이었다. 그 돈을 보자 웃음이 났다. 웃음이 나다가, 온 몸이 추워졌다.
처치 곤란한 동물을 산호에게 넘겨준 것만 같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머리가 완성되었을 때 산호는 말했다. 친구가 비단뱀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내가 말했다. 원래 나쁜 일은 좋게 끝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쁘게 끝나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영하 언니의 얼굴에는 졸음이 가득했다. 많이 피곤해요? 시차 적응이 안 됐나 봐. 언니는 무슨 일본에서 시차를 얘기해요... ... .
그 점은 내가 영하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이자 영하 언니를 미워하는 이유였다.

1명이 좋아해요
6개월 전
 1
1
 0
0
김보경님의 다른 게시물

김보경
@wandukongu
정신아픔이일 때는 읽는 것을 추천하지 않음.
그때 니는 부영이 정원을 지켜주는 방식이 에전과 달라진 것 같디는 생각을 했다. 그게 부영이 변해서인지 정원이 변해서인지 아니면 부영과 정원의 거리가 달라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부영은 자신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먼 곳을 항해 치달려가는 정원을 보며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훠싸였는지도 모르겠다.
-
어디로 들어와, 물으면 어디로든 들어와. 대답하는 사슴벌레의 말 속에는,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어디로든 들어왔다, 어쩔래? 하는 식의 무서운 강요와 칼같은 차단이 숨어 있었다. 어떤 필연이든. 아무리 가슴 아픈 필연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직면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잔인한 간명이 '든'이라는 한 글자 속에 쐐기처럼 박혀 있었다.
-
멋있어. 반희가 감탄한 얼굴로 말했다.
풍경이 괜찮지?
아니. 채운씨가 멋있다고.
내가 멋있다고?
채운은 웃음이 났다.
참, 별게 다. 지금 우리가 가는 데는 예전에 내가 촬영지 헌팅 다니다알게 된 집인데 말이 펜션이지 진짜 절간이 따로 없어.
멋있어.
또뭐가?
채운이 실실 웃었다.
이런 데도 다 알고 정말 멋있어. 채운씨
아, 그만해! 웃겨서 운전을 못하겠어.
-
엄마. 밤새 무슨 일 있었어? 말투도 막 바뀐 거 같아.
뭔 소리야? 반희가 채운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 이거 너한테 배운건데.
와. 채운이 과장되게 손백을 쳤다. 내가 그렇게 덧있게 말한다
고?
-
내가 동생에게 경탄하는 동시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이
이것이다.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금세 풀고 마는가.
그때 니는 부영이 정원을 지켜주는 방식이 에전과 달라진 것 같디는 생각을 했다. 그게 부영이 변해서인지 정원이 변해서인지 아니면 부영과 정원의 거리가 달라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부영은 자신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먼 곳을 항해 치달려가는 정원을 보며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훠싸였는지도 모르겠다.
-
어디로 들어와, 물으면 어디로든 들어와. 대답하는 사슴벌레의 말 속에는,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어디로든 들어왔다, 어쩔래? 하는 식의 무서운 강요와 칼같은 차단이 숨어 있었다. 어떤 필연이든. 아무리 가슴 아픈 필연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직면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잔인한 간명이 '든'이라는 한 글자 속에 쐐기처럼 박혀 있었다.
-
멋있어. 반희가 감탄한 얼굴로 말했다.
풍경이 괜찮지?
아니. 채운씨가 멋있다고.
내가 멋있다고?
채운은 웃음이 났다.
참, 별게 다. 지금 우리가 가는 데는 예전에 내가 촬영지 헌팅 다니다알게 된 집인데 말이 펜션이지 진짜 절간이 따로 없어.
멋있어.
또뭐가?
채운이 실실 웃었다.
이런 데도 다 알고 정말 멋있어. 채운씨
아, 그만해! 웃겨서 운전을 못하겠어.
-
엄마. 밤새 무슨 일 있었어? 말투도 막 바뀐 거 같아.
뭔 소리야? 반희가 채운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 이거 너한테 배운건데.
와. 채운이 과장되게 손백을 쳤다. 내가 그렇게 덧있게 말한다
고?
-
내가 동생에게 경탄하는 동시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이
이것이다.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금세 풀고 마는가.

각각의 계절

1명이 좋아해요
2주 전
 1
1
 0
0

김보경
@wandukon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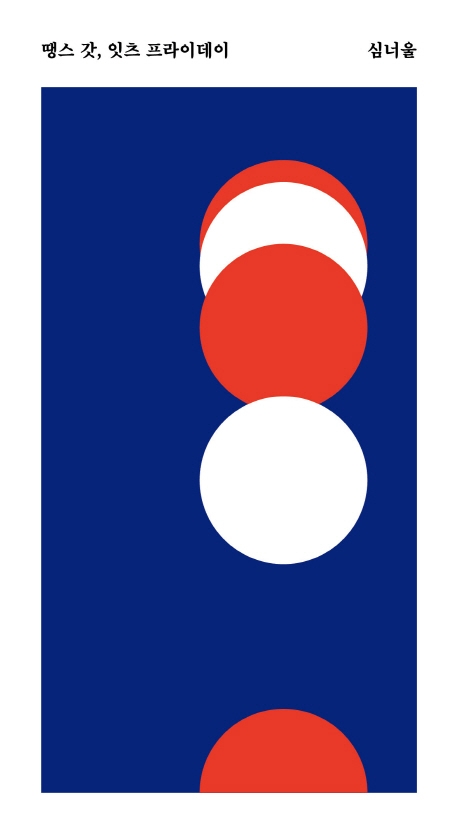
땡스 갓, 잇츠 프라이데이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주 전
 0
0
 0
0

김보경
@wandukongu
창밖에서 귀로 공부를 쫓아갈 때 몰래 책을 베꺼줬던 것은 다섯째였다. 너와 나는 기의 같지, 하고 속삭이면서.... 다섯 째에게 빚이 있었다. 다섯째로 살면 다섯째를 살린 것 같을까? (중략) 먹보랏빛 허공을 바라보고 있자니, 죽은 자들이 가까이 있
는 것처럼 느껴졌다. 죽은 자은이 서늘한 손으로 살아 있는 자은의 손등을 두드려주는 것만 같았다. 원래 말이 많은 형제는 아니었다. 우리가 정말로 거의 같았어? 한쪽은 차분했고 한쪽
은 나무칼을 쥔 채 외쳤는데 우리가 거의 같을 리가 있었어? 죽은 형제는 대답이 없었다.
-
젊고 총기 님치는 독살자의 얼굴은, 탄로가 나고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그악스러운 본색을 드러낼 줄 알았건만 그대로였다.
-
칼을 휘두르고 거짓 갑옷으로 그것을 맞은 두 사람이 단출하게 남았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은 보답받을 것인가? 결국 한 사람만 남겨질 것인가? 어느 쪽이 되든 옥화가 행복했으면 했다. 의지가 있고, 성질머리가 있고, 미련한
구석도 있는 다시 만날 일 없을 그 여자가.
-
"아아아아."
인곤은 베개처럼 완벽한 돌에 머리를 없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라도 있을 수 있겠어."
그 말에 자은이 웃었다.
"해골이 되어서도 편안할 거야.
"자고 많은 물에 조금씩 조금석 씻겨 사라지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개의치 않으며, 눈감고 세
월을 흘려보낸다? 그보다 더 감미로운 일은 없겠군.
-
"다 저지르고 말해줬어요. 엉엉 울더니만 어쨌든 베를 열심
히 짰죠."
마음이 약한지 강한지 알 수 없는 여자였다. 친우를 위해 육백 년 전통의 겨루기를 방해할 만큼 강하면서도 천을 망칠 만큼 못돼먹진 않았다. 울면서 죄를 고백하면서도 친우는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다. 어느 한쪽이라면 마음이 나았을까. 착잡해진 세 사람은 바로 소판 댁으로 향했다.
는 것처럼 느껴졌다. 죽은 자은이 서늘한 손으로 살아 있는 자은의 손등을 두드려주는 것만 같았다. 원래 말이 많은 형제는 아니었다. 우리가 정말로 거의 같았어? 한쪽은 차분했고 한쪽
은 나무칼을 쥔 채 외쳤는데 우리가 거의 같을 리가 있었어? 죽은 형제는 대답이 없었다.
-
젊고 총기 님치는 독살자의 얼굴은, 탄로가 나고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그악스러운 본색을 드러낼 줄 알았건만 그대로였다.
-
칼을 휘두르고 거짓 갑옷으로 그것을 맞은 두 사람이 단출하게 남았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은 보답받을 것인가? 결국 한 사람만 남겨질 것인가? 어느 쪽이 되든 옥화가 행복했으면 했다. 의지가 있고, 성질머리가 있고, 미련한
구석도 있는 다시 만날 일 없을 그 여자가.
-
"아아아아."
인곤은 베개처럼 완벽한 돌에 머리를 없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라도 있을 수 있겠어."
그 말에 자은이 웃었다.
"해골이 되어서도 편안할 거야.
"자고 많은 물에 조금씩 조금석 씻겨 사라지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개의치 않으며, 눈감고 세
월을 흘려보낸다? 그보다 더 감미로운 일은 없겠군.
-
"다 저지르고 말해줬어요. 엉엉 울더니만 어쨌든 베를 열심
히 짰죠."
마음이 약한지 강한지 알 수 없는 여자였다. 친우를 위해 육백 년 전통의 겨루기를 방해할 만큼 강하면서도 천을 망칠 만큼 못돼먹진 않았다. 울면서 죄를 고백하면서도 친우는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다. 어느 한쪽이라면 마음이 나았을까. 착잡해진 세 사람은 바로 소판 댁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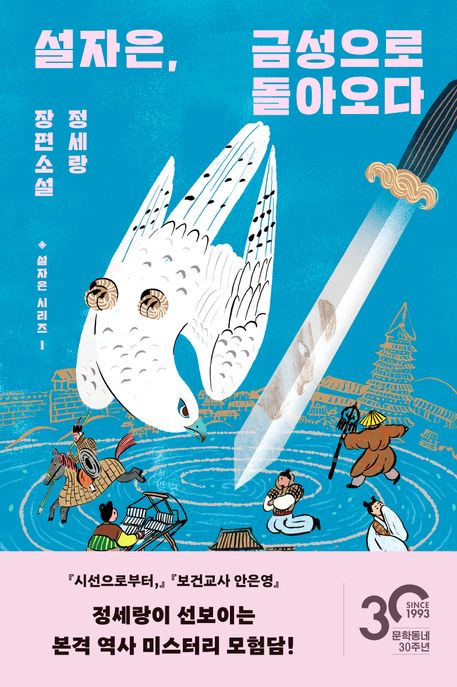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1명이 좋아해요
3주 전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