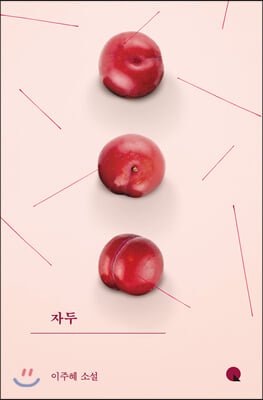차님
@chanim
+ 팔로우


소설은 번역을 하는 은아의 시점에서 시작된다. 아직은 봄이 완연하지 않아 쌀쌀한 3월. 그녀는 긴 역자 후기를 남긴다. 그 이야기가 지극히 현실적이라 소설이라는 걸 망각하게 된다.
아픈 시아버지를 돌보는 은아와 세진. 두 사람은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일상을 잃고 점점 지쳐간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치울 새도 없이 걸음마다 발을 베었(38쪽)’다는 말에서 공포와 무기력을 느꼈다.
평생 모르고 넘어갔다면 좋았을, 아니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일지도 모를 말들의 날카로움에 함께 베이는 기분으로 책을 읽었다. 그녀가 영옥씨와 그랬듯 우리 사이에 오간 말은 없다. 모든 것을 들어버린 입장에서 나는 가만히 눈을 감을 뿐.
아픈 시아버지를 돌보는 은아와 세진. 두 사람은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일상을 잃고 점점 지쳐간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치울 새도 없이 걸음마다 발을 베었(38쪽)’다는 말에서 공포와 무기력을 느꼈다.
평생 모르고 넘어갔다면 좋았을, 아니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일지도 모를 말들의 날카로움에 함께 베이는 기분으로 책을 읽었다. 그녀가 영옥씨와 그랬듯 우리 사이에 오간 말은 없다. 모든 것을 들어버린 입장에서 나는 가만히 눈을 감을 뿐.



외 3명이 좋아해요
2023년 2월 23일
 6
6
 0
0
차님님의 다른 게시물

차님
@chanim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
내가 살리고 싶은 단 한 사람
‘나’라는 존재도 단 한 사람
다른 시점으로 또 읽고 싶다.
내가 살리고 싶은 단 한 사람
‘나’라는 존재도 단 한 사람
다른 시점으로 또 읽고 싶다.

단 한 사람

1명이 좋아해요
19시간 전
 1
1
 0
0

차님
@chanim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누군가는 제일 싫어할 수 있다. 내가 아끼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가치 없을 수도 있다. 좋고 싫음과 맞고 틀림. 취향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나와는 이런 점이 다르구나.
요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
#그림책읽기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나와는 이런 점이 다르구나.
요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
#그림책읽기

경계선


2명이 좋아해요
4일 전
 2
2
 0
0

차님
@chanim
엄마가 아이에게 전하는 다정한 메시지.
“넌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왔어.”
🎵악뮤 이수현의 에일리언과 함께 들어보세요.
#그림책읽기
“넌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왔어.”
🎵악뮤 이수현의 에일리언과 함께 들어보세요.
#그림책읽기

에일리언

1명이 좋아해요
4일 전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