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의 책장
@yoonchaekjang
+ 팔로우


녹나무의 파순꾼책을 집어들면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처럼 그런류의 소설이지 하고 짐작했다. 하지만 비슷한듯 다른듯했다. 부모도 없고 백도없고 그런 주인공은 절도죄로 감옥을 갈처지였다. 하지만 돈많은 이모를 만나면서 감옥안보내는 조건으로 녹나무를 지키는 파순꾼을 수락하면 된다는 조건이었다. 녹나무 파수꾼으로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일이 벌어진다. 녹나무에 염원을 담아서 생각을 전달하면 그담에 자신의 가족중 한사람이 그 염원을 듣고 그뚯을 이어기는것이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없는 그 신비스러운 것. 녹나무 스토르는 안읽어본사람들 앞에서 표현허기는 정말 힘둘다.



3명이 좋아해요
2023년 1월 25일
 3
3
 0
0
40대의 책장님의 다른 게시물

40대의 책장
@yoonchaekjang
@rumgoo 책들의 부엌이나 수상한 편의점1,2 그리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읽으신후에 감동이 있을실겁니다. 즉각 추천합니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개월 전
 0
0
 0
0

40대의 책장
@yoonchaekjang
64편에 동물들이 나와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러스트와 글씨를 읽게됨 멍때리기 좋음. 기분또한 전환됨.

귀여운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줄 거야


2명이 좋아해요
4개월 전
 2
2
 0
0

40대의 책장
@yoonchaekjang
전편에서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절도범이 된 레이토가 월향신사 관리인이자 녹나무 파수꾼으로 일하며 녹나무의 신비한 기념 의식에 관해 알게 되고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다뤘다면, 《녹나무의 여신》은 레이토가 여러 사건에 휘말려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이번 《녹나무의 여신》은 세계관이 더욱 확장되면서 별개로 보이던 에피소드들이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서로 맞아 들어가며, 단 한 장도 놓치기 힘들 만큼 숨 가쁘게 읽게 될 작품이다. 또한 전편에서 채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정돈된 일상을 지내며 어른스러워진 레이토가 기지를 발휘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약자를 돕기도 하지만, 여전히 잔꾀를 부리는 탓에 파수꾼의 도리를 두고 치후네와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전편을 읽었다면 곳곳에 놓인 익숙하고도 반가운 장면을 찾아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우연이 수차례 얽히고설킨 어둠 속
녹나무의 신비가 깃드는 순간
지금 단 하나뿐인 염원이 전해진다
월향신사의 좁은 덤불숲을 따라 들어가면 길 끝에 거대하고 장엄한 녹나무 한 그루가 있다. 초하룻날과 보름날 밤마다 나무 기둥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밀초에 불을 켜면 한 사람의 염원을 주고받을 수 있다. 녹나무에 염원을 새기면 예념이고 받으면 수념이라고 하는데, 예념자와 수념자를 이어 주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다. 파수꾼에게는 규칙이 몇 가지 있다. 매일 월향신사를 청소하고 관리하며 기념의 내용을 함부로 물어보거나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것. 레이토는 치후네의 뒤를 이어 새로운 파수꾼이 돼 매일같이 경내를 청소하고 기념이 있는 밤마다 손님을 안내한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밤에 기념하던 손님이 쓰러져 레이토는 문단속도 하지 못한 채 종무소를 급히 비우게 되는데, 다음 날 돌아와 보니 무언가 이상하다. 빗물에 젖거나 쓰러져 있어야 할 밀초가 멀쩡히 다 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월향신사에 형사가 느닷없이 찾아오면서 한 집에 두 명의 절도범과 강도범이 연달아 침입한 사건에 휘말린다. 더구나 시집을 대신 팔아 달라는 여고생과 잠들면 기억을 잃는 소년까지 나타나며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다.
추리소설의 거장이 선사하는 특별한 감동
이렇듯이 여러 사건 사고는 후에 녹나무와 레이토를 분기점으로 삼아 영향을 주고받으며 신비롭게 소용돌이치는 하나의 드라마로 완성된다. 벌어진 인과의 틈새를 매끄럽게 메워 가며 예상보다 훨씬 큰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방식은 삶의 눈부신 순간을 은유하기도 한다.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만남과 별것 아닌 호의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용기를 얻을 때처럼 말이다. 또한 신비한 녹나무 이야기는 여러 에피소드가 중첩되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결말까지 힘 있게 나아간다. 눈앞에 영상이 펼쳐지듯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과 명쾌하고 스피디한 문장은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는 뜻밖의 반전과 감동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녹나무의 여신》은 추리와 판타지는 물론이고 따뜻한 감동까지 녹아들어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소설이다.
기적은 함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신비롭게 물들일 착한 이야기
선하다고 해서 모두 지루하고 뻔하지만은 않다. 선을 악보다 재미있게 묘사하기란 어렵지만, 레이토가 녹나무를 이용해 복잡하게 뒤얽힌 사건을 풀어 나가는 모습은 꽤 흥미롭게 관전해 볼 만하다. “그런 건 아무 상관 없어. 중요한 건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지. 동전 던지기 따위에 기대지 말고.”(69쪽)라고 이와모토 변호사가 조언하듯이, 레이토는 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 눈앞의 사람을 선뜻 돕기를 선택한다. 과연 그 일이 합리적인지 따지는 건 행동의 근거를 외부상황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동전 던지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레이토를 따라 몰입하다 보면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조금씩 부족하고 어긋나 있지만, 서로 모서리를 비스듬히 이어 맞추며 살아갈 때 그 순간이 얼마나 눈부시고 가슴 벅찬지 보여 준다. 인간은 본래 추악할 수밖에 없다고도 하지만, 누군가 우연히 건넨 호의도 한 사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인생 한번 살아 볼 만하지 않을까.
꽤 높은 교양을 갖추고 자존심도 무척 강한 치후네는 인지증을 앓는 탓에 때때로 조금씩 혹은 완전히 기억을 잊어버린다. 그럴 때마다 치후네는 내면 깊은 곳까지 통째로 흔들린 듯이 좌절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리 생각하면 차례차례 잊어 가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지도 모르겠군요.”(324쪽)라며 낯선 오늘에 적응하고 새롭게 배워 나가는 기쁨을 맛본다. 잠들면 기억이 사라지는 모토야도 매일 일기를 쓰고 읽는 행위를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며 천천히 어른이 된다. 책의 끝에 다다르면 기적의 새로운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레 스며든다. 기적은 어쩌면 신비한 녹나무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봄바람만큼 따뜻한 감동과 반전을 일으키며 언제든 곁에 두고 읽기 좋은 소설이다. 그러다 보면 이 착한 이야기가 우리를 신비롭게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우연이 수차례 얽히고설킨 어둠 속
녹나무의 신비가 깃드는 순간
지금 단 하나뿐인 염원이 전해진다
월향신사의 좁은 덤불숲을 따라 들어가면 길 끝에 거대하고 장엄한 녹나무 한 그루가 있다. 초하룻날과 보름날 밤마다 나무 기둥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밀초에 불을 켜면 한 사람의 염원을 주고받을 수 있다. 녹나무에 염원을 새기면 예념이고 받으면 수념이라고 하는데, 예념자와 수념자를 이어 주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다. 파수꾼에게는 규칙이 몇 가지 있다. 매일 월향신사를 청소하고 관리하며 기념의 내용을 함부로 물어보거나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것. 레이토는 치후네의 뒤를 이어 새로운 파수꾼이 돼 매일같이 경내를 청소하고 기념이 있는 밤마다 손님을 안내한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밤에 기념하던 손님이 쓰러져 레이토는 문단속도 하지 못한 채 종무소를 급히 비우게 되는데, 다음 날 돌아와 보니 무언가 이상하다. 빗물에 젖거나 쓰러져 있어야 할 밀초가 멀쩡히 다 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월향신사에 형사가 느닷없이 찾아오면서 한 집에 두 명의 절도범과 강도범이 연달아 침입한 사건에 휘말린다. 더구나 시집을 대신 팔아 달라는 여고생과 잠들면 기억을 잃는 소년까지 나타나며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다.
추리소설의 거장이 선사하는 특별한 감동
이렇듯이 여러 사건 사고는 후에 녹나무와 레이토를 분기점으로 삼아 영향을 주고받으며 신비롭게 소용돌이치는 하나의 드라마로 완성된다. 벌어진 인과의 틈새를 매끄럽게 메워 가며 예상보다 훨씬 큰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방식은 삶의 눈부신 순간을 은유하기도 한다.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만남과 별것 아닌 호의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용기를 얻을 때처럼 말이다. 또한 신비한 녹나무 이야기는 여러 에피소드가 중첩되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결말까지 힘 있게 나아간다. 눈앞에 영상이 펼쳐지듯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과 명쾌하고 스피디한 문장은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는 뜻밖의 반전과 감동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녹나무의 여신》은 추리와 판타지는 물론이고 따뜻한 감동까지 녹아들어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소설이다.
기적은 함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신비롭게 물들일 착한 이야기
선하다고 해서 모두 지루하고 뻔하지만은 않다. 선을 악보다 재미있게 묘사하기란 어렵지만, 레이토가 녹나무를 이용해 복잡하게 뒤얽힌 사건을 풀어 나가는 모습은 꽤 흥미롭게 관전해 볼 만하다. “그런 건 아무 상관 없어. 중요한 건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지. 동전 던지기 따위에 기대지 말고.”(69쪽)라고 이와모토 변호사가 조언하듯이, 레이토는 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 눈앞의 사람을 선뜻 돕기를 선택한다. 과연 그 일이 합리적인지 따지는 건 행동의 근거를 외부상황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동전 던지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레이토를 따라 몰입하다 보면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조금씩 부족하고 어긋나 있지만, 서로 모서리를 비스듬히 이어 맞추며 살아갈 때 그 순간이 얼마나 눈부시고 가슴 벅찬지 보여 준다. 인간은 본래 추악할 수밖에 없다고도 하지만, 누군가 우연히 건넨 호의도 한 사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인생 한번 살아 볼 만하지 않을까.
꽤 높은 교양을 갖추고 자존심도 무척 강한 치후네는 인지증을 앓는 탓에 때때로 조금씩 혹은 완전히 기억을 잊어버린다. 그럴 때마다 치후네는 내면 깊은 곳까지 통째로 흔들린 듯이 좌절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리 생각하면 차례차례 잊어 가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지도 모르겠군요.”(324쪽)라며 낯선 오늘에 적응하고 새롭게 배워 나가는 기쁨을 맛본다. 잠들면 기억이 사라지는 모토야도 매일 일기를 쓰고 읽는 행위를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며 천천히 어른이 된다. 책의 끝에 다다르면 기적의 새로운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레 스며든다. 기적은 어쩌면 신비한 녹나무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봄바람만큼 따뜻한 감동과 반전을 일으키며 언제든 곁에 두고 읽기 좋은 소설이다. 그러다 보면 이 착한 이야기가 우리를 신비롭게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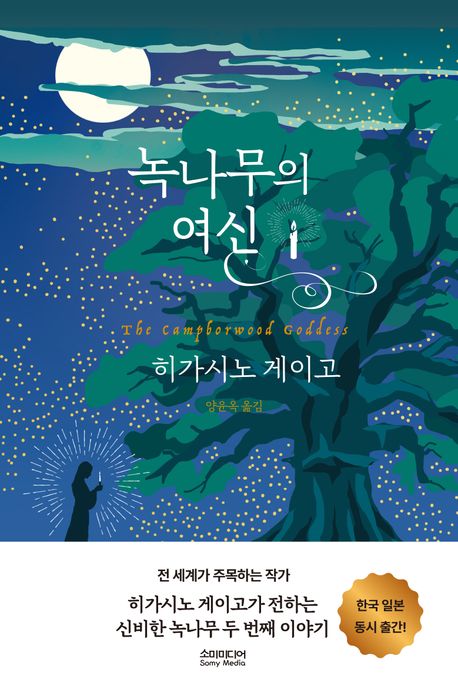
녹나무의 여신


2명이 좋아해요
4개월 전
 2
2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