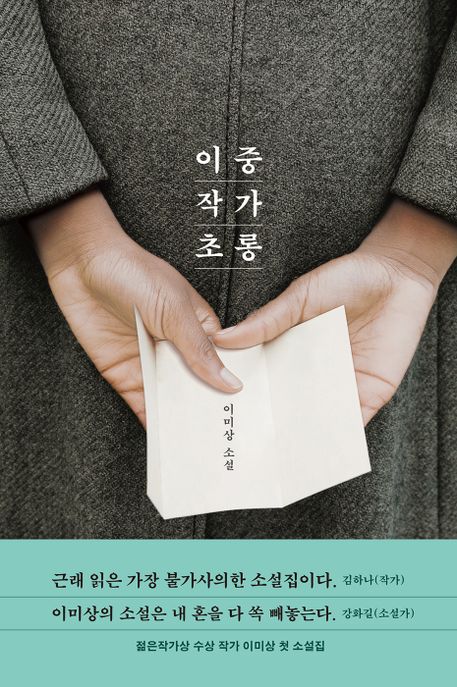샤대프린스
@apoetofmyheart
+ 팔로우


읽는 사람을 ‘잘’ 불편하게 만드는 이미상. 불편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을 한다. 하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한다. 둘, 그냥 가만히 있는다. 셋, 그것과 맞선다. 당신은 불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이미상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하며, 맞설 수 있는 장을 우리에게 펼쳐 보인다. 그의 단편들을 읽으며 놀랐던 것은 내가 생각보다 불편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곱게 커서 불편을 모른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고. 작금의 시대에는 불편이 비가시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불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더 이상 무엇을 언급할 수 없다.
그러니 불편을 가시화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열린 세상에서 닫혀 살“지 ”닫힌 세상에서 열려 살”지 “둘 중 하날 고르라며 종주먹을 들이“댈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열린 세상에서 열려 살자”고. “아무리 무서워도, 용감하게“! (「여자가 지하철 할 때」, 145쪽) 싸우듯이 쓰는 사람도 있다. “그녀는 자신의 소설을 종이 뭉치라 불렀고, 예술을 일상으로 끌어내리려 했고, 종국에는 ‘내리다'라는 표현도 지우려 했지만, 그 안에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게 있다는 걸 모르지 못했고 그럼에도 그것이 자신의 투쟁임을, 비밀스러운 투쟁임을 알았다.” (「티나지 않는 밤」, 169-170쪽)
이미상의 화자들은 말하기를, 쓰기를, 나타내기를,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용감한 투쟁(들)을 응원하고 싶다. 이 여덟 편의 소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눠야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정말이지 이미상은 한국문학의 미래다.
그러니 불편을 가시화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열린 세상에서 닫혀 살“지 ”닫힌 세상에서 열려 살”지 “둘 중 하날 고르라며 종주먹을 들이“댈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열린 세상에서 열려 살자”고. “아무리 무서워도, 용감하게“! (「여자가 지하철 할 때」, 145쪽) 싸우듯이 쓰는 사람도 있다. “그녀는 자신의 소설을 종이 뭉치라 불렀고, 예술을 일상으로 끌어내리려 했고, 종국에는 ‘내리다'라는 표현도 지우려 했지만, 그 안에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게 있다는 걸 모르지 못했고 그럼에도 그것이 자신의 투쟁임을, 비밀스러운 투쟁임을 알았다.” (「티나지 않는 밤」, 169-170쪽)
이미상의 화자들은 말하기를, 쓰기를, 나타내기를,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용감한 투쟁(들)을 응원하고 싶다. 이 여덟 편의 소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눠야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정말이지 이미상은 한국문학의 미래다.


2명이 좋아해요
2023년 1월 11일
 2
2
 0
0
샤대프린스님의 다른 게시물

샤대프린스
@apoetofmyheart
일몰 보러 다대포 가는 1호선 안에서 박솔뫼의 「여름의 끝으로」를 읽다가 이런 부분이,
“차미를 안고 등에 코를 묻으면 땅콩 냄새 같은 고소한 냄새가 났다. 일정한 소리로 코를 골며 자는 차미의 등에 코를 대고 고소한 냄새를 맡았다. 잠이 올 것 같은 냄새였다.” (33쪽)
어젠 요가원에 좀 빨리 갔고, 한참 동안 나와 선생님 그리고 고양이 샨티밖에 없었는데, 샨티는 내 요가 매트 위에 올라와, 내게 등을 돌린 채로 앉아 있고, 바즈라아사나로 요가를 준비하려던 나는, 금세 샨티의 집사가 되어, 샨티의 등을 주물주물, 코를 대고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어느덧 서늘해진 바람과 따듯한 샨티의 등을 동시에 만졌다. 여름의 끝이구나.
“차미를 안고 등에 코를 묻으면 땅콩 냄새 같은 고소한 냄새가 났다. 일정한 소리로 코를 골며 자는 차미의 등에 코를 대고 고소한 냄새를 맡았다. 잠이 올 것 같은 냄새였다.” (33쪽)
어젠 요가원에 좀 빨리 갔고, 한참 동안 나와 선생님 그리고 고양이 샨티밖에 없었는데, 샨티는 내 요가 매트 위에 올라와, 내게 등을 돌린 채로 앉아 있고, 바즈라아사나로 요가를 준비하려던 나는, 금세 샨티의 집사가 되어, 샨티의 등을 주물주물, 코를 대고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어느덧 서늘해진 바람과 따듯한 샨티의 등을 동시에 만졌다. 여름의 끝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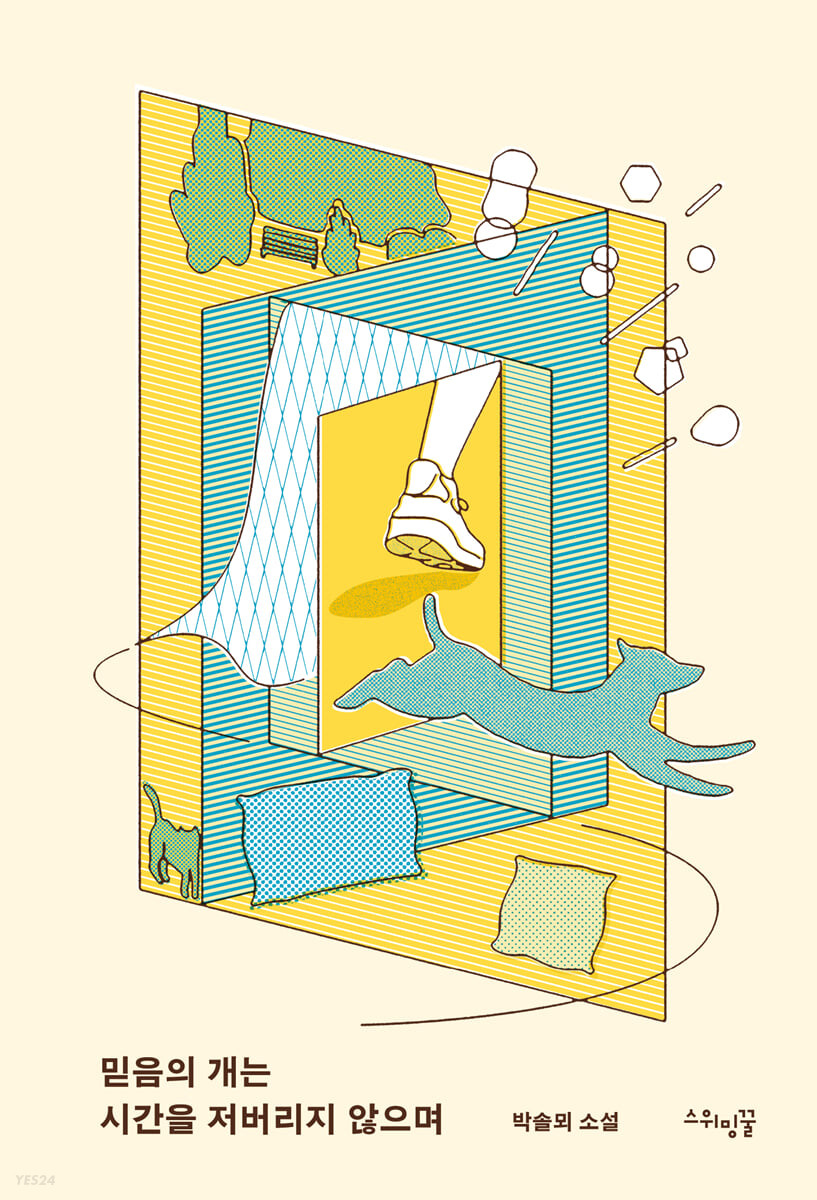
믿음의 개는 시간을 저버리지 않으며

1명이 좋아해요
2023년 10월 10일
 1
1
 0
0

샤대프린스
@apoetofmyheart
내일 부산 가는데 『미래 산책 연습』 진짜 안 챙기려 했거든? 방금 후루룩 훑었는데 도무지 안 들고 갈 수가 없네··· 이를테면 이런 장면,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비빔밥을 시킬걸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루가 지났고 남은 휴일은 무얼 하지 머릿속으로 일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때마침 테이블에 커다란 보리차 주전자가 탕 소리를 내며 놓였고 커다랗고 따뜻한 주전자를 보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졌고 보리차를 마시자 반찬이 나오고 상추가 나오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틈도 없이 테이블 위에 빠짐없이 차려진 밥을 먹기 시작했다." (47쪽)
나도 정말 제발 진실로 진정 이렇게 여행하고 싶다···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비빔밥을 시킬걸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루가 지났고 남은 휴일은 무얼 하지 머릿속으로 일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때마침 테이블에 커다란 보리차 주전자가 탕 소리를 내며 놓였고 커다랗고 따뜻한 주전자를 보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졌고 보리차를 마시자 반찬이 나오고 상추가 나오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틈도 없이 테이블 위에 빠짐없이 차려진 밥을 먹기 시작했다." (47쪽)
나도 정말 제발 진실로 진정 이렇게 여행하고 싶다···



3명이 좋아해요
2023년 10월 5일
 3
3
 0
0

샤대프린스
@apoetofmyheart
시인과 문학평론가가 주고받은 열두 편의 서신을 모아 놓은 책. ‘지금-여기’의 책들에 관해 나누는 이야기라 무척 재미있다. 두 분이 함께 읽은 책 중에는 내가 살펴보았거나 읽었던 책이 왕왕 있었고. 김대성, 김봉곤, 김지연, 김혜진, 서이제, 알렉세이 유르착, 유성원, 임솔아, 임현, 장류진, 조지 오웰, 한병철의 작품. 3분의 1 이상은 알고 있어서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그러나 내가 모르는 작품에 관해 나누는 서간을 읽을 때도 역시 즐거웠다. 온종일 한국문학 이야기 정말로 자신 있는 나로서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 가지고 양껏 수다 떠는 걸 지켜보는 게 못내 좋았다. 문학이 수다를 떨게 만드는 순간은 정말로 좋다!
*
“차이에 대한 기만적인 인정으로 무언가를 봉합해버리려는 편의적인 행태에 대해, 저 역시 선생님과 똑같이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서로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그 다름 속에서 한껏 부대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계기를 촉발하지 않는 타자는, 아무리 ' 차이'라는 명분으로 세련되게 포장하더라도 결국 동일성의 반복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선생님과의 대화 혹은 열띤 논쟁이 즐거웠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합의와 존중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7쪽)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작년에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시작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시나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서로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그 다름 속에서 한껏 부대”꼈을 때. 올해도 앞으로도 마음껏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
“차이에 대한 기만적인 인정으로 무언가를 봉합해버리려는 편의적인 행태에 대해, 저 역시 선생님과 똑같이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서로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그 다름 속에서 한껏 부대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계기를 촉발하지 않는 타자는, 아무리 ' 차이'라는 명분으로 세련되게 포장하더라도 결국 동일성의 반복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선생님과의 대화 혹은 열띤 논쟁이 즐거웠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합의와 존중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7쪽)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작년에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시작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시나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서로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그 다름 속에서 한껏 부대”꼈을 때. 올해도 앞으로도 마음껏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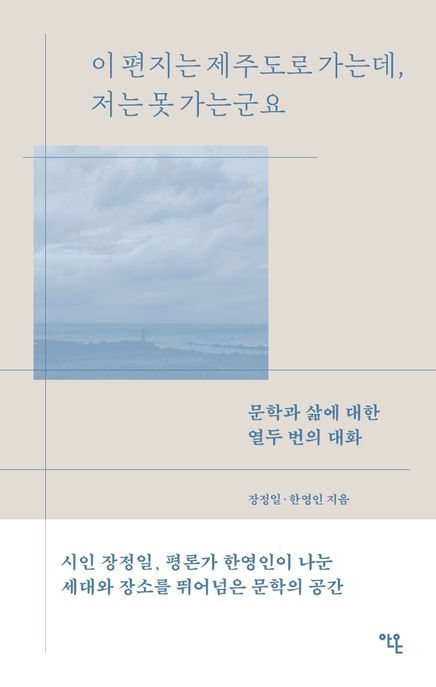
이 편지는 제주도로 가는데, 저는 못 가는군요

1명이 좋아해요
2023년 1월 12일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