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대프린스
@apoetofmyheart
+ 팔로우


장면 1. 올해 1월, 유독 눈이 많이 내리던 날, Y와 송도 카페꼼마에 갔다. 무슨 책이든 사고 싶었고, 그 전에 책을 읽기로 했지. 오래 고민하다가 이 책을 골라 들었다. 앞에 실린 두 편, 「두부」 「사라지는 것들」을 읽었다. 마침 거기에도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서, 내 마음에도 눈이 펑펑 내릴 수 있었고, 기어이 눈물짓는 나.
장면 2. 4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엄마랑 싸웠다. 항상 그랬듯 부푼 분노였고 책망이었고 금세 사라졌는데 왜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석 달 전 읽은 이야기가 떠올라서 「사라지는 것들」을 펼쳐 들었다. "세 마디만 섞어도 화내게 된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된다. 짜증 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감정이 실린다." (30쪽)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라는 것, 내 나이만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했으며 당신 나이만큼의 시간까지 함께 한다는 것. 그 사실은 두렵고 슬프고 그렇다. 물론 좋겠지만. 행복하겠지만.
장면 3. 「선릉 산책」부터 마저 읽었다. 그때 읽지 않은 이유가 있던 것이다. 촉박한 시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걸 이제 안다. "창문을 깨는 두 발의 쇠구슬처럼 내 마음의 안쪽을 강하게 타격"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궁금해했다가 "어째서인지 금세 마음이 안 좋아"(78쪽)진 적 있으니까. 당최 무슨 소리인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말하기가 너무나 귀찮을 뿐"(107쪽). 이 소설은 내게 너무도 적확하게 당도했다.
장면 4. 1월 말에 『유령』(현대문학, 2018)을 읽었다. 「두번째 삶」을 읽으면서 그 책을 떠올렸다. 악의 이야기, 악인의 이야기. 더 나아가, 악을 추동하는 또 다른 악(인)의 이야기. 그때 좋았던 해설의 문장, "우리에겐 악을 모를 권리가 없다"는 말. 그 문장은 다시금 이 소설과 결합한다. 마지막 반전이 흥미로웠던 작품.
장면 5. 『내가 말하고 있잖아』(민음사, 2020)를 빌린 적 있다. 펼쳐보지도 못한 채로 반납했지만. 「이코」를 읽으면서 그 책을 떠올렸다. 읽은 적 없는 책을 떠올리다니, 신기한 일이네 하면서. 어쩌면 작가가 천착하는 지점이 유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대상을 접해본 적 없기에, 생경하면서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다.
장면 6. 이 책의 마지막은 너무도 훌륭한 두 작품, 「미스터 심플」와 「스노우」가 든든히 지키고 있다. 이 소설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양볼에 가득 숨을 모아 금관으로 불어넣는 미스터 심플의 모습은 근사해 보였다. 쓸쓸해 보였고 슬퍼 보였다. 그걸 아름답다고 말해도 될까. 나는 슬프고 우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진력이 났다. 그것이 지겹고 다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런데 눈 내리는 깊은 밤. 창고처럼 좁은 낯선 방에서 H가 좋아했던 음악을 호른으로 듣는 이 순간이 좋았다. 슬퍼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미스터 심플」, 228쪽)
장면 7. "누군가 내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슬픔입니다." (「미스터 심플」, 211쪽) 지금 내 이름도 아주 그렇다.
장면 2. 4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엄마랑 싸웠다. 항상 그랬듯 부푼 분노였고 책망이었고 금세 사라졌는데 왜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석 달 전 읽은 이야기가 떠올라서 「사라지는 것들」을 펼쳐 들었다. "세 마디만 섞어도 화내게 된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된다. 짜증 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감정이 실린다." (30쪽)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라는 것, 내 나이만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했으며 당신 나이만큼의 시간까지 함께 한다는 것. 그 사실은 두렵고 슬프고 그렇다. 물론 좋겠지만. 행복하겠지만.
장면 3. 「선릉 산책」부터 마저 읽었다. 그때 읽지 않은 이유가 있던 것이다. 촉박한 시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걸 이제 안다. "창문을 깨는 두 발의 쇠구슬처럼 내 마음의 안쪽을 강하게 타격"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궁금해했다가 "어째서인지 금세 마음이 안 좋아"(78쪽)진 적 있으니까. 당최 무슨 소리인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말하기가 너무나 귀찮을 뿐"(107쪽). 이 소설은 내게 너무도 적확하게 당도했다.
장면 4. 1월 말에 『유령』(현대문학, 2018)을 읽었다. 「두번째 삶」을 읽으면서 그 책을 떠올렸다. 악의 이야기, 악인의 이야기. 더 나아가, 악을 추동하는 또 다른 악(인)의 이야기. 그때 좋았던 해설의 문장, "우리에겐 악을 모를 권리가 없다"는 말. 그 문장은 다시금 이 소설과 결합한다. 마지막 반전이 흥미로웠던 작품.
장면 5. 『내가 말하고 있잖아』(민음사, 2020)를 빌린 적 있다. 펼쳐보지도 못한 채로 반납했지만. 「이코」를 읽으면서 그 책을 떠올렸다. 읽은 적 없는 책을 떠올리다니, 신기한 일이네 하면서. 어쩌면 작가가 천착하는 지점이 유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대상을 접해본 적 없기에, 생경하면서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다.
장면 6. 이 책의 마지막은 너무도 훌륭한 두 작품, 「미스터 심플」와 「스노우」가 든든히 지키고 있다. 이 소설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양볼에 가득 숨을 모아 금관으로 불어넣는 미스터 심플의 모습은 근사해 보였다. 쓸쓸해 보였고 슬퍼 보였다. 그걸 아름답다고 말해도 될까. 나는 슬프고 우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진력이 났다. 그것이 지겹고 다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런데 눈 내리는 깊은 밤. 창고처럼 좁은 낯선 방에서 H가 좋아했던 음악을 호른으로 듣는 이 순간이 좋았다. 슬퍼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미스터 심플」, 228쪽)
장면 7. "누군가 내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슬픔입니다." (「미스터 심플」, 211쪽) 지금 내 이름도 아주 그렇다.



외 1명이 좋아해요
2022년 4월 26일
 4
4
 0
0
샤대프린스님의 다른 게시물

샤대프린스
@apoetofmyheart
일몰 보러 다대포 가는 1호선 안에서 박솔뫼의 「여름의 끝으로」를 읽다가 이런 부분이,
“차미를 안고 등에 코를 묻으면 땅콩 냄새 같은 고소한 냄새가 났다. 일정한 소리로 코를 골며 자는 차미의 등에 코를 대고 고소한 냄새를 맡았다. 잠이 올 것 같은 냄새였다.” (33쪽)
어젠 요가원에 좀 빨리 갔고, 한참 동안 나와 선생님 그리고 고양이 샨티밖에 없었는데, 샨티는 내 요가 매트 위에 올라와, 내게 등을 돌린 채로 앉아 있고, 바즈라아사나로 요가를 준비하려던 나는, 금세 샨티의 집사가 되어, 샨티의 등을 주물주물, 코를 대고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어느덧 서늘해진 바람과 따듯한 샨티의 등을 동시에 만졌다. 여름의 끝이구나.
“차미를 안고 등에 코를 묻으면 땅콩 냄새 같은 고소한 냄새가 났다. 일정한 소리로 코를 골며 자는 차미의 등에 코를 대고 고소한 냄새를 맡았다. 잠이 올 것 같은 냄새였다.” (33쪽)
어젠 요가원에 좀 빨리 갔고, 한참 동안 나와 선생님 그리고 고양이 샨티밖에 없었는데, 샨티는 내 요가 매트 위에 올라와, 내게 등을 돌린 채로 앉아 있고, 바즈라아사나로 요가를 준비하려던 나는, 금세 샨티의 집사가 되어, 샨티의 등을 주물주물, 코를 대고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어느덧 서늘해진 바람과 따듯한 샨티의 등을 동시에 만졌다. 여름의 끝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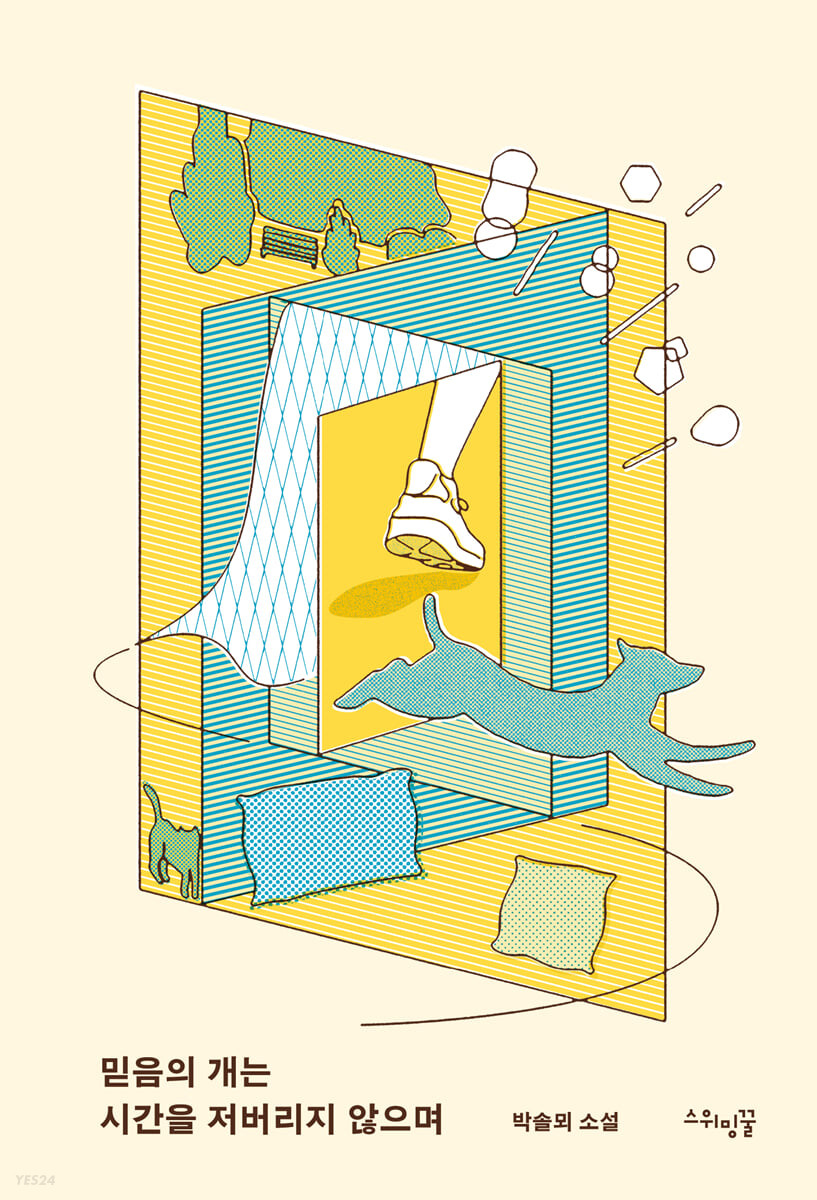
믿음의 개는 시간을 저버리지 않으며

1명이 좋아해요
2023년 10월 10일
 1
1
 0
0

샤대프린스
@apoetofmyheart
내일 부산 가는데 『미래 산책 연습』 진짜 안 챙기려 했거든? 방금 후루룩 훑었는데 도무지 안 들고 갈 수가 없네··· 이를테면 이런 장면,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비빔밥을 시킬걸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루가 지났고 남은 휴일은 무얼 하지 머릿속으로 일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때마침 테이블에 커다란 보리차 주전자가 탕 소리를 내며 놓였고 커다랗고 따뜻한 주전자를 보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졌고 보리차를 마시자 반찬이 나오고 상추가 나오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틈도 없이 테이블 위에 빠짐없이 차려진 밥을 먹기 시작했다." (47쪽)
나도 정말 제발 진실로 진정 이렇게 여행하고 싶다···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비빔밥을 시킬걸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루가 지났고 남은 휴일은 무얼 하지 머릿속으로 일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때마침 테이블에 커다란 보리차 주전자가 탕 소리를 내며 놓였고 커다랗고 따뜻한 주전자를 보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졌고 보리차를 마시자 반찬이 나오고 상추가 나오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틈도 없이 테이블 위에 빠짐없이 차려진 밥을 먹기 시작했다." (47쪽)
나도 정말 제발 진실로 진정 이렇게 여행하고 싶다···



3명이 좋아해요
2023년 10월 5일
 3
3
 0
0

샤대프린스
@apoetofmyheart
시인과 문학평론가가 주고받은 열두 편의 서신을 모아 놓은 책. ‘지금-여기’의 책들에 관해 나누는 이야기라 무척 재미있다. 두 분이 함께 읽은 책 중에는 내가 살펴보았거나 읽었던 책이 왕왕 있었고. 김대성, 김봉곤, 김지연, 김혜진, 서이제, 알렉세이 유르착, 유성원, 임솔아, 임현, 장류진, 조지 오웰, 한병철의 작품. 3분의 1 이상은 알고 있어서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그러나 내가 모르는 작품에 관해 나누는 서간을 읽을 때도 역시 즐거웠다. 온종일 한국문학 이야기 정말로 자신 있는 나로서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 가지고 양껏 수다 떠는 걸 지켜보는 게 못내 좋았다. 문학이 수다를 떨게 만드는 순간은 정말로 좋다!
*
“차이에 대한 기만적인 인정으로 무언가를 봉합해버리려는 편의적인 행태에 대해, 저 역시 선생님과 똑같이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서로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그 다름 속에서 한껏 부대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계기를 촉발하지 않는 타자는, 아무리 ' 차이'라는 명분으로 세련되게 포장하더라도 결국 동일성의 반복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선생님과의 대화 혹은 열띤 논쟁이 즐거웠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합의와 존중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7쪽)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작년에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시작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시나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서로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그 다름 속에서 한껏 부대”꼈을 때. 올해도 앞으로도 마음껏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
“차이에 대한 기만적인 인정으로 무언가를 봉합해버리려는 편의적인 행태에 대해, 저 역시 선생님과 똑같이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서로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그 다름 속에서 한껏 부대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계기를 촉발하지 않는 타자는, 아무리 ' 차이'라는 명분으로 세련되게 포장하더라도 결국 동일성의 반복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선생님과의 대화 혹은 열띤 논쟁이 즐거웠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합의와 존중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7쪽)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작년에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시작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시나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서로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그 다름 속에서 한껏 부대”꼈을 때. 올해도 앞으로도 마음껏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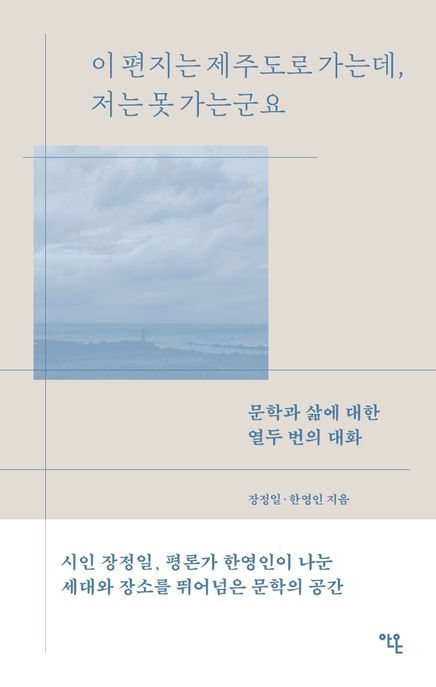
이 편지는 제주도로 가는데, 저는 못 가는군요

1명이 좋아해요
2023년 1월 12일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