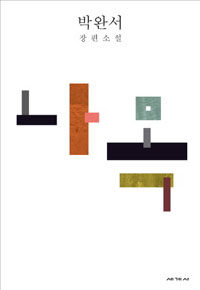새벽빛
@saebyeokbit
+ 팔로우


또 읽어버렸다.
아무래도 벌거벗은 나무의 이미지가 뇌리에 콕 박혀있나보다.
주인공 경아는 6.25때 20대 초반을 보낸, 아마도 나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 사이의 사람. 그러면서도 딱히 무슨 사상을 좇지도 않고 크게 부자이거나 가난하다고도 할 수 없는 우리 동네에서도 마주칠 법한 평범한 소시민이다. 그래서 더 우리 윗세대의 보통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우리 할머니들과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 모두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 이야기의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 경아를 비롯한 우리 모두 중에서 그럴듯한 사연 하나둘쯤 없는 사람이 있을까. 각자의 사연을 생각하고 나면 받아들이기 어렵던 사람도 이해하게 된다. 포용의 범위가 넓어진달까.
소설 속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박완서의 작품들은 더 그렇다. 그래서 좋다.
아무래도 벌거벗은 나무의 이미지가 뇌리에 콕 박혀있나보다.
주인공 경아는 6.25때 20대 초반을 보낸, 아마도 나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 사이의 사람. 그러면서도 딱히 무슨 사상을 좇지도 않고 크게 부자이거나 가난하다고도 할 수 없는 우리 동네에서도 마주칠 법한 평범한 소시민이다. 그래서 더 우리 윗세대의 보통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우리 할머니들과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 모두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 이야기의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 경아를 비롯한 우리 모두 중에서 그럴듯한 사연 하나둘쯤 없는 사람이 있을까. 각자의 사연을 생각하고 나면 받아들이기 어렵던 사람도 이해하게 된다. 포용의 범위가 넓어진달까.
소설 속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박완서의 작품들은 더 그렇다. 그래서 좋다.



3명이 좋아해요
2022년 2월 22일
 3
3
 0
0
새벽빛님의 다른 게시물

새벽빛
@saebyeokbit
"네가 너를 키워가면서 알아내야 해. 네가 어떤 꽃인지, 어떻게 피어날지, 얼마나 아름다울지. 세상의 예쁜 것들을 너에게 주렴. 물 같은 교양을, 바람 같은 사유를, 햇살 같은 마음을 자신에게 주면서 너답게 살아."라고 딸에게 얘기해줘야겠다.

까멜리아 싸롱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5시간 전
 0
0
 0
0

새벽빛
@saebyeokbit
이 소설에서는 죽은 자들이 까멜리아 싸롱을 거치며 과거를 돌아보고 타인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다.
📖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딜 가야 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알아가야 하죠.(48쪽)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공감할 수 있는 말일 것 같다.
갑자기 나쁜 상황에 닥친 사람에게도, 학교나 회사에서 새로운 나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들과 일하게 되는 사람에게도.
📖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딜 가야 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알아가야 하죠.(48쪽)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공감할 수 있는 말일 것 같다.
갑자기 나쁜 상황에 닥친 사람에게도, 학교나 회사에서 새로운 나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들과 일하게 되는 사람에게도.

까멜리아 싸롱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일 전
 0
0
 0
0

새벽빛
@saebyeokbit
'나'와 한나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에 초첨을 두고 읽었는데 끝끝내 한나가 죽은 뒤에야 그녀를 그리워하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결말이 너무나 슬펐다. 한나는 줄곧 그에게서 편지를 받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너무 늦지 않았을 때 답장을 써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소설을 나이 차가 많은 남녀의 연애소설로 읽어도 좋지만, 부모와 자식의 세대 갈등에 관한 소설이라고 읽어도 좋다. <1부>에서 한나가 미하엘을 씻겨 주고 같이 자는 모습이나, 둘이 갈등이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미하엘이 한나에게 사과하고 한나가 용서하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와 같다. 미성숙할 때의 어린 자식은 양육자를 떠나 살 수 없다. <2부>에서 미하엘이 한나와 거리를 둔 채 과거를 객관적으로 보며 죄를 묻는 장면은 사춘기 시절의 자녀와 양육자와 같다. 양육자는 무기력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자녀에게 재단당한다. <3부>에서는 양육자가 자녀로부터 이해받기를 고대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리워하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뜻을 받든다.
부모-자녀에서 나아가 이전 세대와 현 세대 집단의 갈등으로 보아도 좋다. 집단의 갈등은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고, 개개인에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 작품은 두 집단이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는 데서 해결방안을 찾는다. 한나가 글을 알고 책을 읽었듯이, 미하엘이 늦게나마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되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한나가 죽고 난 뒤에야 그리움에서 이해가 시작된다는 점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너무 늦기 전에 타인을(혹은 타집단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만으로도 남은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으리라.
"오고 싶거든 언제든지 오너라."
- 180쪽, 아버지가 '나'에게
https://m.blog.naver.com/snoopy701/223763968835
이 소설을 나이 차가 많은 남녀의 연애소설로 읽어도 좋지만, 부모와 자식의 세대 갈등에 관한 소설이라고 읽어도 좋다. <1부>에서 한나가 미하엘을 씻겨 주고 같이 자는 모습이나, 둘이 갈등이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미하엘이 한나에게 사과하고 한나가 용서하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와 같다. 미성숙할 때의 어린 자식은 양육자를 떠나 살 수 없다. <2부>에서 미하엘이 한나와 거리를 둔 채 과거를 객관적으로 보며 죄를 묻는 장면은 사춘기 시절의 자녀와 양육자와 같다. 양육자는 무기력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자녀에게 재단당한다. <3부>에서는 양육자가 자녀로부터 이해받기를 고대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리워하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뜻을 받든다.
부모-자녀에서 나아가 이전 세대와 현 세대 집단의 갈등으로 보아도 좋다. 집단의 갈등은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고, 개개인에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 작품은 두 집단이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는 데서 해결방안을 찾는다. 한나가 글을 알고 책을 읽었듯이, 미하엘이 늦게나마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되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한나가 죽고 난 뒤에야 그리움에서 이해가 시작된다는 점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너무 늦기 전에 타인을(혹은 타집단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만으로도 남은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으리라.
"오고 싶거든 언제든지 오너라."
- 180쪽, 아버지가 '나'에게
https://m.blog.naver.com/snoopy701/223763968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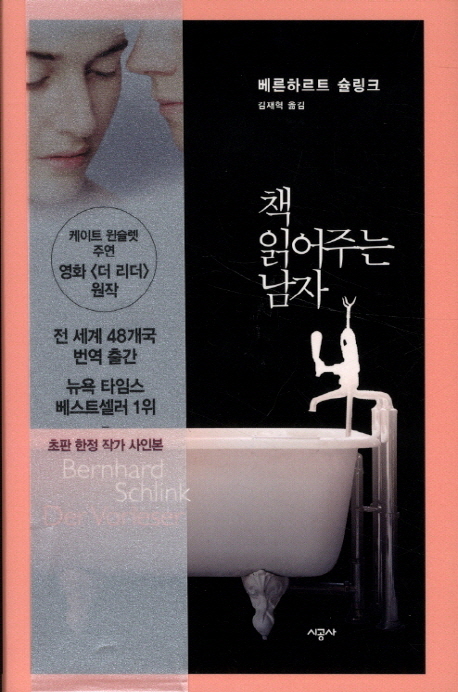
책 읽어주는 남자
 읽었어요
읽었어요

1명이 좋아해요
6일 전
 1
1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