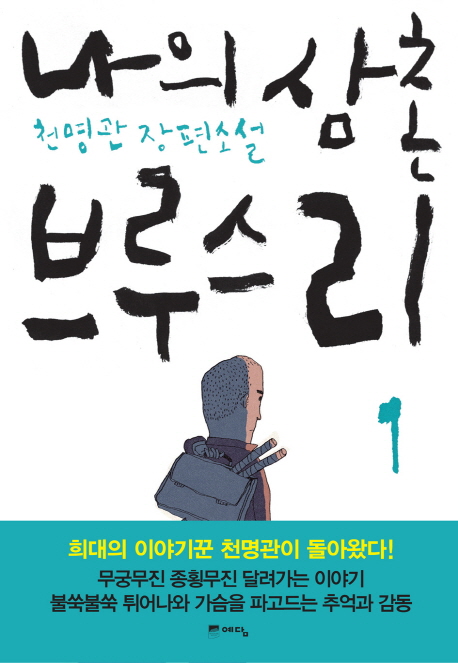LeHaKo
@lehako
+ 팔로우


고래에 이어 읽은 천명관 작가님의 소설.
화자인 상구의 눈으로 본 삼촌 도운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제목과 만화같은 표지그림에 가볍게 읽기 시작했으나, 고래처럼 역시 예상치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에 빠르게 매료되었다.
이소룡을 보기 위해 동시상영관을 다니는 주인공을 보고
나 또한 갓 개봉관에서 내린 영화들을 저렴한 가격에 동시상영으로 볼 수 있었던
청량리 근처 녹색극장이라는 이류 동시상영관이 기억났다.
그 옛날 찌라시같던 시사주간지를 통해 잠깐씩 읽어본
삼청교육대의 실상과 민주화 운동 등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이소룡과 같은 무도인의 길을 가려는 삼촌, 권도운.
그리고 그가 인생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던 여배우 원정.
화자인 상구.
삼촌에게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준 칼판장.
삼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마사장.
오순과 삼촌의 아들, 토끼, 종태, 장관장, 그리고 유의원과 그의 아들.
이러한 다양한 인물들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책속에 녹여놓았다.
본문에서...
- 지금은 온갖 시련 끝에 막 은둔 고술르 만나는 대목인데 교습비 얘기는 아무래도 좀 생뚱맞은 데가 있었다.
-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소룡이 적을 물리치던 그 순간 극장에서 난데없이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 다들 주변의 열화와 같은 응원을 등에 업고 홈경기를 치르는데 나 홀로 야유와 적대감에 둘러싸여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 기분.
- 나는 개새끼가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 주인공이 한 대 때리면 으악! 하고 쓰러져서 으악새 배우래.
- 오래전에 삼촌이 나를 통해 종태에게 선물로 주었던 바로 그 쌍절곤이었다.
- 그녀가 운 것은 우리가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물줄기 앞에 서 있는 개인의 왜소함 때문이었을까?
- 우리가 술을 마셨던 장소가 삼겹살집이었는지, 순댓국집이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진 먼 훗날, 이미 오래전에 소실되어 버린 사랑의 감정을 기억해 내려고 애쓰며, 우리는 다시 술을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싱거운 농담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
- 나, 여, 여자한테 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지, 지, 진짜 싫거든.
- 꿈이 현실이 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야.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꿈이 너무 간절하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별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거든.
- 너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니?
- 뭐, 여기선 임청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쯤 되면 대개 이야기를 듣던 배우들이 '에이, 씨발' 하는 표정으로 자리를 떴지만 순진한 삼촌은 장 관장의 얘기가 영화처럼 재밌기만 했다.
-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건 그래서일까? 자신이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세계와 현실세계가 그토록 달라서?
- 가혹하면 가혹한데로 신산스러우면 신산스러우대로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꾸려갈 것이다.
- 우리의 시대는 모두 고향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의 운명을 짊어진 시대인지도 모른다.
화자인 상구의 눈으로 본 삼촌 도운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제목과 만화같은 표지그림에 가볍게 읽기 시작했으나, 고래처럼 역시 예상치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에 빠르게 매료되었다.
이소룡을 보기 위해 동시상영관을 다니는 주인공을 보고
나 또한 갓 개봉관에서 내린 영화들을 저렴한 가격에 동시상영으로 볼 수 있었던
청량리 근처 녹색극장이라는 이류 동시상영관이 기억났다.
그 옛날 찌라시같던 시사주간지를 통해 잠깐씩 읽어본
삼청교육대의 실상과 민주화 운동 등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이소룡과 같은 무도인의 길을 가려는 삼촌, 권도운.
그리고 그가 인생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던 여배우 원정.
화자인 상구.
삼촌에게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준 칼판장.
삼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마사장.
오순과 삼촌의 아들, 토끼, 종태, 장관장, 그리고 유의원과 그의 아들.
이러한 다양한 인물들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책속에 녹여놓았다.
본문에서...
- 지금은 온갖 시련 끝에 막 은둔 고술르 만나는 대목인데 교습비 얘기는 아무래도 좀 생뚱맞은 데가 있었다.
-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소룡이 적을 물리치던 그 순간 극장에서 난데없이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 다들 주변의 열화와 같은 응원을 등에 업고 홈경기를 치르는데 나 홀로 야유와 적대감에 둘러싸여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 기분.
- 나는 개새끼가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 주인공이 한 대 때리면 으악! 하고 쓰러져서 으악새 배우래.
- 오래전에 삼촌이 나를 통해 종태에게 선물로 주었던 바로 그 쌍절곤이었다.
- 그녀가 운 것은 우리가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물줄기 앞에 서 있는 개인의 왜소함 때문이었을까?
- 우리가 술을 마셨던 장소가 삼겹살집이었는지, 순댓국집이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진 먼 훗날, 이미 오래전에 소실되어 버린 사랑의 감정을 기억해 내려고 애쓰며, 우리는 다시 술을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싱거운 농담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
- 나, 여, 여자한테 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지, 지, 진짜 싫거든.
- 꿈이 현실이 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야.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꿈이 너무 간절하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별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거든.
- 너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니?
- 뭐, 여기선 임청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쯤 되면 대개 이야기를 듣던 배우들이 '에이, 씨발' 하는 표정으로 자리를 떴지만 순진한 삼촌은 장 관장의 얘기가 영화처럼 재밌기만 했다.
-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건 그래서일까? 자신이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세계와 현실세계가 그토록 달라서?
- 가혹하면 가혹한데로 신산스러우면 신산스러우대로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꾸려갈 것이다.
- 우리의 시대는 모두 고향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의 운명을 짊어진 시대인지도 모른다.



외 2명이 좋아해요
2021년 2월 10일
 5
5
 0
0
LeHaKo님의 다른 게시물

LeHaKo
@lehako

필사의 힘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5일 전
 0
0
 0
0

LeHaKo
@lehako

혼불
 읽었어요
읽었어요

1명이 좋아해요
2주 전
 1
1
 0
0

LeHaKo
@lehako
즐겁게 읽히는 재미있는 문체의 소설을 또 만났다.
한 편의 우당탕탕 판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소제목들만 봐도 재미있는 소설이다.
세트장에서 살아가는 강마을 사람들과
근처 별장에 머물던 조폭들의 조우.
소설을 보고 무심코 쓰고 있는 해학이란 단어가 생각나서 찾아봤다.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늦게 알아버린 이야기꾼 성석제 작가,
이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게 될 거 같다
소개받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들으며...
***
모든 순간이 다 귀하고 아까웠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다.
좀 길든, 아주 짧든 간에.
한 편의 우당탕탕 판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소제목들만 봐도 재미있는 소설이다.
세트장에서 살아가는 강마을 사람들과
근처 별장에 머물던 조폭들의 조우.
소설을 보고 무심코 쓰고 있는 해학이란 단어가 생각나서 찾아봤다.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늦게 알아버린 이야기꾼 성석제 작가,
이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게 될 거 같다
소개받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들으며...
***
모든 순간이 다 귀하고 아까웠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다.
좀 길든, 아주 짧든 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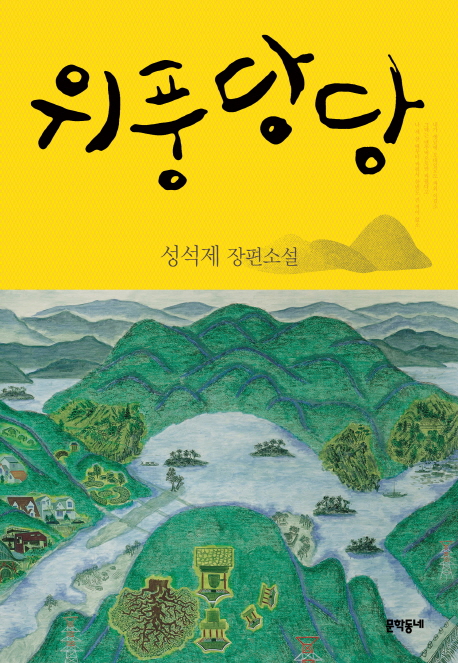
위풍당당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3주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