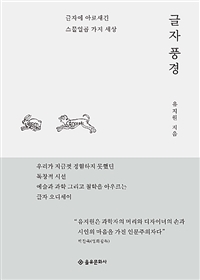Jiyeon Park
@jiyeonpark
+ 팔로우


제목부터 글자 풍경이라니. 글자는 텍스트로서 내포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글자 자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글자를 풍경으로 바라본 제목이 흥미로웠다.
그래서인지 문자와 서체(타이포그래피)마다의 특징과 그 서체가 지니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내용들이 다뤄져서 글자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처음엔 사진 속 서체가 모두 같아보였는데 주의를 기울이고보니 모두 다른 서체인걸 이제 알겠다.
*1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인용된 문장이긴 하지만
물고기들은 고체상태의 물이다.
새들은 고체상태의 바람이다.
책들은 고체상태의 침묵이다.
폰트를 사용할때 저작권 의식 없이 공유하고 썼던 때가 많은데 한글폰트 디자이너들은 적게는 수천 자 많게는 낱글자를 하나하나를 디자인한다고 하니 폰트를 사용할 때도 저작권 의식을 가지고 사용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삼 책 속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한글 폰트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2장에서 기억남는 구절
본문용 기능적인 폰트를 점심에 쓴 숟가락에 비유했다. 숟가락의 생김새가 기억난다면 뭔가 불편했다는 뜻이니 기억나지않아야 기능을 잘 하는 것이다. 폰트 디자인에서는 바로 이 점이 어렵다. 실험적이고 독특한 폰트도 제 역할이 있긴 하지만 기능적이고 범용성 높은 폰트야말로 개발이 까다롭다.
글자에는 가시성, 판독성, 가독성이라는 기능이 있다. 가시성은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힘이다. 판독성은 글자들이 서로 잘 판별되는가를 가른다. 긴 글을 읽을 때 인체에 피로감을 덜 주는 글자체에 대해 가독성이 높다고 한다.
'흥'과 '홍'은 일반적인 폰트에서 구분하기 애매한 글자인데 이런 글자를 판결문에 잘못 표기되면 그 판결문은 무효가된다고 한다. 그래서 판독성이 좋은 판결서체를 따로 만들어 사용한다고하니 신기했다.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 글자의 가시성, 판독성, 가독성을 고려한 글자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르고 무심코 지나치던 간판들도 이 책을 보고나니 유심히 보게된다.
처음 책 읽을 때 표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는데 4장에서 궁금증이 풀렸다. 옛 악보의 피날레 장식이라고 한다.
글, 그림, 그리움. 이 세 단어의 어원이 모두 같다고 한다. '긁다'에서 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글과 그림은 그 자리에 부재하는 화자, 소리, 대상이 흔적으로 남은 것으로 부재하는 것들은 그리움을 일으킨다.
월인천강.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에 찍힌다는 표현. 이 네 글자를 인쇄술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은유라고 책을 마무리해서 여운이 남는다.
그래서인지 문자와 서체(타이포그래피)마다의 특징과 그 서체가 지니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내용들이 다뤄져서 글자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처음엔 사진 속 서체가 모두 같아보였는데 주의를 기울이고보니 모두 다른 서체인걸 이제 알겠다.
*1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인용된 문장이긴 하지만
물고기들은 고체상태의 물이다.
새들은 고체상태의 바람이다.
책들은 고체상태의 침묵이다.
폰트를 사용할때 저작권 의식 없이 공유하고 썼던 때가 많은데 한글폰트 디자이너들은 적게는 수천 자 많게는 낱글자를 하나하나를 디자인한다고 하니 폰트를 사용할 때도 저작권 의식을 가지고 사용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삼 책 속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한글 폰트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2장에서 기억남는 구절
본문용 기능적인 폰트를 점심에 쓴 숟가락에 비유했다. 숟가락의 생김새가 기억난다면 뭔가 불편했다는 뜻이니 기억나지않아야 기능을 잘 하는 것이다. 폰트 디자인에서는 바로 이 점이 어렵다. 실험적이고 독특한 폰트도 제 역할이 있긴 하지만 기능적이고 범용성 높은 폰트야말로 개발이 까다롭다.
글자에는 가시성, 판독성, 가독성이라는 기능이 있다. 가시성은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힘이다. 판독성은 글자들이 서로 잘 판별되는가를 가른다. 긴 글을 읽을 때 인체에 피로감을 덜 주는 글자체에 대해 가독성이 높다고 한다.
'흥'과 '홍'은 일반적인 폰트에서 구분하기 애매한 글자인데 이런 글자를 판결문에 잘못 표기되면 그 판결문은 무효가된다고 한다. 그래서 판독성이 좋은 판결서체를 따로 만들어 사용한다고하니 신기했다.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 글자의 가시성, 판독성, 가독성을 고려한 글자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르고 무심코 지나치던 간판들도 이 책을 보고나니 유심히 보게된다.
처음 책 읽을 때 표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는데 4장에서 궁금증이 풀렸다. 옛 악보의 피날레 장식이라고 한다.
글, 그림, 그리움. 이 세 단어의 어원이 모두 같다고 한다. '긁다'에서 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글과 그림은 그 자리에 부재하는 화자, 소리, 대상이 흔적으로 남은 것으로 부재하는 것들은 그리움을 일으킨다.
월인천강.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에 찍힌다는 표현. 이 네 글자를 인쇄술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은유라고 책을 마무리해서 여운이 남는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020년 11월 25일
 0
0
 0
0
Jiyeon Park님의 다른 게시물

Jiyeon Park
@jiyeon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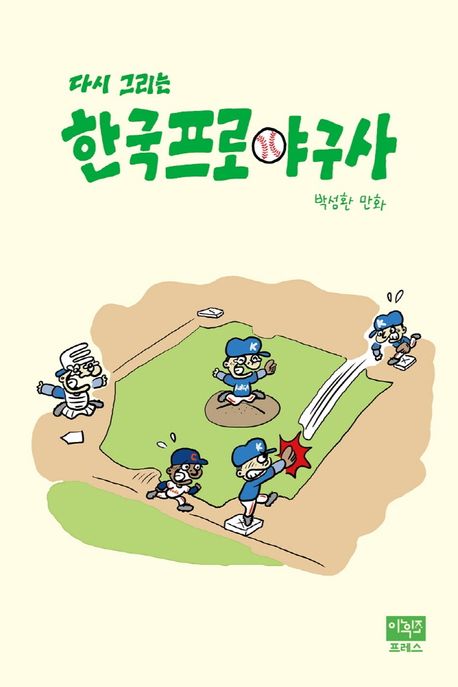
다시 그리는 한국프로야구사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주 전
 0
0
 0
0

Jiyeon Park
@jiyeonpark

타인의 집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1주 전
 0
0
 0
0

Jiyeon Park
@jiyeonpark
p.249 나는 나이를 먹어도 지혜나 연륜 같은 건 터득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아득함만 깨닫고 있었다.
p.262 부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기를. 햇볕을 쬐면 정화되기를. 경우 없는 세상에서도.
작가의 말
p.277 내가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애쓸수록 미숙함은 쉽게 들통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길은 여전히 요원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은,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을 가만히 멈춰서 살필 수 있는 시선을 주었다.
p.262 부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기를. 햇볕을 쬐면 정화되기를. 경우 없는 세상에서도.
작가의 말
p.277 내가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애쓸수록 미숙함은 쉽게 들통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길은 여전히 요원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은,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을 가만히 멈춰서 살필 수 있는 시선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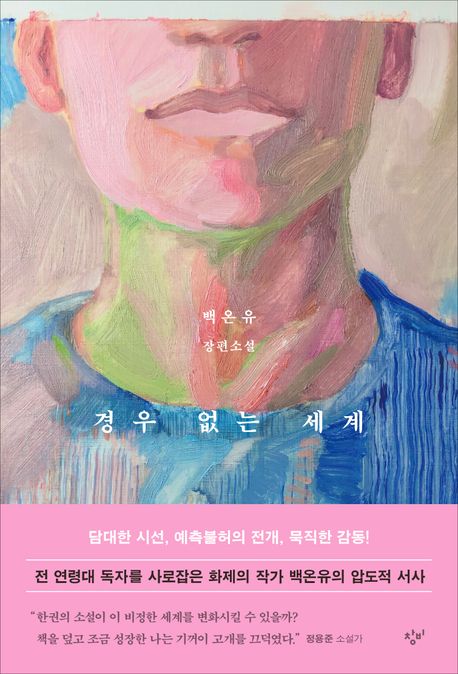
경우 없는 세계
 읽었어요
읽었어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2주 전
 0
0
 0
0
게시물 더보기
웹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