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감각은
어느 계절에 머무르고 있나요
Edited by
샐 Sal
어느 계절에 머무르고 있나요
Edited by
샐 Sal
입춘이 지나가고 벌써 2월이 끝나갑니다. 이맘때 봄기운은 사람들의 몸을 가볍게 하고 얼굴 위로 무해한 미소를 띠게 하죠. 봄을 기다린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두꺼운 외투를 내려놓고 집을 나서는 일만큼은 반갑지 않을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은 지났지만 다가오는 입학 시즌과 새 학기의 감각이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듯 3월은 약간의 설렘과 긴장을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연초에 세운 새해의 계획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기에도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계절의 가장 보드라운 부분을 구분해서 ‘봄’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 박솔미 『오후를 찾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절
한없이 침잠한 마음으로 지내는 시절이나 이따금 주변을 돌아볼 새 없이 살고 있을 때 문득 창밖을 보면 달라져 있는 바깥 풍경에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둣빛 새싹이 돋아있고 겨우내 잘 보이지 않던 길고양이들이 볕 아래 늘어져 있는 모습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렇게 놓쳐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는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정도가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진 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보니 지금 내가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구나, 하는 식으로요.

우리가 둔감하고 무심하게 하루, 또 다음 하루를 지나쳐 보낼 때도 언제나처럼 시간은 착실하게 흐르고 계절은 차례를 맞춰 돌아옵니다. 지금 이 계절이 가고 다음 계절을 맞는 것이, 무엇 하나 애쓰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순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벚꽃잎이 흩날리던 날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까운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보았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찬탄할 만큼 아름다웠던 벚꽃이 얼마나 슬프게 보이던지요. 못난 마음에 벚꽃을 싫어하게 되진 않을까 지레 걱정했지만, 그다음 해에 본 벚꽃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계절의 오고 감이 각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개월을 건너서 다음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죠. 어디선가 한 번쯤은 읽거나 들어봤을 격언 같은 이야기지만, 몸소 체험하니 무척 시린 교훈이었습니다. 그해 봄은 그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아팠고 여름에는 그가 미처 이르지 못해서 허전했고 가을은 잎을 떨구는 나무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를 떠올리게 해 쓸쓸했으며 겨울은 남은 우리들이 유달리 추운 것만 같아서 울적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흘러간 사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실은 아팠지만, 주어진 계절과 흐르는 시간 안에서 숨 쉬고 살아갈 수 있음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절의 교차점에 서서, 가려 하는 겨울에게는 재회를 기약하고 다가오는 봄은 반갑게 맞아봅니다.
단 몇 개월을 건너서 다음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죠. 어디선가 한 번쯤은 읽거나 들어봤을 격언 같은 이야기지만, 몸소 체험하니 무척 시린 교훈이었습니다. 그해 봄은 그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아팠고 여름에는 그가 미처 이르지 못해서 허전했고 가을은 잎을 떨구는 나무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를 떠올리게 해 쓸쓸했으며 겨울은 남은 우리들이 유달리 추운 것만 같아서 울적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흘러간 사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실은 아팠지만, 주어진 계절과 흐르는 시간 안에서 숨 쉬고 살아갈 수 있음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절의 교차점에 서서, 가려 하는 겨울에게는 재회를 기약하고 다가오는 봄은 반갑게 맞아봅니다.
한 계절이 문을 열고 사라지고 또 한 계절이 다른 문으로 들어온다.
― 무라카미 하루키 『1973년의 핀볼』

계절 감각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둔해진다고 하지만, 자연과 계절을 느끼는 감도만큼은 그와 반대로 점점 선명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봄날의 노란 개나리, 겨울 산의 설경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절을 느끼는 방법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의 낮게 가라앉는 찬 공기, 여름의 비릿한 흙냄새 같은 것들로 다가올 계절을 예감하기도 합니다.
인구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시절과 달리 계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절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절을 느끼려면 감각을 깨우고 주변을 살펴야 하죠. 타성에 젖지 않고, 또 자연과 마주하는 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요.
인구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시절과 달리 계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절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절을 느끼려면 감각을 깨우고 주변을 살펴야 하죠. 타성에 젖지 않고, 또 자연과 마주하는 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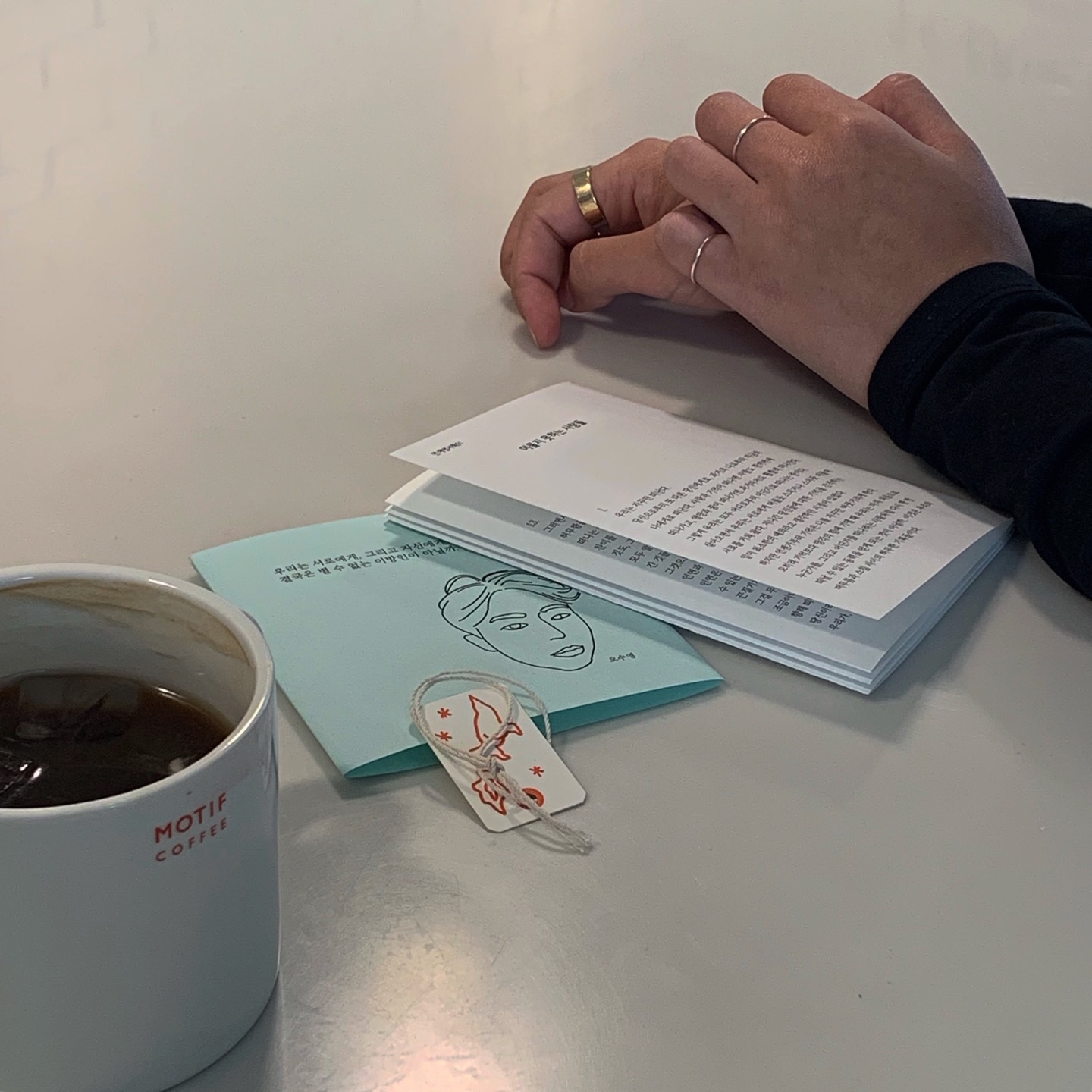
타고나길 둔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계절을 느끼는 방법에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각자의 계절별 루틴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꽃구경을 가고 여름이면 수박을 한 통 사고 가을이면 시집 한 권을 읽는다거나, 한 친구는 겨울이 오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쓰는 이 글이 바로 그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계절을 이야기하는 문장을 발견하면 메모해 두었다가 그 계절이 되면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봄이 왔으니 조만간 싱싱한 나물을 챙겨 먹을 테고요.

내내 계절이란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건 계절이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미로 가득하고 마음은 풍요로운 삶이요. 당신의 2024년이, 바쁜 일상 속에 자연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숨 여유 내어 환기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출발점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은 듯 맴도는 찬 공기 사이로 기분 좋은 봄 공기가 스며드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짓궂은 겨울 끝자락의 한기는 얼마간 남아서 변덕을 부리겠지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늘 그랬듯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를 공유하며 글을 마칩니다. 어느 계절에 서 있든, 봄날 같은 기분을 느끼는 하루가 자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은 듯 맴도는 찬 공기 사이로 기분 좋은 봄 공기가 스며드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짓궂은 겨울 끝자락의 한기는 얼마간 남아서 변덕을 부리겠지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늘 그랬듯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를 공유하며 글을 마칩니다. 어느 계절에 서 있든, 봄날 같은 기분을 느끼는 하루가 자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봄을 회상하며 생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추억에 남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정녕 그러하다. 인생에 있어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침울한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때때로 봄과 같은 날이 있어 가슴은 이렇게 말한다. "봄날 같은 기분이구나!"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 막스 뮐러 『독일인의 사랑』

beaten.reader
샐 Sal
샐 S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