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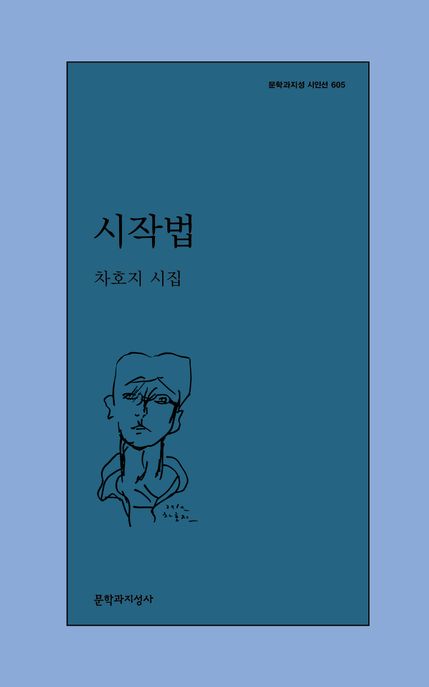
이 책을 읽은 사람

1명
나의 별점

 읽고싶어요
읽고싶어요



책장에 담기

게시물 작성

문장 남기기
분량
얇은 책
출간일
2024.6.26
페이지
126쪽
상세 정보
2021년 제21회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차호지의 첫 시집 『시작법』이 문학과지성 시인선 605번으로 출간되었다. 총 4부로 나뉘어 묶인 51편의 시에는 “좁은 공간에서 혹은 한정된 시야로 혹은 제한된 관계 안에서 특정한 장면을 만들어내거나 사유를 확장해나가는”(심사평) 시인만의 개성적인 작법이 뚜렷하게 투영되어 있다.
차호지의 시에서 편편이 등장하는 공간은 사면의 벽과 천장과 바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상자’(「설계자」)나 ‘방’(「소음」)과 같은 육면체의 형태는 물론 ‘열차’(「열차」), ‘천변’(「저글링」), ‘공중’(「공중」)까지 아우른다. 둘레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공간들이 전면적으로 막혀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까닭은 시 속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놓일 장소를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꾸린 공간은 “창문이 완전히 없”는 경우가 “좀처럼 없”(「바퀴의 왕」)기에 바깥의 공기가 선선히 들어올 수 있고,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도 “바람은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 나”(「아쿠아플라넷에서」)가고는 하며, 환상은 그 바람을 타고 현실 속으로 자유롭게 틈입한다.
이 책을 언급한 게시물1

고요
@90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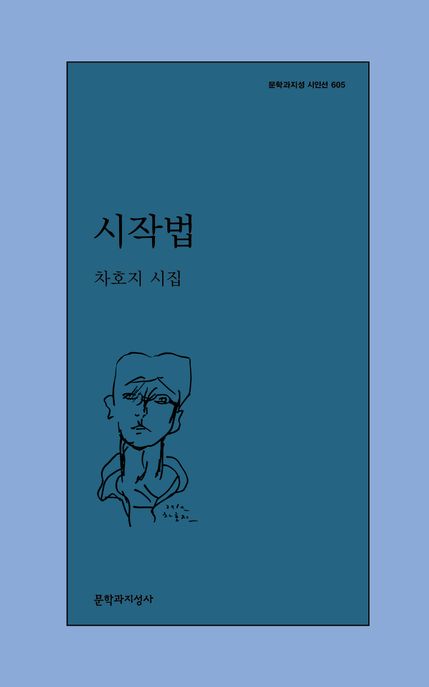
시작법



3명이 좋아해요
 3
3
 0
0
상세정보
2021년 제21회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차호지의 첫 시집 『시작법』이 문학과지성 시인선 605번으로 출간되었다. 총 4부로 나뉘어 묶인 51편의 시에는 “좁은 공간에서 혹은 한정된 시야로 혹은 제한된 관계 안에서 특정한 장면을 만들어내거나 사유를 확장해나가는”(심사평) 시인만의 개성적인 작법이 뚜렷하게 투영되어 있다.
차호지의 시에서 편편이 등장하는 공간은 사면의 벽과 천장과 바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상자’(「설계자」)나 ‘방’(「소음」)과 같은 육면체의 형태는 물론 ‘열차’(「열차」), ‘천변’(「저글링」), ‘공중’(「공중」)까지 아우른다. 둘레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공간들이 전면적으로 막혀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까닭은 시 속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놓일 장소를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꾸린 공간은 “창문이 완전히 없”는 경우가 “좀처럼 없”(「바퀴의 왕」)기에 바깥의 공기가 선선히 들어올 수 있고,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도 “바람은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 나”(「아쿠아플라넷에서」)가고는 하며, 환상은 그 바람을 타고 현실 속으로 자유롭게 틈입한다.
출판사 책 소개
“그렇게 쓰지 않으면
모르는 것도 있어요”
공간의 가장 안쪽에서
집요한 시선으로만 포착되는
현실과 환상의 어름
약동하는 물음표로 가득한 너른 틈의 설계자
차호지 첫 시집 출간
2021년 제21회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차호지의 첫 시집 『시작법』이 문학과지성 시인선 605번으로 출간되었다. 총 4부로 나뉘어 묶인 51편의 시에는 “좁은 공간에서 혹은 한정된 시야로 혹은 제한된 관계 안에서 특정한 장면을 만들어내거나 사유를 확장해나가는”(심사평) 시인만의 개성적인 작법이 뚜렷하게 투영되어 있다.
차호지의 시에서 편편이 등장하는 공간은 사면의 벽과 천장과 바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상자’(「설계자」)나 ‘방’(「소음」)과 같은 육면체의 형태는 물론 ‘열차’(「열차」), ‘천변’(「저글링」), ‘공중’(「공중」)까지 아우른다. 둘레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공간들이 전면적으로 막혀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까닭은 시 속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놓일 장소를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꾸린 공간은 “창문이 완전히 없”는 경우가 “좀처럼 없”(「바퀴의 왕」)기에 바깥의 공기가 선선히 들어올 수 있고,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도 “바람은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 나”(「아쿠아플라넷에서」)가고는 하며, 환상은 그 바람을 타고 현실 속으로 자유롭게 틈입한다.
이때 벽을 상상하며 직접 세우는 일은 폐쇄를 더 견고하게 할 뿐인가? 아니면 세워진 벽을 언제든 부정하고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잠정적인 탈출과 맞닿아 있는가? 시 속 설계자들이 그들이 직조한 공간을 좀체 벗어나지 않기에 이러한 의문은 특히 커진다. 공간의 바깥을 “밟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딘가로 떨어지지는 않을”(「산책」) 테지만, 이들은 폐쇄된 공간 안쪽에 들어앉아 충실하게 잔류한다.
확언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러한 머묾이 정해진 질서를 충실하게 감각함으로써 그것을 따르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치열한 태도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완전한 허공에 붕 떠서 살아갈 수는 없다. “점점 더 높은 건물의 옥상으로” 뛰어올라도, “더는 올라갈 높은 건물이 없어 가장 높은 건물 위에서 제자리 뛰기 하”여도 그곳에조차 천장이 있다. 그러므로 머리에 닿는 것이 천국이 아닌 천장임을 알면서도, “엉엉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도 “천장에 머리를 자꾸만 부딪”(「공중」)치는 일은 유의미한 시도로 읽힌다. “그렇게 쓰지 않으면 모르는 것도 있”(「아쿠아플라넷에서」)는 법이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형상에는
눈길이 가게 마련이었다”
─시작, 법(始作, 法): 움직임에 몰두하며 시작하기
열차는 만석이고 창가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나란히 한 방향으로 앉아 있다. 사람들은 거의 창밖을 보고 있다. 바깥을 보는 것이 좋아서라기보다 움직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 열차가 순환한다면 나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움직이는 바깥 풍경을 보다가 아까와 비슷한 풍경을 발견하고 그제야 이곳이 아까 보았던 풍경과 같은지 지도로부터 확인하여 그것의 맞고 틀림을 가늠하는 놀이에 온 하루를 다 썼을지도 모른다. 열차가 정차하고 다시 출발할 때마다 천장에서 무수히 발소리가 들렸다. 플랫폼에서 보았던 얼굴들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다시 기억나지 않았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열차에 앉아 있으면 나도 다시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다.
―「열차」 부분
공간 안팎의 움직임을 분주하게 좇는 시선이 함께하기에, 단순하고 담백한 문장으로 사방이 에워져 있음에도 차호지의 시는 결코 정적이지 않다. 마치 “움직이는 아기 새 모양 모빌이 그리는 원 모양에 마음을 빼앗겨서 줄곧 움직이는 아기 새 모양 모빌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모빌)는 것처럼, 저글링을 하는 누군가가 공을 놓쳤을 때 “아까 그 자세로 가만히 멈춰 있는 그” 대신 “세 개의 공이 어디로 향하는지 쳐다보게”(「저글링」) 되는 것처럼, 움직임에는 이목을 잡아끄는 힘이 있고 시인은 기꺼이 “움직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열차」)긴다. 움직임마다 바싹 따라붙는 특유의 눈길은 얼핏 고요한 듯 보이는 일상의 장면에 묘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밀도 높은 관찰은 풍경의 디테일을 선명하게 만들어 찰나의 사소한 미동에도 생경한 느낌을 불어넣고, 이에 시인은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으면 왜 저건 움직이고 있을까”(「바퀴의 왕」) 자문한다. “이제 다 썼고 더는 쓸 게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사물들은 “꼭 다시 움찔거”(커튼)리기에 이 물음은 끝날 수 없고, 움직임이 계속되는 이상 “사물이 사물이었던 시대”(「돌」)는 저물게 되며, “말을 하면” “움직이는 사람이”(「제자리」) 되게 마련이므로 시인은 외부의 움직임에 몰두하는 관찰자의 자리에서 나아가 스스로 시적 움직임의 주체가 된다. 차호지의 시 쓰기는 여기서 시작한다.
“이해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아주 많을 때 그 말은 떠오른다”
─시, 작법(詩, 作法): 틈새에서 질문하며 쓰기
나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문장을 읽을 때 눈동자가 움직이는 속도. 다음, 다음으로.
[……]
나는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한다.
시간은 움직이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쫓고 있다. 그건 이미 내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지만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걷는 나의 뒤쪽에서 앞서 걷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등을 보면서
모르겠어?
[……]
나는 열린 문을 닫으면서 거울을 본다. 보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 거울이 있다. 나는 거울에 없었는데 잠시 후에 생겨났다.
등을 돌려서 등을 보지는 못하는데도
어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시차」 부분
세계를 끈덕지게 관찰하는 일, 그리고 이것으로 시를 쓰는 일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차가 발생한다. 응시의 앞에는 그보다 선행하는 움직임이, 창작의 앞에는 그보다 선행하는 골몰이 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중이 되어서야” “그런 말을 했었구나 하고 뒤늦게 그랬었구나 생각하”(「산책」)는 것처럼, 어떤 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 순간을 글자로 옮겨 적을 수 있다. 차호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차를 작법의 도구로 활용한다.
시차를 인지하고 씀으로써 더 한껏 벌어지는 시간과 시간 사이의 틈은 또 다른 틈에 대한 인식으로 흐른다. 꽉 닫혀 있는 듯한 공간에도 언제나 문이 있음을, 그리고 문은 무언가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틈임을 새삼스럽게 환기한다. 그렇게 시인은 시적 공간의 가장 안쪽에 있으면서도 바깥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로 힘껏 끌어오며, 그 갈피마다 끼어드는 의문을 문 너머의 독자와 공유한다. 당신의 좌표는 현실과 환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당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쓰는 일은 결국 안과 밖이 맞닿아 생기는 어름을 어루만져보는 행위이고, 이는 곧 틈새의 폭을 가늠하며 수많은 가능성의 공간을 설계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이번 시집의 해설을 맡은 문학평론가 홍성희가 짚고 있듯 “말의 힘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놓여 있”고, “이야기가 무언가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 힘은 그것이 그려낸 닫힌 세계의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와 다른 하나의 이야기,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동시에 만들어지는 ‘사이’들에 있을 것이다”.
[……] 자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야? 묻는 소리가 또 들렸다. 나는 안쪽에 있었다. 그 사람은 바깥에 있었다. 너는 어디야? 나는 목소리를 내보았다. 답은 없었다. 나는 닫혀 있는 문을 보았다. 그러고 보니 문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가까이 가자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거기서 찬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다시 완전히 닫았다. 닫았다가 열었다가 해보았다.
―「어디야?」 부분
현재 25만명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