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트라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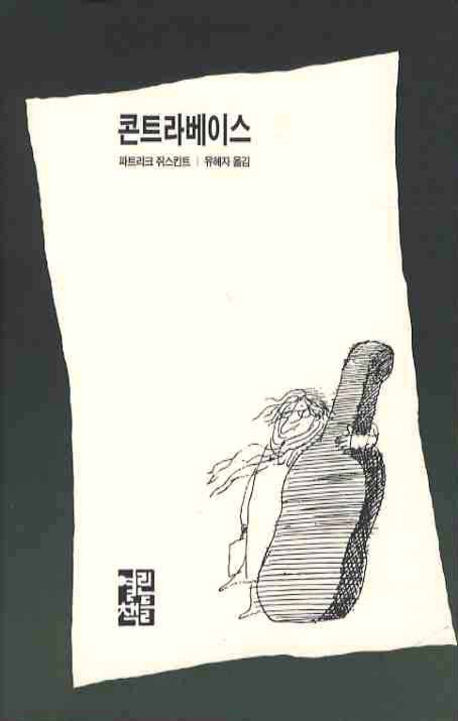
이 책을 읽은 사람



73명
나의 별점

 읽고싶어요
읽고싶어요



책장에 담기

게시물 작성

문장 남기기
분량
얇은 책
출간일
2000.2.10
페이지
112쪽
이럴 때 추천!
일상의 재미를 원할 때 , 힐링이 필요할 때 읽으면 좋아요.
상세 정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될 때
나 자신을 찾아가는 책
작은 활동 공간 내에서 사랑하고 존재를 위해 투쟁하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이야기. 한 예술가의 고뇌와 평범한 소시민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모노드라마이다. 역할은 중요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선뜻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이 책을 언급한 게시물6

에버네버
@yhkles
진짜 오랜만에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작품을 읽는다. 보통 문어발식 독서 중이라 집이나 교습소에는 두꺼운 책을, 가방 안에는 얇은 책을 넣어두는데 이번에 담긴 책이 <콘트라베이스>. 도통 시간이 나지 않아 가방 속에 묵힌 채로 약 세 달. 그래도 신기하게 내용이 잊히지 않고 계속해서 읽을 수 있었다.
<콘트라베이스>는 그동안의 작가의 책과는 또다른 책이다.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랍다. 우선 희곡으로 연극을 상연하기 위해 씌여진 글이라는 사실. 게다가 이 작품은 모노드라마다. 따라서 책 속 주인공, 콘트라베이스의 연주자인 '나'는 독자들(관객들)을 상대로 말을 한다. 희곡 형식이지만 모노드라마이기 때문에 대사글이 따로 없이 해설과 지문, 줄글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나"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씨불인다.(찾아보니 표준어.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 사람 참, 불쌍하구나 싶기도 하다. 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의 위치, 항상 아래쪽 둥둥거림이나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 좋은 대접도, 좋은 월급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계속해서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 사랑에서도 자신감이 없다. 좋아하는 여자(성악가)가 있지만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따위 눈여겨 보지 않을 테니 엉뚱하게 사고나 쳐 볼까 하는 생각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콘트라베이스가 갖고 있는 속성과 오케스트라에서의 신분적 위치를 바탕으로 한 평범한 소시민의 생존을 다룬 작품이라고 했단다. 100여 페이지의 얇은 책인데 중간까지 이 찌질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나 싶다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공감하게 된다. 누구보다도 찌질해 보이지만 만약 그게 내 위치라면, 그 처절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자체의 심리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책보다는 실제로 연극으로 보면 훨씬 더 감동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독일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는 공연이라고 하니 언젠가 이 작품을 연극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꼭 보고 싶다. 매 작품마다 다른 분위기의 소설을 쓰는 작가에게 또 한번 감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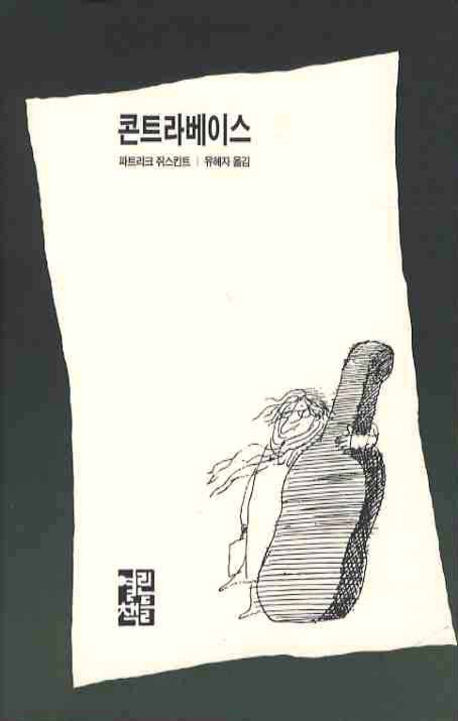
콘트라베이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0
0
 0
0

Sienna
@sien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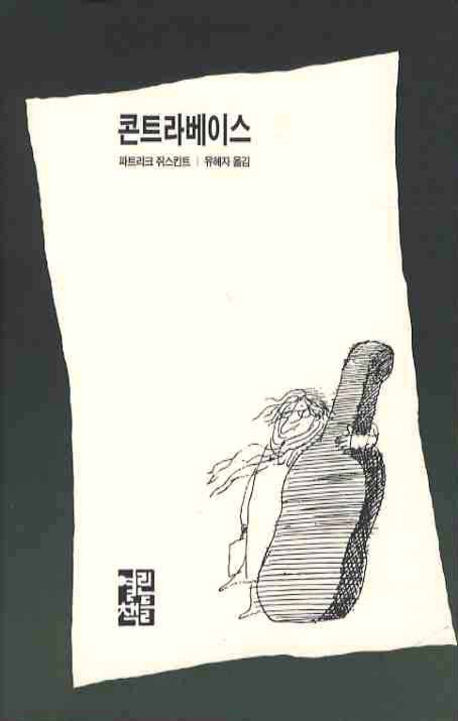
콘트라베이스



외 3명이 좋아해요
 6
6
 0
0

바이올렛
@yujung0602
#맥주만 마시면 목소리가 커진다는 주인공이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를 빌려 주목을 받진 못하지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은연중 드러내는, 상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라에게 다가서는 사랑의 소심함.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작품세계는 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보여준다. 결말의 해피엔드는 아니지만 왠지 읽고 나면 우리네 삶의 단면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을 느끼고 배워 나가게 만드는 힘. 파트리크 쥐스킨트답게, 그답게 작품을 썼네 하고 읽을 때마다 매번 느끼게 된다..
#다음 작품 *로시니 혹은 누가 누구와 잤는가 하는 잔인한 문제~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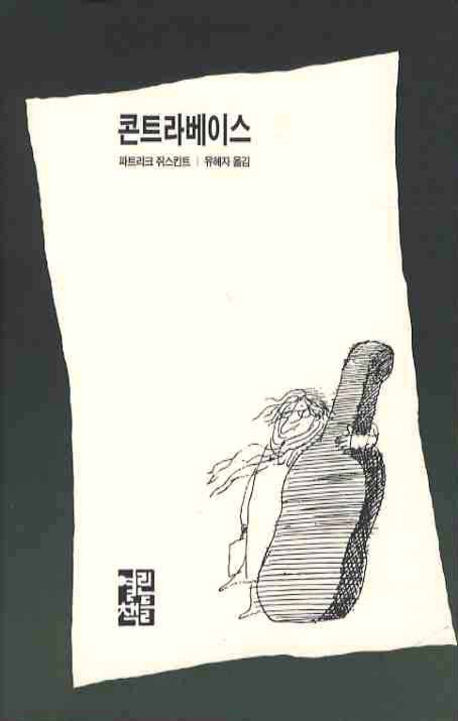
콘트라베이스
 읽었어요
읽었어요



외 4명이 좋아해요
 7
7
 0
0
상세정보
작은 활동 공간 내에서 사랑하고 존재를 위해 투쟁하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이야기. 한 예술가의 고뇌와 평범한 소시민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모노드라마이다. 역할은 중요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선뜻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현재 25만명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