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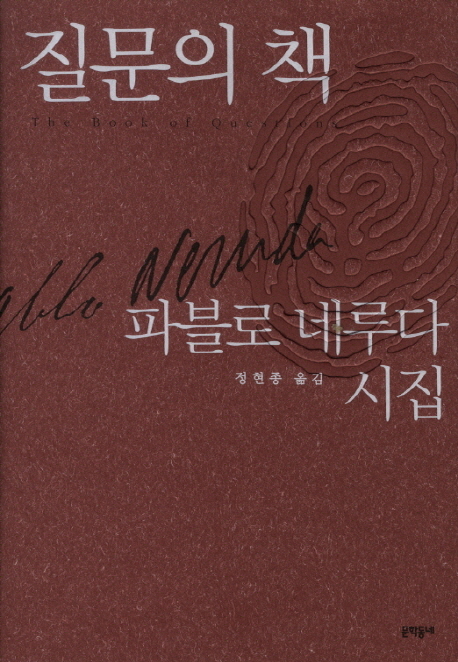
이 책을 읽은 사람



4명
나의 별점

 읽고싶어요
읽고싶어요



책장에 담기

게시물 작성

문장 남기기
분량
얇은 책
출간일
2013.2.20
페이지
164쪽
상세 정보
파블로 네루다 시집. 번역은 시인이자 네루다 전문가 100인에게 주는 네루다 메달을 받은 바 있는 정현종이 맡았다. 1974년에 출간된 시인의 후기작 중 하나다.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마무리된 이 시집은, 파란만장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 한데 뜨겁게 휘몰렸던 그가 칠십 노인의 펜으로 그릴 수 있는 온갖 물음표들은 죄다 넣은 듯 모두 300개가 넘는 질문들에 둘러싸여 있다.
어떤 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마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네루다의 시들은 그만의 예리한 직관과 그만의 풍부한 직감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만물에 나날이 새 옷을 입히는 역할에 그 충실을 다하고 있다. 그때마다 쓴 자와 읽는 자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운동이 이뤄지는데, 일체의 강요도 일말의 부응도 없이 다만 오늘 예 있음을 느끼게 하는 파장의 힘은 결국 우리의 살아 있음마저 확인케 한다.
이 책을 언급한 게시물2

오경화
@okyung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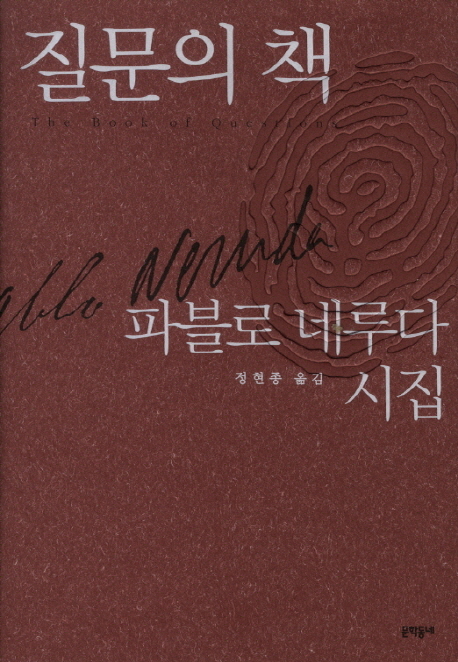
질문의 책
 읽고있어요
읽고있어요



외 1명이 좋아해요
 4
4
 0
0

김규희
@hfe0v12cci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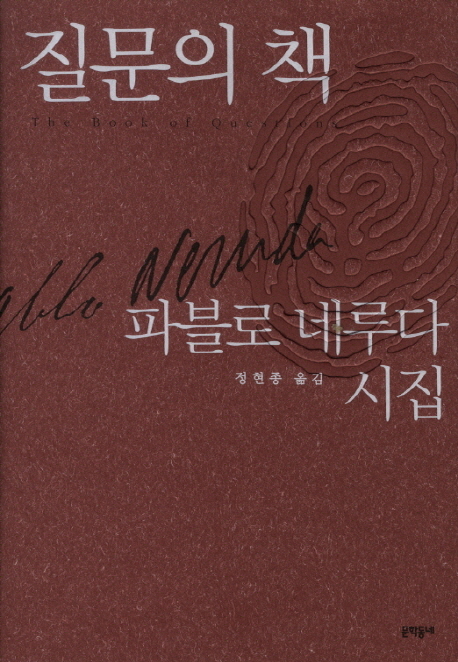
질문의 책
 읽었어요
읽었어요


2명이 좋아해요
 2
2
 0
0
상세정보
파블로 네루다 시집. 번역은 시인이자 네루다 전문가 100인에게 주는 네루다 메달을 받은 바 있는 정현종이 맡았다. 1974년에 출간된 시인의 후기작 중 하나다.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마무리된 이 시집은, 파란만장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 한데 뜨겁게 휘몰렸던 그가 칠십 노인의 펜으로 그릴 수 있는 온갖 물음표들은 죄다 넣은 듯 모두 300개가 넘는 질문들에 둘러싸여 있다.
어떤 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마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네루다의 시들은 그만의 예리한 직관과 그만의 풍부한 직감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만물에 나날이 새 옷을 입히는 역할에 그 충실을 다하고 있다. 그때마다 쓴 자와 읽는 자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운동이 이뤄지는데, 일체의 강요도 일말의 부응도 없이 다만 오늘 예 있음을 느끼게 하는 파장의 힘은 결국 우리의 살아 있음마저 확인케 한다.
출판사 책 소개
● 편집자의 책 소개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대단히 시적인, 엉뚱한 상상력의 소유자 네루다의
웃기고, 초현실적이며, 신비로운 질문의 시 74편!
파블로 네루다의 새 시집 한 권을 여기 내놓는다. 물론 파블로 네루다의 새 시집 번역은 최고의 시인이자 네루다 전문가 100인에게 주는 네루다 메달을 받은 바 있는 정현종 선생께서 맡았다. 그러니 번역에 토를 달 오지랖 따윈 제쳐두고 일단 읽어나가는 게 도리렷다. 제목부터 보시라. 호기심 만발이지 않는가. 『질문의 책』이라니, 시의 제목이 번호로만 붙어 있는 이 기묘한 목차라니.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은 1974년에 출간된 시인의 후기작 중 하나다. 1973년 9월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마무리된 이 시집은, 파란만장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 한데 뜨겁게 휘몰렸던 그가 칠십 노인의 펜으로 그릴 수 있는 온갖 물음표들은 죄다 넣은 듯 모두 300개가 넘는 질문들에 둘러싸여 있다. 말하자면 물음표가 우산처럼 둥둥 떠 있는 형국이랄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양산처럼 그걸 붙잡아 볕을 가릴 요량도 아닌데 물음에 물음을 더하는 우리들의 궁금증이 끝도 없음을 대변하듯 아무거나 골라잡아 그 질문의 속셈을 파악해보자니 대략 이런 식이다.
왜 사람들은 헬리콥터들이
햇빛에서 꿀을 빨도록 가르치지 않지? ―「1」 부분
연기는 구름과 이야기하나? ―「4」 부분
버려진 자전거는 어떻게
그 자유를 얻었을까? ―「15」 부분
사랑, 그와 그녀의 사랑,
그게 가버렸다면, 그것들은 어디로 갔지? ―「22」 부분
태양과 오렌지 사이의
왕복 거리는 얼마나 될까? ―「29」 부분
우리는 친절을 배우나
아니면 친절의 탈을 배우나? ―「64」 부분
쉽다고들 하시겠다. 짧다고들 하시겠다. 맞다. 분명 맞는데, 74편의 시 편편이 그리 만만치 않은 내공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는 건 한 번 읽었을 때보다 두 번, 두 번 읽었을 때보다 세 번, 이렇듯 거듭 읽어나감을 경험하고 난 뒤의 일일 것이다. 단어들의 조합이, 문장들의 연결이 지극히 단순하다고는 하나 그것들이 모여 응집된 사유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순간 우리의 짐작을 가볍게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빤하다면 빤하기 그지없는 시인과의 꼬리잡기에서 이렇듯 백번백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 일찌감치 우리가 저마다 손에 쥐고 있던 상상력이라는 무기를 버려버린 탓이다. 그렇다면 시인의 저력은 우리가 떠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상상력의 마당에 풍성히 잔디를 깔아 아이들을 뛰놀게 했던 보살핌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닐까. 말년의 그가 매일매일 청년의 정신으로 촉이 살아 있는 시의 열매를 틔울 수 있었던 연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말이다.
실은 모든 뛰어난 예술작품은 꼭 물음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물음표와 감탄사의 숲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감상(체험)하는 것은 질문과 경이의 숲을 헤매는 일이라고 해도 좋을 터이다.
― ‘옮긴이의 말’ 중에서
어떤 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마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네루다의 시들은 그만의 예리한 직관과 그만의 풍부한 직감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만물에 나날이 새 옷을 입히는 역할에 그 충실을 다하고 있다. 그때마다 쓴 자와 읽는 자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운동이 이뤄지는데, 일체의 강요도 일말의 부응도 없이 다만 오늘 예 있음을 느끼게 하는 파장의 힘은 결국 우리의 살아 있음마저 확인케 하니 그것이 어쩌면 ‘무아’와 한 종이 아닐는지.
현재 25만명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