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의 시대

이 책을 읽은 사람



2,406명
나의 별점

 읽고싶어요
읽고싶어요



책장에 담기

게시물 작성

문장 남기기
분량
두꺼운 책
출간일
2000.10.2
페이지
514쪽
이럴 때 추천!
떠나고 싶을 때 , 답답할 때 , 인생이 재미 없을 때 , 일상의 재미를 원할 때 , 힐링이 필요할 때 읽으면 좋아요.
상세 정보
뜨거운 사랑과 상실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그때의 기억과 순간들을 되살려주는 책
이 책을 언급한 게시물79

히수
@1_hee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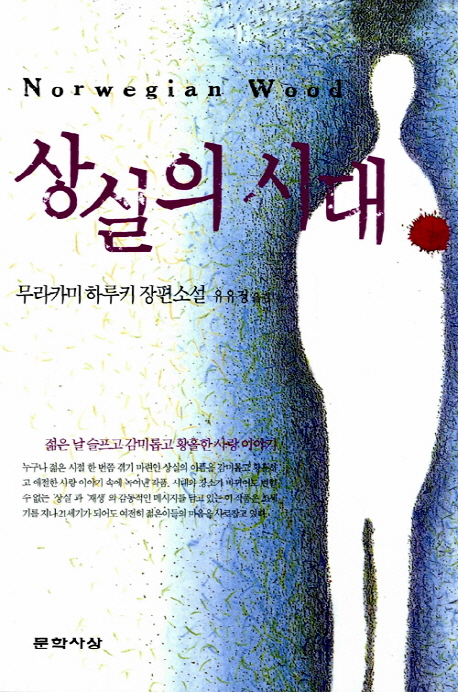
상실의 시대

1명이 좋아해요
 1
1
 0
0

와인잔멍멍이
@wainjanmeongmeongyi

상실의 시대



3명이 좋아해요
 3
3
 0
0

김성호
@goldstarsky
문상가는 날, 나는 기차에서 읽을 책을 찾아 역 책방에 들렀다.
상실의 시대. 항상 인간은 무엇인가를 잃어 왔지만 그렇다고 상실의 시대라고 까지 부를만한 시대가 있었던가.
기차시간도 다 되었고 눈에 띄는 다른 책들도 없었던 터라 계산을 하고 나왔다.
그리고 대합실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의 작품에서는 결코 빠지지 않는 열 일곱살의 봄날에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 기즈키가 죽었다. 주인공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그 때, 나를 태운 밤기차는 어딘지 모르는 곳을 끊임없이 벗어나고 있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기차에서 도시락을 파는 아저씨가 내 곁을 다섯 번 쯤 아니면 그 두배쯤 지나쳤고 그래서 기차가 대전역 아니면 논산역에서 멈췄을 즈음에 레이코가 편지를 보내왔다.
"그런 식으로 고민하지 말아요.
내버려 둬도 만사는 흘러갈 방향으로 흘러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은 상처 입을 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게 마련이지.
인생이란 그런 거야.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와타나베도 그런 인생살이를 슬슬 배워도 좋을 때라고 생각해.
와타나베는 때때로 인생을 지나치게 자기 방식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
정신 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좀더 마음을 열고,
인생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겨 봐.
나처럼 무력하고 불완전한 여자도 때로는 산다는 게 근사하다고 생각하며 산다구. 정말이야, 그건!
그러니, 와타나베도 더욱더 행복해져야 해.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해봐."
다음 날 밤, 내가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을 때, 나오코가 죽었다. 향불이 다 타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그래왔던대로 향에 불을 붙여 다시 꽂았다. 평소보다 하나 더 많이 꽂았다.
그리고 '무엇인가 잃는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슬프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감정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하다가 이야기는 재미없게 끝나버렸다.
내 열 일곱살의 봄처럼. 끝나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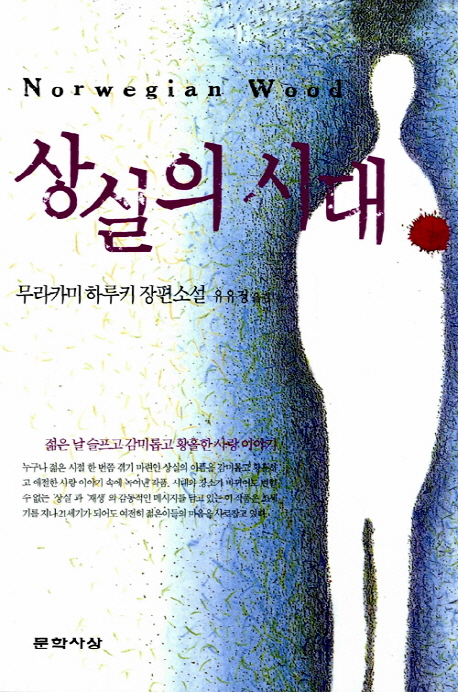
상실의 시대


2명이 좋아해요
 2
2
 0
0
상세정보
현재 25만명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